녹음실에 앉은 임종업 기자.
[매거진 ESC] 커버스토리
EBS ‘독자가 읽어주는 책’ 낭독 체험기…역대 두번째로 녹음 실패의 굴욕을 겪다
EBS ‘독자가 읽어주는 책’ 낭독 체험기…역대 두번째로 녹음 실패의 굴욕을 겪다
“입에서 물소리가 나요”
“래퍼를 해도 되겠어요”
쉼없는 지적에 정신이 혼미해져 “‘온 에어’ 불이 들어온 다음 1~2초 뒤에 시작하세요.” 녹음실 문이 닫혔다. 어항 속 같은 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취자 임종업입니다.” ‘요’를 올리나? ‘저는’은 반박자 쉬고 들어갈까? 띄어읽기는 ‘저는’과 ‘청취자’ 사이가 좋을까, ‘청취자’와 ‘임종업’ 사이가 좋을까. 청독 체험 취재의 하나로 시도한 교육방송(EBS) ‘독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녹음은 온통 지뢰밭이었다. “현재 한겨레신문 기자입니다. 이에스시에서 라이프를 담당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좋아.
 “이에스시는 이스케이프(escape)의 약자로, 컴퓨터 자판에서 현재의 작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키의 표기와 같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긴 문장.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불이 나갔다. 헤드폰에서 들려오는 피디의 목소리.
“이스케이프”를 ‘이스킵’으로 읽으셨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스케이프를 또박또박 읽고 나자, 다음 문장이 벽처럼 보인다. 허걱, 어디서 띄어읽지? 순간, 두 눈을 짝 찢어 문장을 예독한다. “컴퓨터 자판에서// 현재의 작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키의 표기와/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면 무난하겠다. 그런데 참 한심하군. 이걸 문장이라고 썼냐? 그리고 이렇게 짧은 문장에 ‘에서’와 ‘의’가 두 군데나 나오네.
“당신이 쓴 거잖아?” 문장들이 살아나 독기를 품고 대들었다. 그동안 적당히 만들어낸 문장이 무릇 얼마일까. 이렇게 복수를 당하는구나.
빠직 이마에 땀이 솟고, 혀와 입천장이 척척 달라붙었다. 벌써 이러면 어쩌나?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다시 불이 꺼졌다.
“‘카잔/ 차키스’라고 띄어 읽었구요. ‘그리스인 조르바’ 앞에 ‘장편소설’을 넣어 주세요. ‘이번에’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한 읽기는 문장마다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었다. 피디의 지적은 가짓수를 늘려나갔다. “입에서 물소리가 나요. 입안에 물이 남지 않게 완전히 삼키세요.” “래퍼를 해도 되겠어요. 왜 그렇게 빨리 읽어요?” “종이 소리가 나요. 쓸데없이 원고를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마신 물로 배가 불러왔다. 익사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숨 쉬는 게 힘들어졌다.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
드디어 소설 본문. 잦았던 피디의 잔소리가 없어졌다. 이제 읽기에 익숙해진 걸까. 30분쯤 뒤 불이 꺼지면서 마이크도 꺼졌다. 잠시 불편한 정적. 담당 피디가 들어와 문을 닫았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당장 교정해서 녹음하기는 어렵겠어요. 잘된 표본파일과 함께 녹음한 것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연습 좀 하고 오세요.”
“이에스시는 이스케이프(escape)의 약자로, 컴퓨터 자판에서 현재의 작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키의 표기와 같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긴 문장.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불이 나갔다. 헤드폰에서 들려오는 피디의 목소리.
“이스케이프”를 ‘이스킵’으로 읽으셨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스케이프를 또박또박 읽고 나자, 다음 문장이 벽처럼 보인다. 허걱, 어디서 띄어읽지? 순간, 두 눈을 짝 찢어 문장을 예독한다. “컴퓨터 자판에서// 현재의 작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키의 표기와/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면 무난하겠다. 그런데 참 한심하군. 이걸 문장이라고 썼냐? 그리고 이렇게 짧은 문장에 ‘에서’와 ‘의’가 두 군데나 나오네.
“당신이 쓴 거잖아?” 문장들이 살아나 독기를 품고 대들었다. 그동안 적당히 만들어낸 문장이 무릇 얼마일까. 이렇게 복수를 당하는구나.
빠직 이마에 땀이 솟고, 혀와 입천장이 척척 달라붙었다. 벌써 이러면 어쩌나?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다시 불이 꺼졌다.
“‘카잔/ 차키스’라고 띄어 읽었구요. ‘그리스인 조르바’ 앞에 ‘장편소설’을 넣어 주세요. ‘이번에’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한 읽기는 문장마다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었다. 피디의 지적은 가짓수를 늘려나갔다. “입에서 물소리가 나요. 입안에 물이 남지 않게 완전히 삼키세요.” “래퍼를 해도 되겠어요. 왜 그렇게 빨리 읽어요?” “종이 소리가 나요. 쓸데없이 원고를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마신 물로 배가 불러왔다. 익사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숨 쉬는 게 힘들어졌다.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
드디어 소설 본문. 잦았던 피디의 잔소리가 없어졌다. 이제 읽기에 익숙해진 걸까. 30분쯤 뒤 불이 꺼지면서 마이크도 꺼졌다. 잠시 불편한 정적. 담당 피디가 들어와 문을 닫았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당장 교정해서 녹음하기는 어렵겠어요. 잘된 표본파일과 함께 녹음한 것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연습 좀 하고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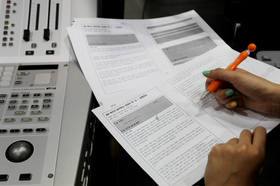 눈으로만 수십년 읽다보니
눈으로만 수십년 읽다보니
띄어읽기 안되고 발음도 부정확
소리내 많이 읽어야 낭독도 잘해
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명색이 글을 다루는 기잔데, 책 하나 못 읽고 쫓겨나다니….
‘독자가 읽어주는 책’은, 게시판에 올라온 추천도서 가운데서 재밌는 것을 선별해 추천자가 텍스트를 직접 읽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6개월 동안 녹음을 실패한 적이 한번밖에 없어요.”
피디의 귀띔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두번째 실패 사례가 된 나로서는 잔인했다.
“눈으로 읽기와 소리내어 읽는 것은 달라요. 낭독은 결국 많이 읽은 이가 잘하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잘 읽죠. 기자님은 워낙 소리내서 안 읽으셨나 봐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행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텍스트 없이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띄어읽기였다. 아니, 띄어읽기가 문제가 아니라 호흡이었다. 반띔 뒤에 오는 온띔에서 한차례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 당연히 다음 단어 중간에 숨을 쉬게 되니 의미와 무관하게 한 단어를 끊어 읽은 꼴이 된 것. 듣는 사람한테는 한 단어를 띄어 읽는, 빼도 박도 못하는 칠푼이가 되었다. 평생 숨 쉬고 살아왔으면서 이게 무슨 꼴이람.
그랬다. 낭독은 수영과 흡사했다. 고개를 물속에 담가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되 주기적으로 옆으로 틀어 공기 밖으로 입을 내어 공기를 바꿔줘야 하는 것. 그래야 100m고 200m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낭독은 한껏 들이마신 공기를 내뱉으면서 성대를 떨어 활자를 음성으로 바꾸는 작업. 폐는 일종의 풍선 같아서 처음에 나오는 공기는 힘이 세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진다. 힘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숨을 들이쉬어야 안정적인 발음이 가능한 것. 조금 남은 공기를 애써 뱉으면서 소리를 내려니 단어 한가운데서 호흡이 멈추는 일이 발생하거나, 래퍼처럼 빨리 읽으면서 발음이 두루뭉술해지게 된 것이다. 그 간단한 원리를 굳이 가르쳐줘야 안단 말인가.
“그리고요. ‘네게’는 ‘너에게’로, ‘네가’는 ‘니가’로 바꿔 읽어야 해요. 소유격 조사 ‘의’는 모두 ‘에’로 읽어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의의’는 ‘민주주이에 의이’로 읽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주지 않으면 듣는 이가 구분 못해요. 물론 아마추어는 굳이 그렇게까지 잘 읽을 필요는 없지만요.”
방송출연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다. 대략난감. 이를 어쩌나. 팀장한테 경과를 보고하니 실패기도 재밌겠다면서 흐흐 웃었다.
글 임종업 기자 blitz@hani.co.kr·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나·들] 피범벅 환자 옆엔 탈진한 연예인…
■ 문재인 “말뒤집는 새누리, 정치가 장난이냐”
■ 아파서 ‘밥줄’인 마늘농사 접는데 지원 실종…“죽어삘라요”
■ 남의 PC속 사진이 내 스마트폰에? ‘갤럭시S3’ 사진공유 논란
■ 롯데월드 입장권 휴지조각된 사연
■ 나체 사진보다 더 관능적인 ‘푸드포르노’는?
■ [화보] 내곡동 진실 밝혀질까?
“래퍼를 해도 되겠어요”
쉼없는 지적에 정신이 혼미해져 “‘온 에어’ 불이 들어온 다음 1~2초 뒤에 시작하세요.” 녹음실 문이 닫혔다. 어항 속 같은 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취자 임종업입니다.” ‘요’를 올리나? ‘저는’은 반박자 쉬고 들어갈까? 띄어읽기는 ‘저는’과 ‘청취자’ 사이가 좋을까, ‘청취자’와 ‘임종업’ 사이가 좋을까. 청독 체험 취재의 하나로 시도한 교육방송(EBS) ‘독자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녹음은 온통 지뢰밭이었다. “현재 한겨레신문 기자입니다. 이에스시에서 라이프를 담당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좋아.
밖에서 보면 어항 같다.
조연출이 원고를 체크한다.
띄어읽기 안되고 발음도 부정확
소리내 많이 읽어야 낭독도 잘해
| |
■ [나·들] 피범벅 환자 옆엔 탈진한 연예인…
■ 문재인 “말뒤집는 새누리, 정치가 장난이냐”
■ 아파서 ‘밥줄’인 마늘농사 접는데 지원 실종…“죽어삘라요”
■ 남의 PC속 사진이 내 스마트폰에? ‘갤럭시S3’ 사진공유 논란
■ 롯데월드 입장권 휴지조각된 사연
■ 나체 사진보다 더 관능적인 ‘푸드포르노’는?
■ [화보] 내곡동 진실 밝혀질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0427/53_17141809656088_2024042450367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