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문화방송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19주년을 맞았다.
[매거진 esc] 커버스토리 예쁜 엽서 낙점 기다리던 짝사랑에서 실시간 소통하는 연애 관계로
동료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튼다. 튜닝 없이 <문화방송> ‘박경림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트는 데 10초가 지났다. 노래를 듣다 즉각 사연과 신청곡을 보냈다. 10분쯤 뒤 채널을 바꿨다. 이번엔 <한국방송>의 ‘메이비의 볼륨을 높여요’. “봄 타는 직딩인데 너무 일하기 싫다”며 0.7초 만에 짧은 사연을 디제이에게 보냈다. 해외 청취자들의 사연도 엿봤다. 두 번 다 신청곡이 채택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에스비에스>(SBS)의 ‘이적의 텐텐 클럽’에 접속한다. 불독맨션과 데프콘이 부른 ‘길’ 좀 틀어주세요!
청취율 침체 타개한 미니·콩·고릴라의 힘
그날 기자가 일하던 사무실에 라디오 수신기는 없었다. 컴퓨터에 깔린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런 마술을 가능하게 했다. 청취는 물론 실시간으로 방송 진행자, 다른 청취자와 사연을 건네고 실시간 영상도 본다. ‘쌍방향+보고 채팅하는’ 라디오다. 문화방송 ‘미니’, 한국방송 ‘콩’, 에스비에스 ‘고릴라’ 등이 대표적이다. <기독교 방송> <교육방송>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디어학자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라디오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말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상대할 때처럼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썼다. 라디오는 “잠재의식의 심층에서 부족의 뿔 나팔이나 고대 북의 울림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하나의 감동의 소용돌이로 바꾸어” 놓는다.
그가 ‘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한국의 라디오를 봤다면 책을 고쳐 쓰지 않았을까? 쌍방향 프로그램은 라디오 연출과 청취를 크게 바꿔 놨다. ‘박경림의 별이 빛나는 밤에’(문화방송 표준 에프엠 95.9㎒) 연출자 김빛나 피디와 한국방송 ‘이현우의 음악앨범’(한국방송 2에프엠 89.1㎒) 연출자 오수진 피디에게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연출·청취에서 달라진 점이 뭐냐”고 전자우편으로 물었더니, 둘 다 쌍방향 프로그램의 엄청난 영향력을 인정했다.
김빛나 피디는 연출할 때 청취자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가옴을 꼽았다. 그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청취자 의견에 따라 방송 내용이 기획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확신이 없던 코너나 게스트(초대 손님)에 대해 청취자의 의견이 좋은 판단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김 피디는 이를 연출자와 청취자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적극적 연애 관계’로 비유했다.
이런 ‘연애 관계’는 라디오 연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시켰다. 2시간 생방송도 작가의 원고나 게스트 없이도 디제이·청취자와 ‘미니’만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라고 김 피디는 설명했다. 진행자의 말 한마디에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방송 내용도 실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음악 관련 정보를 취재하다 막힐 때 청취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미니로 물으면 금세 답이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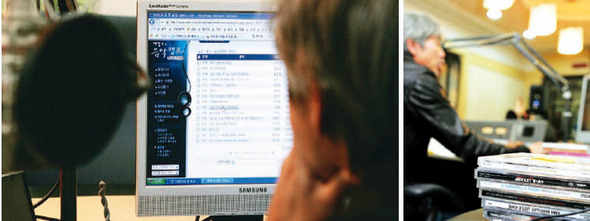 청취 태도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 김 피디는 ‘공감’을 들었다. 실연이나 취업 고민 사연이 올라오면 디제이는 일방적인 위안을 건네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청취자가 댓글을 올리며 격려한다. ‘누군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한다’는 위안을 주는 셈이다.
김 피디는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동방신기의 친구를 찾아주는 모습을 보고 ‘미니’의 힘을 실감했다. 최근 사전 준비 없이 ‘별밤’에서 동방신기의 어린 시절 친구를 찾아주는 생방송을 진행했다. 동방신기 멤버들이 찾고 싶은 친구 이름, 인상착의, 마지막 주소 등을 알리자 1시간 30분 만에 청취자의 제보 덕에 모두 찾을 수 있었다.
오수진 피디도 ‘콩’의 힘을 인정했다. 오 피디는 “심혈을 기울여 선곡한 노래에 대해 청취자들이 ‘노래 좋아요’라거나 ‘노래 제목이 뭐냐’고 반응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오 피디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입소문이 나고 명품 프로그램이 되기까지 텔레비전보다 더 오래 걸린다. 청취율 조사는 기획에 반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청취자의 실시간 반응을 감지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인 이현우씨의 말실수에 대한 ‘뜨거운 반응’도 오 피디를 웃게 한다. 이현우씨는 실시간 의견에 대해 “그런가요? 그래요?”라는 추임새를 자주 넣는다. 한 청취자는 1시간 동안 “그래요?”란 말을 몇 번 했는지 헤아려서 알려줬다.
90년대 후반 피시통신 시절 쌍방향 라디오 실험은 있었다. 문화방송은 94년 라디오와 실시간 피시통신을 결합한 ‘라디오 컴퓨터 쇼’를 방송했다. 에스비에스도 ‘이기상의 에스비에스 피시통신’이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러나 큰 반향이 없었다.
청취 태도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 김 피디는 ‘공감’을 들었다. 실연이나 취업 고민 사연이 올라오면 디제이는 일방적인 위안을 건네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청취자가 댓글을 올리며 격려한다. ‘누군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한다’는 위안을 주는 셈이다.
김 피디는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동방신기의 친구를 찾아주는 모습을 보고 ‘미니’의 힘을 실감했다. 최근 사전 준비 없이 ‘별밤’에서 동방신기의 어린 시절 친구를 찾아주는 생방송을 진행했다. 동방신기 멤버들이 찾고 싶은 친구 이름, 인상착의, 마지막 주소 등을 알리자 1시간 30분 만에 청취자의 제보 덕에 모두 찾을 수 있었다.
오수진 피디도 ‘콩’의 힘을 인정했다. 오 피디는 “심혈을 기울여 선곡한 노래에 대해 청취자들이 ‘노래 좋아요’라거나 ‘노래 제목이 뭐냐’고 반응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오 피디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입소문이 나고 명품 프로그램이 되기까지 텔레비전보다 더 오래 걸린다. 청취율 조사는 기획에 반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청취자의 실시간 반응을 감지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인 이현우씨의 말실수에 대한 ‘뜨거운 반응’도 오 피디를 웃게 한다. 이현우씨는 실시간 의견에 대해 “그런가요? 그래요?”라는 추임새를 자주 넣는다. 한 청취자는 1시간 동안 “그래요?”란 말을 몇 번 했는지 헤아려서 알려줬다.
90년대 후반 피시통신 시절 쌍방향 라디오 실험은 있었다. 문화방송은 94년 라디오와 실시간 피시통신을 결합한 ‘라디오 컴퓨터 쇼’를 방송했다. 에스비에스도 ‘이기상의 에스비에스 피시통신’이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러나 큰 반향이 없었다.
 개인의 라디오에서 공동체의 라디오로
지상파 가운데 가장 앞서 쌍방향 프로그램을 만든 문화방송 임재윤 피디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니’의 탄생은 떨어지는 청취율을 잡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2001년 입사 2년차의 임 피디는 청취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고민했다. 아무도 라디오 단말기를 사지 않는 점을 떠올렸다. 라디오 피디 대책회의에서 “1만원짜리 라디오를 사서 길에 뿌리자”는 씁쓸한 농담도 나왔다. 임 피디는 ‘컴퓨터가 단말기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실마리를 얻었다.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가능한 한 적은 클릭 수로 접속하고 메신저를 결합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자사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는다는 발상을 용납하지 않는 보수적인 인터넷 전략이 바뀌는 데 수년이 걸렸다. 미니는 2006년 4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 피디는 “미니를 개발할 땐 그전에 ‘라컴쇼’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메신저와 실시간 라디오 플레이어를 결합한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클루언은 “라디오가 주는 신비로운 병풍 덕분에 젊은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숙제를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얻었다”며 “10대들은 텔레비전의 집단에서 나와 개인의 라디오로 돌아간다”고 썼다. 매클루언이 살아 있었더라도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를 두고 개인의 라디오라고 했을까?
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개인의 라디오에서 공동체의 라디오로
지상파 가운데 가장 앞서 쌍방향 프로그램을 만든 문화방송 임재윤 피디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니’의 탄생은 떨어지는 청취율을 잡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2001년 입사 2년차의 임 피디는 청취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고민했다. 아무도 라디오 단말기를 사지 않는 점을 떠올렸다. 라디오 피디 대책회의에서 “1만원짜리 라디오를 사서 길에 뿌리자”는 씁쓸한 농담도 나왔다. 임 피디는 ‘컴퓨터가 단말기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실마리를 얻었다.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가능한 한 적은 클릭 수로 접속하고 메신저를 결합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자사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는다는 발상을 용납하지 않는 보수적인 인터넷 전략이 바뀌는 데 수년이 걸렸다. 미니는 2006년 4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 피디는 “미니를 개발할 땐 그전에 ‘라컴쇼’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메신저와 실시간 라디오 플레이어를 결합한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클루언은 “라디오가 주는 신비로운 병풍 덕분에 젊은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숙제를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얻었다”며 “10대들은 텔레비전의 집단에서 나와 개인의 라디오로 돌아간다”고 썼다. 매클루언이 살아 있었더라도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를 두고 개인의 라디오라고 했을까?
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그는 엽서에서 문자로, 문자에서 미니로 청취자와의 소통 방식이 바뀌는 모습을 19년간 지켜봤다.
이현우씨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청취자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핀다.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스치던 얼굴을 빤히…나를 빛내는 ‘영혼의 색’ 찾기 [ESC] 스치던 얼굴을 빤히…나를 빛내는 ‘영혼의 색’ 찾기 [ES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084296564_20231227503552.jpg)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0427/53_17141809656088_2024042450367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