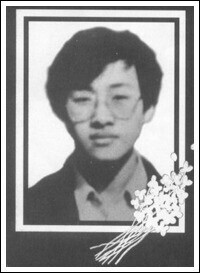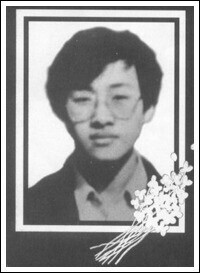고 김성수 열사 생전 모습.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제공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 중 의문사를 당한 고 김성수(당시 19살)군의 유족에게 법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는 16일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대 지리학과 1학년 재학 중이던 김군은 1986년 6월21일 저녁,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군의 몸에는 시멘트 덩어리가 묶여 있었다.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익사에 의한 자살’로 단정하고 수사를 마쳤다. 의심스러운 김군의 죽음과 수사 결과에 유족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납득할 만한 자살 이유나 추정될 만한 사인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뒤 2000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기는 이 사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으나 2기 위원회는 서울대 학생운동 등에 참여한 수배 학생을 검거하려는 공안기관이 김군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2006년 민주화보상위원회는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상 결정을 내렸지만 정신적 손해 부분은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민주화보상법 조항을 2018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상 결정 13년 만에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현재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군의 행방불명 뒤 행적과 사망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행사로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인에 대한 수사를 은폐·왜곡함으로써 김군의 생명권과 유족들의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김군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증거가 많은 점, 의문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 20년의 오랜 기간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번번이 좌절됐던 점 등에 비춰 유족들이 그동안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대리한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이 당시 인정된 사실들과 사정들을 근거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죽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묻히고 잊힌 수많은 의문사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김군과 같은 수많은 죽음이 조금이라도 재평가되고 기억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