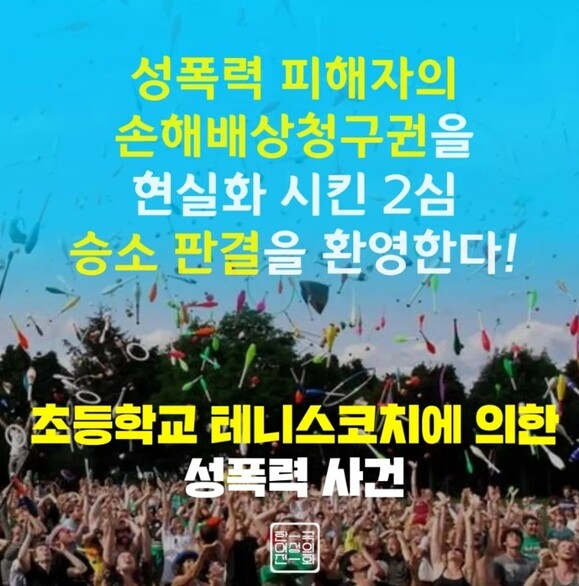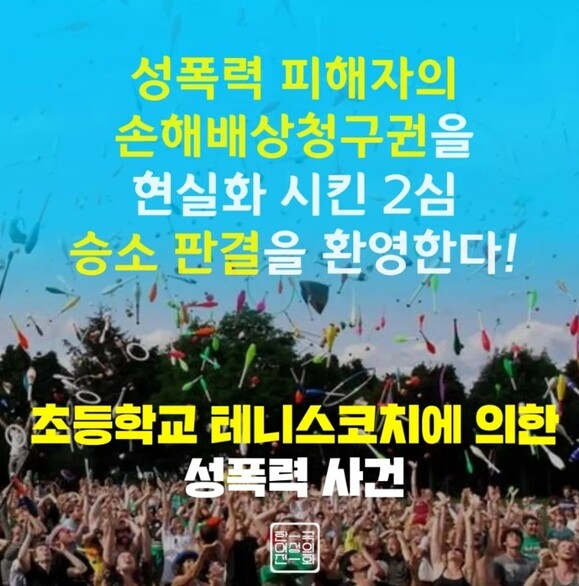성폭력 범죄를 겪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시한인 10년을 넘긴 뒤에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한겨레> 11월12일치 1면)이 나온 가운데, 여성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8)씨가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외상후 스트레스(PTSD)를 처음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됐으므로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그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줬다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가 더욱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며 “대부분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고 범죄 이후 바로 드러내기 어려운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범죄행위가 있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특히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오래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는 실현되기 어렵다며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피해자들은) 은폐를 강요당했고, 가해자가 너무 무서웠고, 자신이 비난받을까봐 두려웠고, 피해인지도 잘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침묵해야 했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한다”며 “피해자들은 다른 여성의 용기있는 고백을 보고 자신도 용기냈다고 말하지만,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가 어려운 현실 앞에 절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는 심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은 성폭력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피해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지금의 소멸시효 규정은 연령, 장애 등 피해발생 당시의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그 제도적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우연히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가했던 테니스 코치를 마주친 뒤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 동안의 기억을 잃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김씨는 2016년 6월7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8년 6월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테니스 코치 쪽은 마지막 성폭력 범죄일이 2002년 8월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월 6월7일에 그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며 피고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