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기자
현장에서
“까짓것! 장사나 하지 뭐!”
몇 차례 승진에서 탈락한 선배와, 벌써 수십 차례 취업의 고배를 마신 친구는 걸핏하면 이런 말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도 “그래, 인생 별거 있냐. 돈 몇 푼에 눈치 보며 사느니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게 백배 낫지”라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무너지는 자영업자’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입버릇처럼 해댔던 ‘장사나 하지’란 말이 얼마나 사치스런 말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한파에 떼밀려 거리로 나선 가장들이 너도나도 ‘사장님’이 되는 바람에 국내 자영업체 수는 1997년 214만개에서 99년에는 226만개, 2003년에는 240만개로 늘었다. 그러나 이 ‘사장님’들 가운데 26.7%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64.5%가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실제 수익을 내는 비율은 8.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퇴직이나 구조조정 이후 무작정 창업에 뛰어든 사람들의 실패야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탓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과기능장, 미용사로 전문 기술을 갖춘 이들이 수십 년간 닦아온 터에서 밀려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7년을 쉼없이 일하고도 남은 건 빚뿐”이라는 서점 주인의 절규는 단지 그만의 비명이 아니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마다 비슷한 절규와 비명을 쏟아냈다. 이런데도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개인의 실패’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제대로 된 기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이웃들이 최소한 ‘생존’도 하기 어렵다면 그 책임을 가장 많이 져야 할 곳은 바로 정부라고 생각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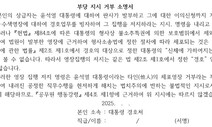
![[단독] 윤석열 ‘가짜 출근’, 경찰 교통 무전에서도 드러났다 [단독] 윤석열 ‘가짜 출근’, 경찰 교통 무전에서도 드러났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2/202501125020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