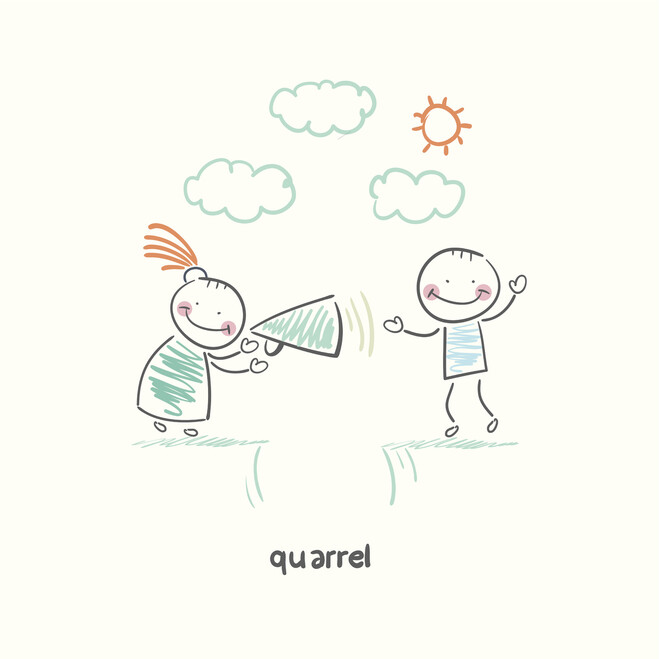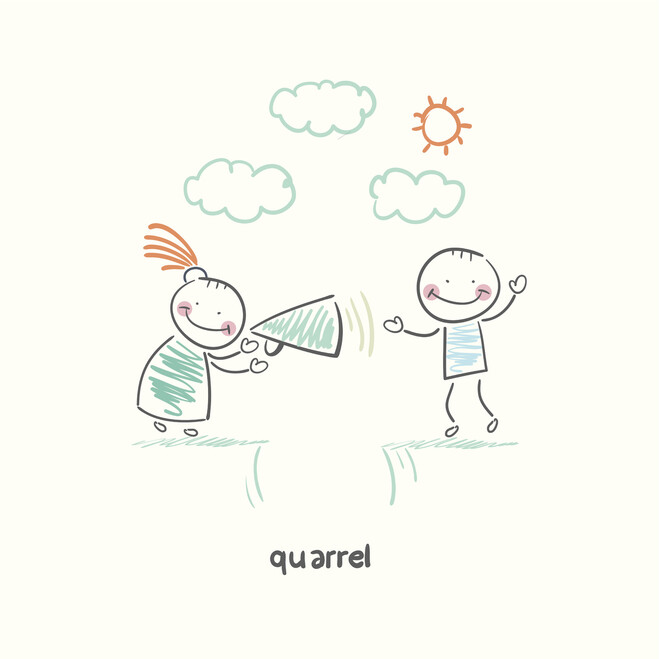대학교 조교나 회사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극성 엄마’ 사례를 접할 때면 혀를 끌끌 찼다. 성인이면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왜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는 왜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인가. 그런데 남의 허물 탓할 게 아니었다. 까딱하면 내 딸도 “엄마가 해결해줘”라고 말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걸 알고 심장이 덜컹했다.
지난 여름, 딸과 함께 버스를 탔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해 손을 뻗어 에어컨을 껐다. “끌 수도 있었어?”라고 묻는 딸에게 그동안 버스 탈 때 추우면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그냥 추워했다고 한다.
관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을…. 에어컨 바람 나오는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걸,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close’ 방향으로 돌리면 끌 수도 있다는 걸. 단순 사건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나는 이 사안을 크게 받아들였다. 평소 딸의 모습이 오버랩된 것이다. 딸은 검색 한 번으로 알 수 있는 일도 부모에게 묻곤 했다.
핵심은 문제해결 능력이었다. 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단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눈앞에 대령해 주기를 바랐다. 원인을 찾다가 휴대전화에 생각이 미쳤다.
딸이 영어학원에 처음 다녔을 때 일이다. 독해 숙제를 하는데 번역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스스로 해석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번역앱에 독해를 맡겨버린 것이었다. 딸은 정보를 찾는 것도 미숙했다. 상세한 검색이 필요한 어떤 과제가 있을 때면 여러 문서를 탐색하며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이용하곤 했다.
모든 게 즉각적이고 빠른 자극에 익숙해 있으니 스스로 생각을 하고 시간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지 않은 것 아닐까.
시험 기간인 딸이 역사 교과서 공부를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패드로 교과서를 보고 있는 딸에게 역사책으로 바꿔 읽으라 했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엔 교과서 대신 아이패드로 공부한다고.
아이패드 안에 교과서가 담겨 있긴 하지만 한눈에 전체 페이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일일이 화면을 올리고 넘기고 하는 상태에선 지엽적인 외우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통찰력을 기대하긴 힘들다. 구구절절 설명을 들은 다음에야 교과서를 찾아 읽기 시작한 딸은 “엄마 책으로 읽으니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흐름이 읽혀”라며 반색했다.
미디어 강국인 대한민국은 공교육에서도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전환이 오히려 책을 읽고 일일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 헤매야 했던 우리 세대의 ‘어떤 능력’을 후퇴시킨 건 아닌지 고심해 봤으면 한다.
영유아기부터 미디어가 익숙한 세대, 미디어의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세대는 앞으로 살면서 눈앞에 닥칠 여러 문제를 어떤 태도로 풀어갈까. 각 가정의 끝없는 가정교육 말곤 답이 없는 것일까. ‘꼰대’인 나는 걱정이 된다.
류승연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