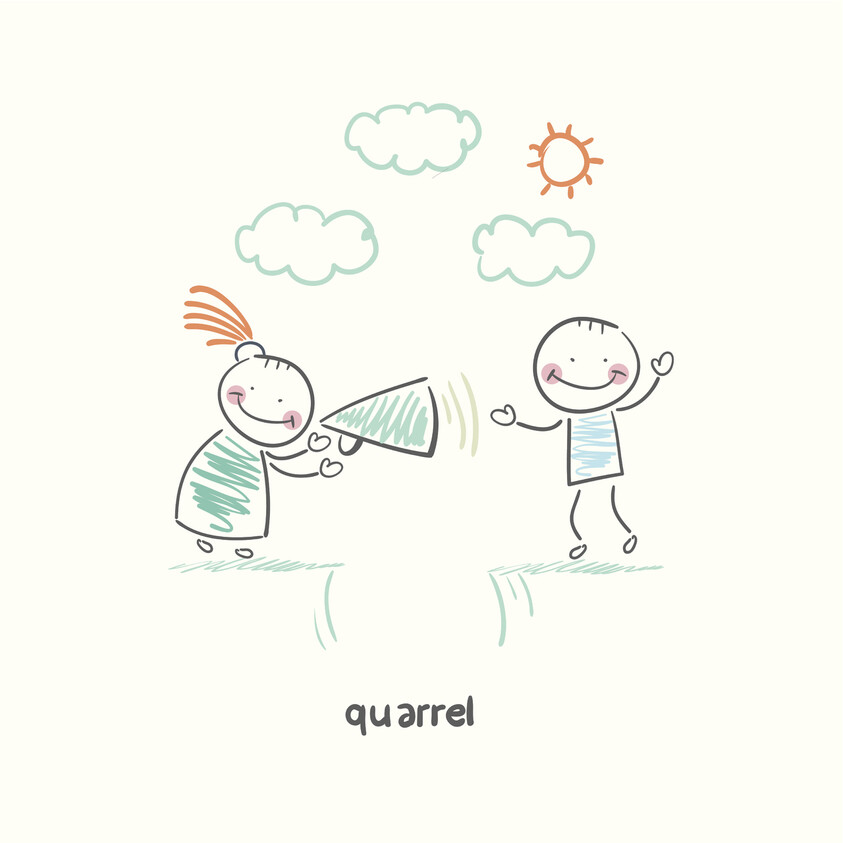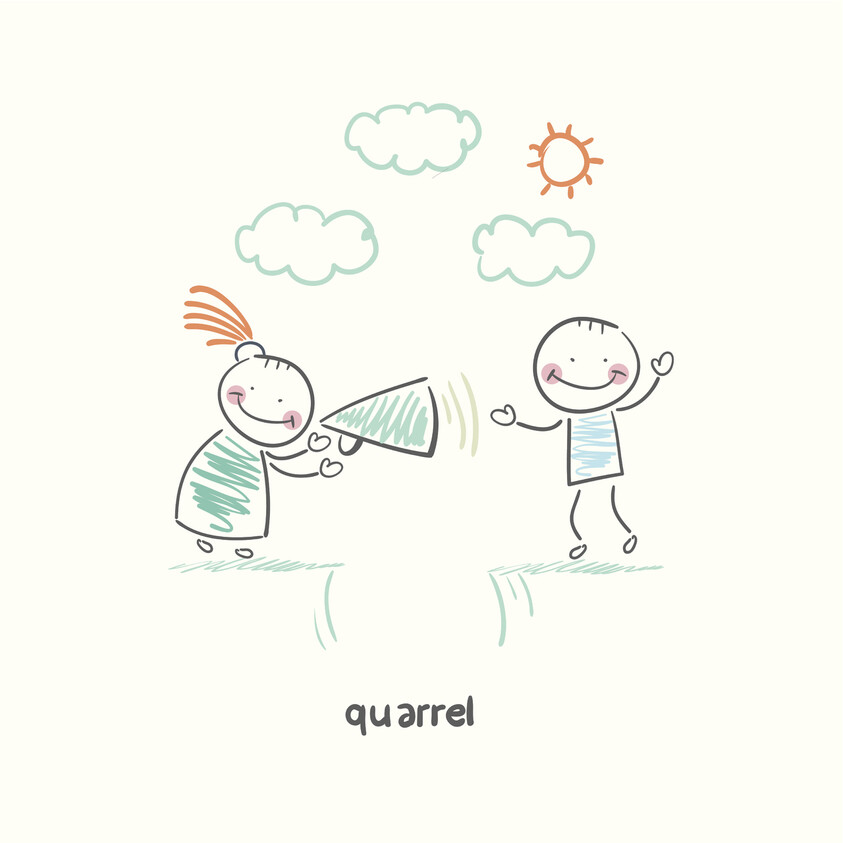발달장애인 아들은 통합교육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첫 상담 날, 담임은 한 달 동안 4㎏이 빠졌다고 말했다. 교직생활 중 처음으로 맡게 된 발달장애인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살이 쭉쭉 빠졌다고 했다. 제비뽑기로 아들 담임을 맡게 된 후 부랴부랴 관련 공부를 했지만 등교 첫날부터 울기만 하는 아들을 보며 당황했다고.
이듬해 아들은 특수학교로 전학 갔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다. 세월이 흘렀으니 통합교육 환경은 좀 나아졌으려나? 동생들(특수교육 대상자)은 아들보단 더 나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려나?
과거에 비하면 장애인식도 높아졌고 관련 교육이나 연수 기회도 많아졌다. 그런데 얘길 들어보면 현장의 어려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한다. 실질적 지원 영역에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행정지원, 교육지원, 인력지원 없이 통합교육이 교사(담임이든 특수교사든) 개인 몫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정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했다. 아들은 친정엄마의 첫 번째 손주였다.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하는지 모른다. 하루는 친정에 가 있을 때였는데 엄마가 방에서 친구(엄마 친구들 모두가 초등 교사였다)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다.
“그러니까…. 나도 올해 재수 없게 됐다.” 엄마가 담임을 맡은 반에 장애인 학생이 배정된 것이었다. 손주도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더 큰 충격은 그런 생각을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것이었다. 평소 교사 친구들 사이에 그런 대화가 익숙했다는 뜻일 테니까.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선 일반 교사의 불안감과 부담감을 덜어낼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때 알게 됐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실 특수교육계 일각에선 일반 교사 양성 과정에 특수교육을 필수전공으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특수교육을 배우긴 하지만 스치듯 몇 시간 특강 듣고 끝이라고. 무엇이든 아는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법이다.
조금 더 급진적인 시각도 있다. 모든 교사가 특수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 일반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칠 수 없지만 특수교사는 모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전문 영역이라 학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 아들은 특수학교에 다니니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통합교육을 받고 자란 사회구성원이 내 아들이 살아갈 미래에 이웃 주민으로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통합교육 분위기가 요즘처럼 경직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성공적 통합교육을 위한 어떤 변화를 모색할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일 테니까. ‘무늬만 통합’인 현 상황에 만족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 보인다.
류승연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