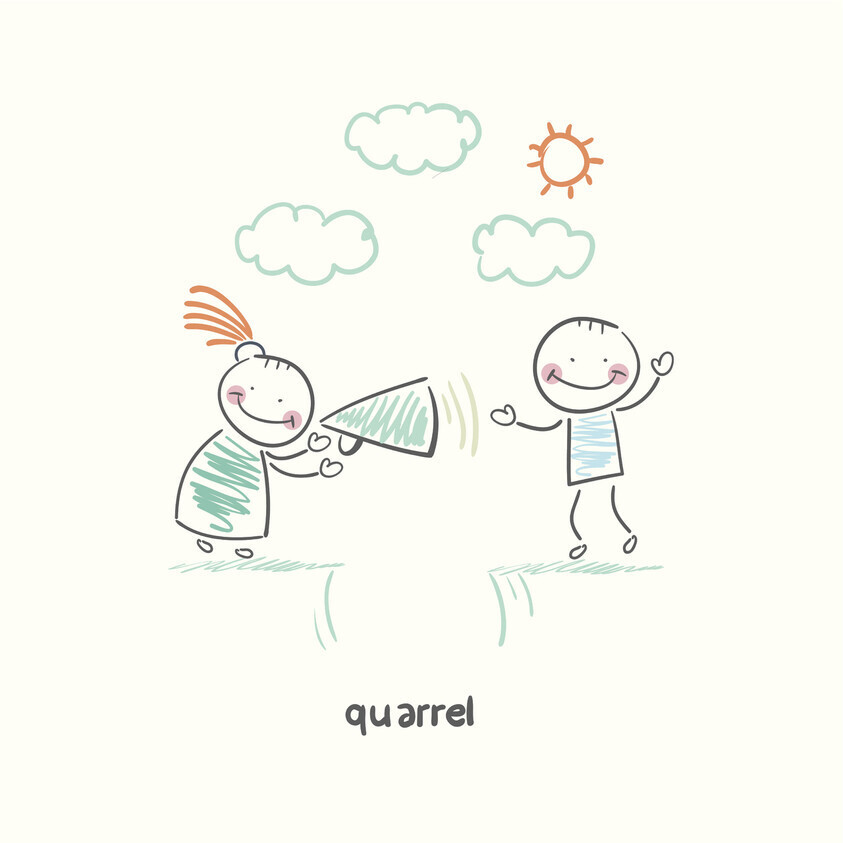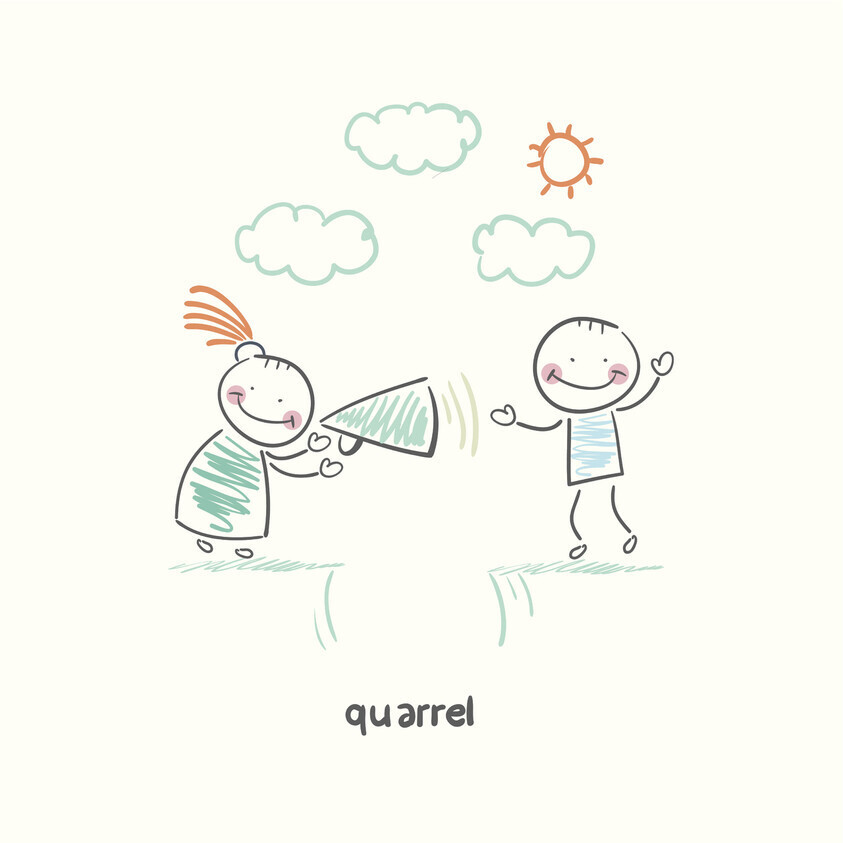31살에 결혼해 33살에 쌍둥이를 낳았다. 나를 뺀 단짝 친구 세 명은 20대에 결혼해 일찌감치 자녀를 두 명씩 출산했는데, 그 친구들을 통해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 듣곤 했다. 몇 년 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교사들이 4등급 이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며 비분강개한 일이 있었다. 아직 초등학생의 엄마인 나는 “에이~ 설마~”라며 웃었는데 반포, 잠실, 김포에 흩어져 사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것이 현실”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쌍둥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는 딸 학교의 운영위원이 됐다. 첫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마지막 안건으로 학교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널리 알리기 위해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에 입학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얘길 들으며 딸 친구들 생각이 났다. 학교가 최상위권 학습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쩌나. 딸은 그나마 국영수 기본이 잡혀있어 ‘공부하는 아이’로 인식돼 있는데 딸의 ‘베스트 프랜드’들은 공부를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를 놓아버렸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너무 어린 나이에 자신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체념’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린 나이에 ‘체념’을 알아버린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 그건 단순히 공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 몸에 익어버리기 때문이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이라고 다를 건 없다. 특수교육 쪽으로 오면 아들이 꼴찌다. 발달장애 학생들만 모인 특수학교 안에서도 아들은 가장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학생에 속한다.
특수교육은 학생 각자 수준에 맞는 ‘개별화교육’을 기본으로 하지만 특수학교에선 특수교사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한 개별화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육은 학습이 가능한 경증 장애 학생 위주로 진행되는 게 사실이고 이런 현상은 ‘돌봄’에서 ‘학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중학교 이후로 두드러진다.
아들도 참 힘들겠다 싶다. 이해하지 못할 러시아어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일 학교에서의 시간을 아들은 어떤 생각으로 버텨내는 걸까? 아들도 체념해버린 걸까.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걸까. 말을 못 하니 그 속을 알 방법이 없다.
꼴찌들을 위한 교육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상위권, 엘리트만을 위하는 교육의 부작용은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나쁜 건 그 안에 속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체념’의 태도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한참 어린 10대에 벌써 체념을 알아버린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많은 것을 지레 체념해버릴 것이다. 직장도 체념해버리고, 결혼도 체념해버리고, 출산도 체념해버리면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길 소원하는 어른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어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제의식을 느끼는 현직 교사와 학부모가 한뜻으로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게 어른인 우리가 할 일이다.
류승연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