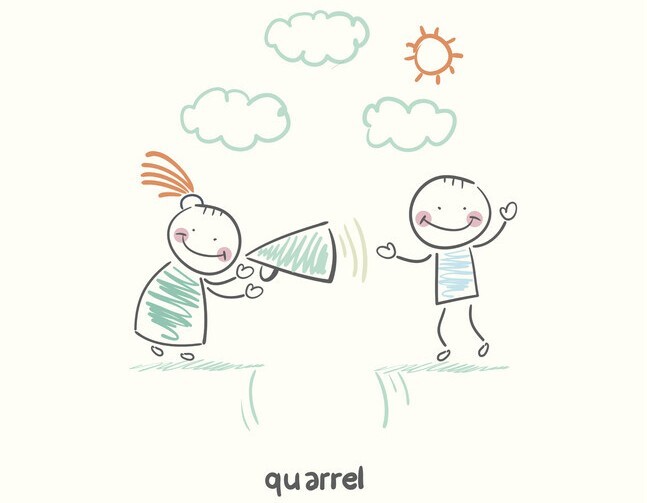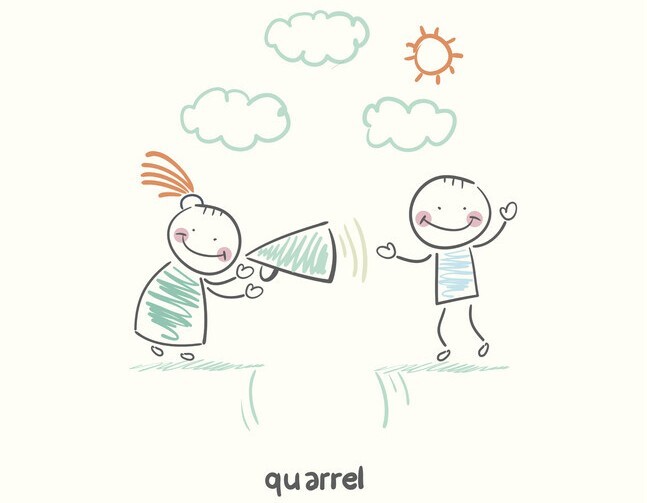나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성격이 만만하진 않고 넉살도 좋은 편이 아닌 내가 타인과 관계 맺기를 능숙하게 해내는 이유는 ‘사회성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적재적소에 맞게 대화하는 법을 알고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지만 때에 따라선 박력이 넘치고 농담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나이가 들면서 알았다. 내가 가진 이 ‘사회성 기술’이 얼마나 큰 강점인지. 나는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게 됐을까. 딸을 키우며 알았다. 즐거웠고 힘들었으며 찬란하고 괴로웠던 학창 시절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걸.
딸의 세상이 넓어진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쫑알쫑알 매일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는 ‘걸어 다니는 CCTV’. 딸을 통해 ‘어린이의 세계’를 보고 듣고 관찰하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1학년 때 딸은 여자친구 2명과 친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둘은 이미 단짝. 파고들 틈이 없었지만 딸은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러자 딸에게 조건을 내건 둘. “우리랑 놀고 싶으면 네가 우리 가방을 들고 다녀.” 딸은 친구들의 가방을 들고 뒤를 따라다녔다.
2학년이 되면서 눈이 뜨였다. “엄마, 생각해 보니 그때 내가 호구 잡혔던 것 같아.” 그러면서 딸은 단짝을 만들었다. 단짝과 잘 지낸다 싶더니 딸이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이다. 새 친구와 놀자니 단짝이 질투하고 단짝이랑만 놀자니 새 친구가 아쉬운 날들.
아이들은 친구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을 획득해나간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들은 친구관계를 맺을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게티이미지뱅크
“괴로워~”를 외치던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됐다. 이젠 단짝이 아닌 무리를 만들더라. 그런데 이게 웬일. 3명이다.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바로 그 홀수 무리! 남은 1명이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날이 지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6학년이 됐다. 그동안 쌓인 경험이 빛을 발했던지 안정적인 4명 무리의 일원이 되면서 최고로 신나는 한 해를 보내고 중학생이 됐다.
딸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게 됐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러는 한편 아들이 측은해 견딜 수 없었다. 딸과 쌍둥이인 아들은 딸과 내가 겪은 모든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하나. 중증의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을 받을 땐 ‘장애인 특별대우(또는 취급)’를 받느라 배제돼 있었고, 특수학교로 전학한 이후엔 ‘중증 특별대우(또는 취급)’를 받느라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차단되곤 했다. 아들은 장애인이기에 앞서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타인을 추구하고 또래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 다만 제대로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기에 다가가는 방식이 서툴 뿐.
아들의 청소년기가 딸과 같았으면 좋겠다.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은, 그 나이에 당연한 모든 경험을 아들도 온전히 누린 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까? 나는 희망을 걸어도 될까? 아들의 학령기가 4년 반 남았다. 똑딱똑딱 성인기를 향해 흘러가는 시계를 보며 내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
류승연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