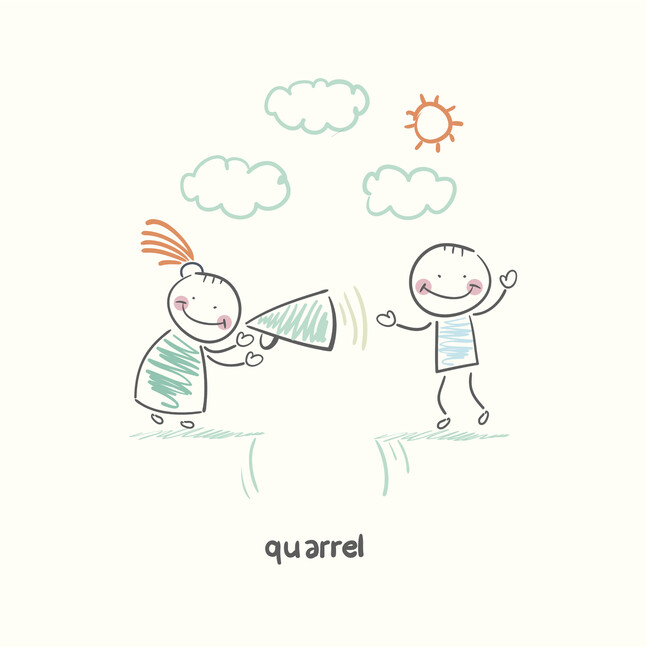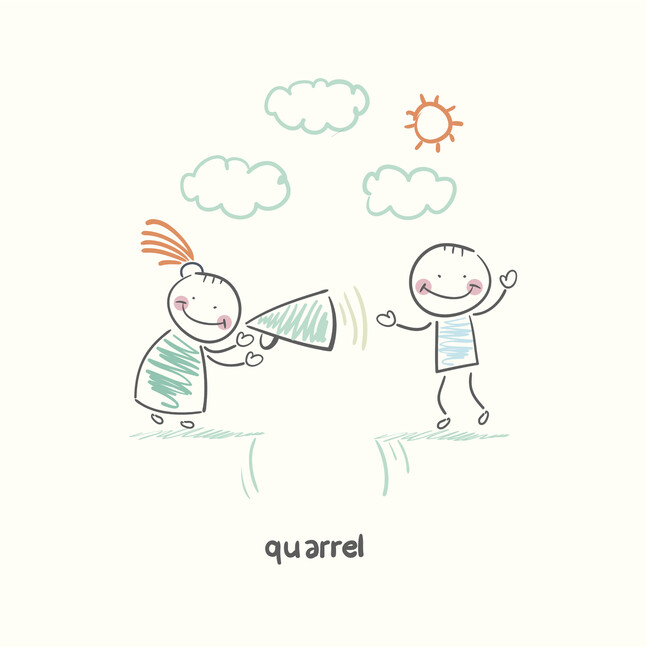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온 가족이 야외에서 공놀이를 했다.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도 느린 자폐성 장애인 아들은 공을 뻥~ 찰 줄 모른다. 발 앞에 공을 가져다주면 발로 톡 건드린다. 그러면 공이 50㎝쯤 굴러가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나는 오두방정을 떨며 환호했다.
칭찬받는 아들 마음에 자신감이 쑥쑥. 다음번 공 차는 발엔 더 힘이 들어간다. 이번엔 60㎝. 우와~ 짝짝짝. 또 한 번 톡. 이번엔 1m. 우와 짝짝짝. 신난 아들은 펄쩍펄쩍 뛰며 즐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때 멀리서 줄넘기하던 딸이 전속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빠르게 달려온 딸은 있는 힘을 다해 아들 앞에 있는 공을 뻥~ 하고 찼다. 힘차게 날아간 공은 골문을 철렁~. “예에~ 고올(GOAL)~” 딸은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다.
놀랐던 건 그다음 아들의 행동이다. 바로 직전까지 (모처럼) 반짝반짝한 눈으로 공놀이를 즐기던 아들이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공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는 듯 그 자리를 벗어나는 아들.
그때 알았다. 아들도 방어기제를 사용하는구나. 아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여우의 신포도’구나. “저 포도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아니라 시기 때문에 일부러 안 먹는 거야”라는 자기 합리화.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도 다 알고 있었구나.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장애 학생들만 모인 특수학교 안에서도 아들은 중증 장애인에 속한다. 친구들에 비해 할 수 있는 활동이 현저히 적다. ‘비교’에서 오는 좌절감을 벗어나기 위해 아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아들의 많은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왜 학교에서 공통 수업이 많은 교과(음악, 미술 등) 시간마다 교실 이동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지, 외부에서 특수체육 수업을 단체로 진행한 적 있었는데 왜 혼자만 참여 안 하고 바닥에 앉아 있었는지 등등.
비장애인 자식의 방어기제를 파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딸은 ‘회피’의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했는데 수학학원 가기 싫을 때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여러 변명거리를 찾곤 했다. 발달장애인 자식의 경우엔 방어기제를 파악하는 게 쉽진 않다. 말로서 유창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행동만을 보고 마음을 읽어내는 게 용이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발달장애인도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조차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부모, 교사, 치료사 등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당사자 주변인은 발달장애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기보단 일단 ‘문제행동’으로 규정하니까. ‘문제행동’이니 행동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곤 하니까.
방어기제는 살려고(자신을 보호하려고) 나오는 건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며 살고 있는데…. 살면서 한 번이라도 발달장애인의 ‘어떤 행동’을 방어기제 관점에서 바라본 적 있었는지,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류승연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