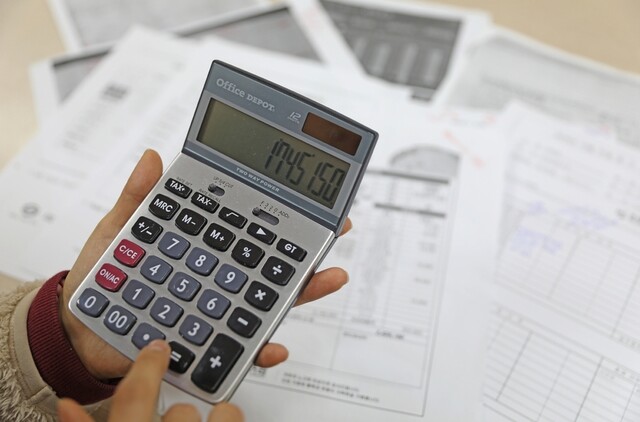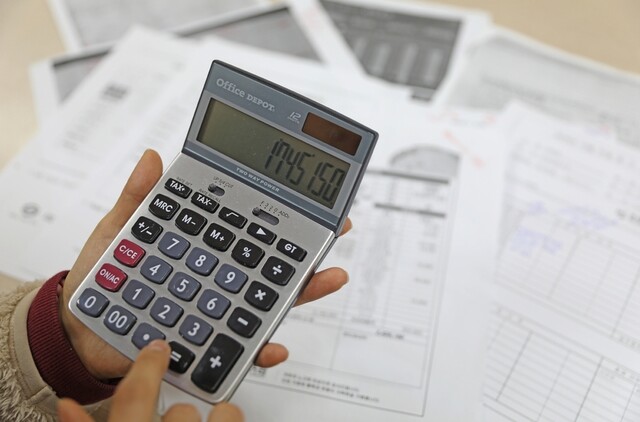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정규직 대비 70% 선을 처음으로 넘어서고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도 줄어드는 등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 노동자들이 임금 통계에서 아예 빠져버린 탓에 나온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2.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9.7%였던 것에 견줘 격차가 2.7%포인트 줄어들었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비율은 60% 후반대에 머물러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었다.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44.5%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 임금은 전년 대비 57.3%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임금 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287만5000원)의 3분의 2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임금 상위 20%인 노동자 평균임금과 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 격차를 뜻하는 임금 5분위 배율도 개선됐다. 2018년 4.67배, 2019년 4.5배에 이어 지난해에는 4.35배로 나타났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렇게 임금격차가 줄어든 이유를 두고 “평균임금 1분위(임금 하위 20%)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전년 대비 5.3%)이 높게 나타났다”며 “2018∼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음식·숙박 업종의 임금 상승률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이번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이번 통계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적어도 실직하지 않고, 일자리를 지킨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임금격차가 개선되는 ‘착시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에 남아있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노동자인데, 가장 취약한 노동자는 임금 통계에서 빠지고 좀 더 사정이 나은 편이었던 노동자들은 임금 하위 분위로 내려갔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특수고용노동자는 대상에서 빠지는 등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비정규직 집계 기준 자체가 한계가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가 내놓은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통계가 가리키는 방향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해 펴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은 62.9%에서 62.8%로 격차가 0.1%포인트 더 벌어졌다.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의 비중도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5.8%에서 17.4%로 되레 커졌다.
한편,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316원으로 전년도 같은 달(2만0573원) 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노동부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감소했는데도 월 임금총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근로일수가 사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