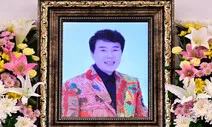일본 사이타마현 미요시초에 있는 인지증(치매) 전문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센터) ‘게야키노이에’(‘느티나무의 집’이라는 뜻)에서 인지증 환자들이 아이들의 저녁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마 껍질을 까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억5천만명.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2050년 세계의 치매 환자를 예측한 규모다. 5천만명(2019년 기준)의 3배에 이르는 수준까지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국외에서도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사회인 일본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치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 ‘어리석을 치’(癡), ‘어리석을 매’(呆) 단어가 환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인지증(認知症)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다. 인지 능력에 관한 질병이라는 뜻이다. 일본은 2012년 ‘인지증시책 5개년 계획’(오렌지플랜)을 세웠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한 2015년 ‘신 오렌지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까지 장기 계획을 담아 범부처가 함께 제시했을 정도로 주요한 정부 과제다. 2025년은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가 75살 이상으로 진입하는 시기다.
일본은 치매 대상자나 가족에게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 ‘치매초기집중지원팀’을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배치한다. 센터는 환자 상태 관리, 환경 개선, 가족 지원 등으로 치매 환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돕는다. 담당 의료진과 연계해 지원하는 ‘치매질환의료센터’도 갖췄다.
인지증 환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돼왔다. 또 일본은 치매 당사자 운동도 활성화돼 있다. 일본인지증당사자협회가 결성되어 있고, 일본 정부는 이렇게 당사자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정책에 녹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네덜란드에는 ‘치매 마을’로 유명한 호헤베이크 마을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기관들의 협조, 치매요양전문 간호사의 아이디어로 2009년 시작됐다. 200여명의 치매 환자 주민이 한 집에 6~7명씩 모여 함께 생활한다.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복지관, 미용실, 극장 등도 갖춰져 있다. 치매를 겪는 이들이 모여 함께 요리를 하고, 사교 행사를 열고, 장도 본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250여명의 간병인·의사·요양보호사·직원 등이 마을 곳곳에서 이들을 돕는다. 최근 영국도 이 마을을 모델로 치매마을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돌봄체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은 ‘치매 돌봄 경로’ 정책으로 환자를 개별 사례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정책에서 중심축은 치매 케어 매니저다. 이 매니저는 진단, 치매치료제 처방, 진단 이후의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 및 복지 분야 각종 서비스 안내, 서비스의 조정 및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2015년부터 모든 치매 환자는 치매 케어 매니저를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케어전문성 강화 방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일본의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교토 지역 사례 중심으로> 2018 HIRA 정책동향 12권
<영국의 치매 돌봄 경로(Care Pathway) 구축 사례> 2018 HIRA 정책동향 12권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개혁>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가을호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