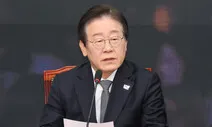‘합당 압력’ 존립 위협받을 수도
“진보정당 선도자 역할 더 중요”
“진보정당 선도자 역할 더 중요”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진보 경쟁’이 한창이던 9월 초 ‘원조 진보’인 민주노동당의 핵심 당직자를 만나 물었다. “우군이 늘어 좋지 않은가.” 돌아온 답이 애매했다. “한국 정치 전체로는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다시 만난 이 당직자는 “남의 당 전당대회를 가슴 졸이며 지켜본 건 처음”이라고 했다. 그의 설명은 이랬다.
“민주당 전대에서 나온 정책들을 봐라.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후연금, 아동수당….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도 쉽게 공언하지 못하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한 후보는 이걸 실현하겠다며 부유세까지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부유세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순간, 민노당은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 간판 내리고 민주당과 합당하라는 압력이 쏟아질 테니까.”
민주당의 ‘좌클릭’을 바라보는 진보정당의 태도는 이처럼 양가적이다. 이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맺고 있는 ‘보완적 협력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협력을 위해선 적당한 동질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동질성의 강도가 커져 ‘보완’의 필요성이 약해지면 힘이 강한 쪽으로의 통합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의 일부는 당의 진보적 변화를 진보정당과의 대통합으로 가는 수순으로 본다. 이인영·천정배 최고위원은 민노당, 진보신당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의 선결조건으로 민주당의 ‘진보정당화’를 들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전대 기간 “진보화된 민주당이 하나가 되자고 요구하는데, 진보정당이 그걸 거부하면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진보정당이 민주당으로의 ‘흡수 통합’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란 견해가 많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민주당 내부에 진보담론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노선이나 정책 비전 차원에서 당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내적 동력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복지 영역에 편중된 진보의 의제를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선도자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