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기사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가 담긴 댓글도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은 없다. 댓글난이 “그저 적당히 배설하고 너무 귀찮게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공된 게 아니라면, 댓글 전담 기자를 두어 상시적인 소통을 하면서 그걸 기사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과정을 통해 댓글의 질과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평소 언론이 외쳐대는 쌍방향 소통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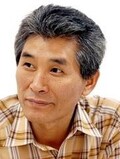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어느 정치평론가가 누리꾼들의 악성 메일과 댓글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사의 한 간부에게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간부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설마 그런 쓰레기를 다 읽어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절대 읽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 나간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뉴스의 시청자들이니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요.” 그러나 이 정치평론가는 자신에게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을 퍼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전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지독한 유형의 누리꾼들과 전화 통화를 해보기로 했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 내게 예의를 갖춰 얘기하고 친절하기까지 한 그들을 접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며 “한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끔찍한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은 자상하고 친절하며 좋은 아빠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평론가 샐리 콘의 <왜 반대편을 증오하는가>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지만, 한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도 욕설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그런 소통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악성 문자를 받기도 했다는 금 전 의원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의 경우엔 가끔 매우 정중하게 답변을 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어조가 부드러워지고 서로 대화가 가능해진다”며 “아마도 그런 답변을 받으면 상대방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가족도 있고, 출퇴근도 하고, 밤에는 잠도 자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소신 발언을 할 때마다 욕설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3000여개와 200여통의 전화를 받는다는 이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건다고 한다. 그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지만, 통화가 되면 ‘왜 그러냐’고 묻기도 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며 “이런 식으로 10명과 통화를 했을 때 1~2명과 공감대를 형성해도 큰 성과”라고 했다. 또 “대화하면서 몰랐던 것을 알기도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국민과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이 의원의 말이 인상적이라고 느끼면서 “언론은?”이라는 의문이 들었다. 신문은 기사에 댓글을 다는 독자들과의 소통은 시도하고 있을까? 우리 신문들은 댓글을 주로 사건 취재의 틀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걸 알리는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자신의 정파성에 맞는 정보만 소비함으로써 소통의 벽을 만드는 현상을 가리켜 ‘필터 버블’이라고 한다. ‘가두리’로 부르기로 하자. 날이 갈수록 신문은 ‘가두리 양식장’을 닮아가고 있다. 다양성을 멀리하고 획일성이 두드러진다. 이념의 다양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특정 이념을 실천하는 방법론의 다양성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기사에 대해 걸핏하면 ‘기레기’라고 욕하거나 ‘절독’을 외치며 위협하는 누리꾼들의 압력은 그런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익명의 공간에서 활약하는 그런 독자들을 대화의 공간으로 초청하는 건 어떤가. 신문들마다 상시적으로 누리꾼들의 대화 마당을 열어주고 이를 기사화하는 ‘댓글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무슨 결론을 내보자는 게 아니다. 각자 생각이 다른 누리꾼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의견을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의미와 더불어 재미가 있지 않을까? 물론 참석자들의 익명은 여전히 보장해주더라도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못지않게 선량한 시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게다. 가끔 기사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가 담긴 댓글도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은 없다. 댓글난이 “그저 적당히 배설하고 너무 귀찮게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공된 게 아니라면, 댓글 전담 기자를 두어 상시적인 소통을 하면서 그걸 기사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과정을 통해 댓글의 질과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평소 언론이 외쳐대는 쌍방향 소통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댓글을 잠재력이 매우 큰 ‘저널리즘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독자와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팬덤 언론’을 넘어서 [강준만 칼럼] ‘팬덤 언론’을 넘어서 [강준만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31/53_17040159821265_20231231501434.jpg)

![딥시크, ‘제번스의 역설’처럼 고성능 칩 수요 늘릴까 [유레카] 딥시크, ‘제번스의 역설’처럼 고성능 칩 수요 늘릴까 [유레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2390.webp)
![나의 완벽한 상사 [세상읽기] 나의 완벽한 상사 [세상읽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3/20250203503340.webp)
![최상목 ‘마은혁 임명’ 불복 땐 직무유기 [2월4일 뉴스뷰리핑] 최상목 ‘마은혁 임명’ 불복 땐 직무유기 [2월4일 뉴스뷰리핑]](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0613.webp)
![공교육에 부적합한 AI 교과서, 세금으로 무상보급 웬 말인가 [왜냐면] 공교육에 부적합한 AI 교과서, 세금으로 무상보급 웬 말인가 [왜냐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3/2025020350293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