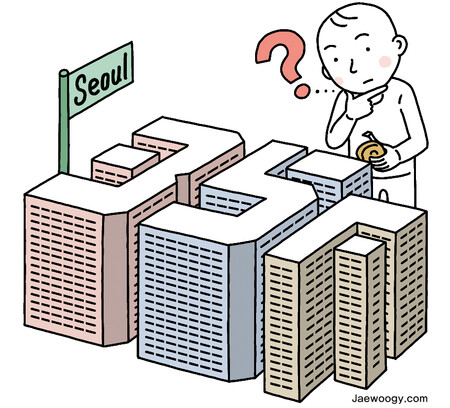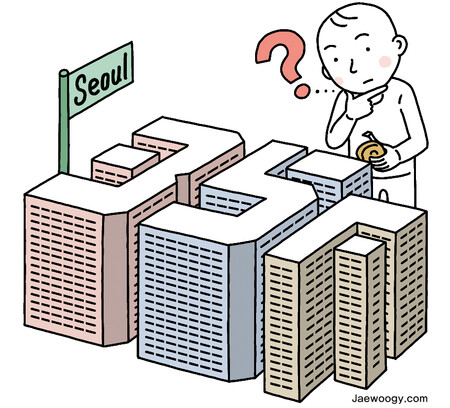서울에서 35층 넘는 집은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가 2014년 내놓은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35층 이하 높이로 건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35층 룰’이다.
한강변 아파트 단지가 비슷한 높이의 병풍 모양을 한 건 이와 관련이 깊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한강변 아파트 단지를 50층짜리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려던 계획이 번번이 좌절됐던 까닭이기도 하다.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초고층을 지을 수 있었던 성수동 일대 같은 곳은 예외 지대다.
아파트 층수는 이렇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몇 미터 아래여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법규상 아파트 한 층 높이는 2.2~2.4m 이상이어야 하고, 대개는 2.4~2.6m 정도라 35층이면 90m 안팎이다. 층고를 높게 설계할수록 건설사에는 손해여서 35층 룰로 건물 전체 높이는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국내에서도 부자 동네에선 층고를 높게 설계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35층 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터다. 규제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거나, 획일적 규제로 개성 없는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지적이었다.
서울시 산하 연구 조직인 서울연구원이 2017년 6월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라는 책자를 내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35층은 주먹구구로 나온 숫자가 아니다. 한강변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배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정 높이이며, 법적 용적률 상한선 300%를 적용했을 때 무리 없는 수준이다. 경관은 특정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다.”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35층 룰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공적 성격을 띤 재건축에 한해 35층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수평으로 늘릴 땅이 모자라 수직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옹색한 처지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다. 층수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 가격 안정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민거리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난리 속에서 35층 룰의 처지도 위태롭다.
김영배 논설위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