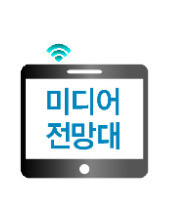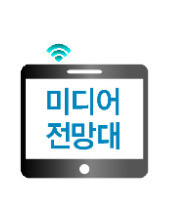최근 팔순 어머니의 유튜브 이용 패턴을 보고 크게 놀랐다. 6살 피아니스트가 출연하는 러시아의 한 방송 토크쇼 영상을 일과처럼 매일 반복 시청하시는 게 아닌가. <뽀로로>를 반복 시청하는 유아들과 비슷하게 영상의 모든 장면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였다. 낯선 러시아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영상을 보실 때는 진짜 ‘엄마 미소’를 지으며 어린이 출연자에게 몰입하셨다. 유튜브 앱이 웃음 버튼이자 활력소가 된 것이다. 어머니의 유튜브 시청은 지인들의 카톡으로부터 촉발됐다. 흥미로운 건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직접 작성하는 문자보다 터치 두세 번으로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블로그, 그래픽 데이터(GIF) 형식으로 소통하는 데 익숙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머니의 미디어 효능감은 확실히 높아졌다. 지인들과 더 자주 연락을 나눴고 스마트폰 활용 시간은 늘었다. 막연했던 4차 산업혁명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경제, 산업, 교육, 환경 등 각 영역에서의 논의가 활발하다. 미디어 분야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토대로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과거 미디어 기관과 이해관계자를 중심축에 놓던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미디어 이용자 경험 중심의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미디어의 자기 주도성을 어떻게 갖추게 됐는지, 가짜뉴스와 진짜 정보를 어떻게 감별했는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결속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미디어와 삶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정책으로 논의가 펼쳐졌으면 한다.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의 전면적 변화는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초조사들은 미디어 이용의 맥락적 접근보다는 행위 중심의 조사 연구가 대부분이다. 미디어 행위의 측정 개념조차 모호해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텔레비전 시청’ 개념을 예로 들어보자. 2019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와 2019년 9~11월 벌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여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여가활동은 ‘텔레비전 시청’(통계청 79.2%, 문체부 43.9%)이 압도적인 1위였다. 순위는 같지만 수치의 차이가 크다. 이 밖에 ‘인터넷 검색’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조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했는지 모호하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방송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시청일까? 텔레비전 수상기로 본 유튜브는 에스엔에스일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유튜브, 카톡을 구분해 인식하시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새로운 방법과 개념으로 미디어와 이용의 맥락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한국언론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언론학보>의 60년 치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재미있는 결과를 마주했다. 이 학술지의 상위 피인용 논문 중 두 편이 ‘이동전화 중독증’ 관련 연구였다. 이 논문들이 많이 인용된 까닭은 새로운 미디어 기기의 과다 사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리라. 이런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던 십수년 전과 달리 미디어 기기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사회로 진입했다. 생활방역이 필수조건이 되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미디어와 이용 가이드라인, 미디어 이용 격차 해소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최선영 ㅣ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