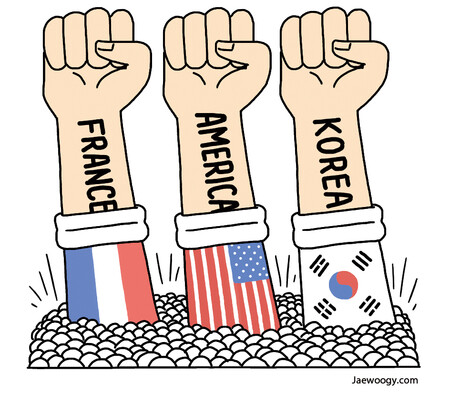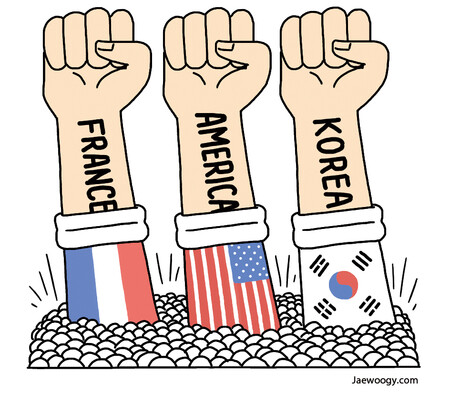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각각 ‘해방’과 ‘자유’라는 열쇳말로 규정했다. 프랑스혁명이 빈곤과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민중의 반란이었다면, 미국혁명은 자유로운 시민의 참여로 헌법과 제도를 확립한 변혁이었다. 둘은 경로도 대조적이다. 프랑스는 왕정복고 등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드골의 제5공화국에 이르렀지만, 미국은 1792년 헌법 제정 때의 공화국이 그대로 유지됐다.
아렌트는 프랑스혁명이 미국혁명과 달리 인간의 다양성에 근거한 공동권력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적이었다. 그는 프랑스혁명의 공포정치가 마르크스와 레닌을 거쳐 스탈린 전체주의의 원형을 제공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개인과 자율을 중시하는 영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연대와 화합을 강조하는 프랑스 공화주의가 더 외연이 넓다는 시각도 있다. 혁명 당시부터 보통선거제가 도입됐고, 20세기 초 제3공화국은 당시 유럽 열강 중 유일한 공화국이었다. 미국혁명은 소극적 공화정일 뿐 프랑스혁명이야말로 적극적 의미의 공화정, 세계시민 정신의 구현이란 평가도 있다.
우리 현대사는 미국보다는 프랑스에 가깝다. 정체는 미국식 대통령제지만 정치사는 오랜 세월 전진과 퇴행을 반복했다. 해방 이후 좌우 대립과 6·25전쟁, 4·19와 5·16, 5·18과 6월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2016년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또다른 민주주의 드라마 역시 단선적이지 않다. 촛불혁명은 엄밀한 의미의 혁명은 아니지만 명예혁명, 시민혁명이란 뜻에서 혁명이란 말을 사용할 뿐이다. 2019년의 또다른 촛불, 광화문의 태극기 물결은 우리 민주주의 대장정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최근 프랑스에선 ‘노란 조끼’ 시위대가 발발 1년을 맞아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다. 노란 조끼는 외견상 불안정해 보이지만 평등과 연대를 향한 저항이 여전히 프랑스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의 자유주의 체제가 때론 효율적이지만 각각엔 고유한 길이 있다. 프랑스가 오랜 세월 공화국으로서의 긴 여정을 걸었듯 우리도 성숙한 민주주의, 격차 없는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멀고도 험난한 우리의 길을 걷고 있다.
백기철 논설위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