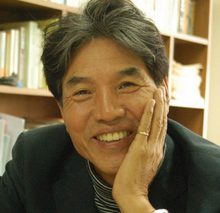
박범신 작가·명지대 교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반대편으로 누워 잠드셨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머리를 남쪽으로 내려놓으셨다면 어머니는 머리를 북쪽으로 내려놓으시고 잠드는 식이었다. 아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늘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초가는 방이 두 칸이었다. 아랫방과 윗방이 다 채 세평이나 될까말까한 비좁은 방이었다. 그나마 윗방엔 쌀자루나 고구마 등이 쌓여 있기 일쑤여서 두 사람이 누워도 발을 쭉 뻗을 데가 없었다. 위로 누나 네 분을 합쳐 우리 식구는 도합 일곱 명이었다. 좁은 방에 여럿이 어깨를 펴고 누우려면 서로 엇갈려 눕는 게 상수였다. ‘그 시절의 버릇 때문일 것’이라는 내 설명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다. ‘가족이란 몸에 들러붙은 피부 같은 것’이라고, 내게 사실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서로 몸을 부비면서 잠들던 그 좁은 방이었고, 그것은 평생의 내 가족관을 형성하는 옹이가 되었다.
읍내로 이사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봄이었다. 어엿한 기와집이었고, 방이 세 칸이었다. 누나들도 시집간 뒤라 나는 온전히 내 방을 가질 수 있었다. 기찻길 옆이어서 기차가 지날 때면 구들장이 부르르 떨리는 방이었다. 말수 적고 내성적인 소년이었던 내게 어둑신한 그 방은 맞춰 입은 옷처럼 잘 들어맞았다.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다.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그 방에서 책과 함께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지식인들이나 읽던 <사상계> 정기구독을 신청해, 일년구독비를 냈으면서도 3년 구독권을 추첨으로 받는 행운을 누렸을 정도였다. 나의 독서 수준은 그때 이미 고교생이 아니었다. 모두 그 방이 준 선물로서, 작가로 나를 키운 8할은 그 방이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몇 달은 모래내 천변의 판잣집에 살던 큰누나네에 얹혀 있었다. 악취가 났고, 장마만 오면 번번이 물에 잠기는 방이었다. 60년대 후반이었다. 천변 끝에 푸세식 공중변소가 있었는데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아침이면 공중변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새치기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변소 앞에선 늘 목불인견의 드잡이가 벌어지곤 했으며, 내 방에선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아, 특별시에선 똥싸기도 어렵구나 하고 나는 자주 탄식을 내뱉었다.
몇 달 후 나는 광화문 일대 밤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인왕산 중턱의 친구 집 다락방으로 옮겼으며, 또 얼마 후엔 신당동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왜식목조 이층, 딱 다다미 한 장이 깔린 방으로 흘렀다. 겨울이었고, 때마침 서울역 앞 사창가 단속으로 쫓겨난 밤색시들이 그 일대로 옮겨와 터를 잡는 바람에, 나는 본의 아니게 많은 밤색시들과 방을 이웃하여 써야 했다. 다다미방이라 이불 속에 누워서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연탄가스로 죽어도 좋으니까 따뜻한 구들이 있는 방에서 자는 것이 그 시절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다. 이불을 둘러쓰고 곱은 손 입김으로 녹이면서 ‘신춘문예’ 응모 소설을 처음 쓴 것도 그 방에서였다. 작가에의 꿈이 깊어 춥고 배고팠지만 비참하진 않았다.
그 뒤로 내가 더 거쳤던 수많은 방, 방, 방들이 지금 떠오른다. 유랑은 끝이 없었다. 꿈에도 그리던 작가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을 하고 나서도 셋방에서 셋방으로 흐르는 유랑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어디 나만 그랬겠는가.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의 ‘특별시’에 사는 사람의 반 이상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와 ‘방’을 쫓아 흐르는 유랑민이었다.
젊은 날 나를 담아내던 그 수많은 방들은 지금 어디에 흘러가 진토 되었는가. ‘G20’을 홍보하는 영상을 보다 말고 깊어지는 가을밤, 문득 내가 거쳐온 지나간 방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성찰의 계절이라는 올가을엔 비록 남아 있지 않을망정, 내가 거쳤던 방들을 순례해봐야겠다. 지금의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옹골지게 들여다보는 것이 곧 자기성찰이 아니겠는가.
박범신 작가·명지대 교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윤석열 “간첩 싹 잡아들이라 한 것” 누가 믿을까? [2월5일 뉴스뷰리핑] 윤석열 “간첩 싹 잡아들이라 한 것” 누가 믿을까? [2월5일 뉴스뷰리핑]](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5/20250205500500.webp)
![[사설] 속속 드러난 ‘윤석열 거짓말’,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사설] 속속 드러난 ‘윤석열 거짓말’,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3616.webp)
![민주주의 흔드는 ‘레드 콤플렉스’ [하종강 칼럼] 민주주의 흔드는 ‘레드 콤플렉스’ [하종강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5/20250205500142.webp)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 [세상읽기]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 [세상읽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3/2025020350018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