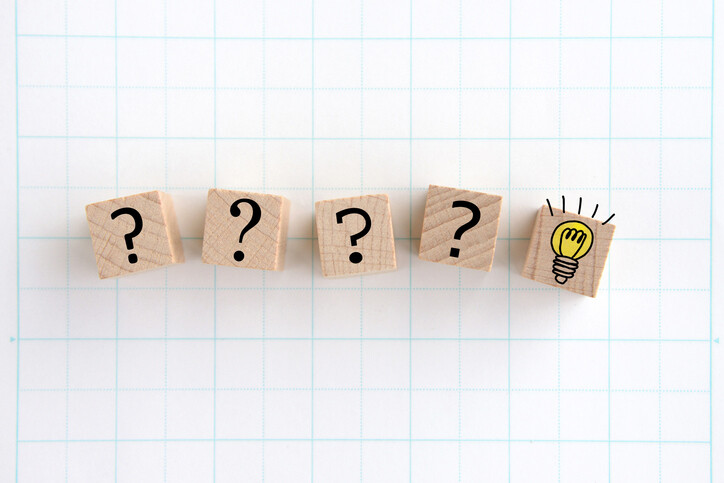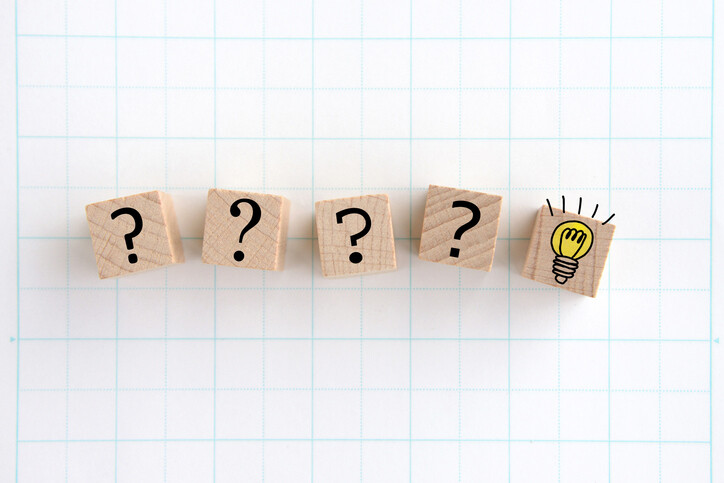[똑똑! 한국사회] 전은지 |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과학자가 되기 위해 수련받은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문제를 풀어왔다. 쉽게 풀리는 문제도, 영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수련 기간이 길어질수록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많아졌다. 잘 풀리는 문제는 이미 누군가 풀어버렸기 때문일 테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마주하고 수없이 밤을 지새우며 배운 것이 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먼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하는 일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나열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인데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것이 드러난다. 되돌아보면 내 연구가 길을 잃었던 시기는 그런 알고 있다는 착각이 누적됐을 때였다.
미국에서 박사학위가 마무리되던 즈음, 같은 연구실에 있던 박사후연구원 선배에게 이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는 나의 고민을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그럴 때는 일단 적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한 모든 사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보는 거야. 1+1=2라는 사실도 적어야 해. 그러고 나선 그 모든 항목에 이유를 달아보는 거지.”
“1+1=2가 되는 것도 이유를 적으라고?”
“(웃음) 그럼! 적어야 해. 이런 시점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한톨도 빠짐없이 모두 의심해야 해. 그렇게 의심하다 보면 결국엔 찾게 될 거야.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있지 못했던 것 말이야.”
이날의 대화는 ‘과학자에게 있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나에게 남겼다.
한때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말이나 글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의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선생으로 교단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이 ‘거짓’은 아닐지라도 ‘전부’는 아닐 텐데,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알지 못한다. 아마도 과학자로 살아가는 내내 답을 찾아 헤매야겠지. 다만 이 질문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 있다. “안다고 확신하지 말고 회의하라”는 것이다.
아는 것이 나타났다고 덮어두고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알고 있는 것도,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세분화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확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얼마 전 일이다. 연구팀원 중 하나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찾아왔다. 자료를 펼쳐두고 그가 선택한 방법과 결론도출 과정을 들으며 문장 문장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다. 질문을 시작했을 때 그는 당황하는 눈치였다. 아마도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리라. 처음엔 단단한 눈빛으로 막힘없이 답을 내놓았지만 질문이 계속되자 어느 순간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며칠 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주기 위해 들른 그에게 이야기해줬다. “안다는 확신이 눈을 흐리게 해.”
정치, 사회 곳곳에서 ‘과학’ 또는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대다. 대부분은 과학을 ‘의심할 바 없음’의 뜻으로 쓰는 것 같다. 하지만 풋내기 과학도 시절 ‘모르겠다’는 말을 두려워하던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과학은 ‘의심’이며, 과학자는 ‘명쾌한 답’을 내놓는 이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이라는 것을 말이다.
확신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일이다.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