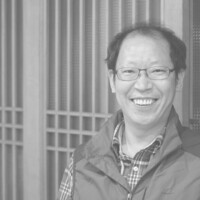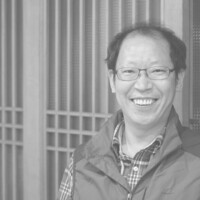[숨&결] 이광이 | 잡글 쓰는 작가
날마다 이른 아침 산에 오른다. 내 사는 곳이 서울의 동북방 변두리 끝이어서 농담 삼아 의정부시 남구라고 부르는 동네다. 집값 헐한 데가 대개 그렇듯이 지하철은 멀고 산은 가깝다. 잠깐 걸으면 벌써 불암산 한자락이 내려와 있다. 산길 초입에 큼지막한 교회 예배당이 있고, 중턱에 오르면 마애관음상이 있는 암자가 나온다. 그 관음보살을 향해 서서 삼배하고 돌아내려 오면 1시간 정도. 아침 산은 언제나 좋지만 밤새 비가 오신 이튿날 아침이 제일 좋다. 맑고 시원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계곡은 소리 내어 흐른다. ‘까악깍~’대는 까마귀 소리, ‘딱따그르르~’ 하고 딱따구리가 쪼는 소리도 들리고, 초목에서는 양분을 끌어올리는지 진한 향기가 난다.
한바퀴 돌아 다시 교회 옆을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산길을 줄기차게 오르내리면 어떻게든지 구원은 받겠구나! 그러다가 아니, 나를 구원하는 것은 신이 아닐지도 몰라, 우유를 마신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는 얘기처럼, 나를 구원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신발일지도 모른다는 가지가지 잡생각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 어제 술을 마시고, 아침 산에 다녀오면 저녁에 다시 마실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다. 산과 술은 이렇게 윤회한다.
그냥 오르는 것은 심심하여 한동안 음악을 듣고, 습관처럼 반야심경을 읊으며 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의 불안이 떨어지지 않는다. 몸은 가음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가끔 전조가 나타나는 것이 어젯밤 술안주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유전성 치매는 걱정이 없고, 훗날 알코올성 치매가 심히 우려되는 바다. 그래서 궁리를 했다. 머리를 써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외우며 걷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때 떠오른 것이 시(詩)다. 언젠가 딸아이가 국어책에 나온 이 시가 좋다면서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가져와 같이 읽어보고, 나도 좋아서 막걸리를 한잔했던 기억이 났다. 이것을 외워보자. 시집 <사슴>을 찾아 다시 보니 되게 길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산길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여러번 소리 내어 읽는다. 나이 들면 열심히는 안 해도 꾸준히는 하는 법. 일주일 지나면 슬슬 입에 붙는다. 한 중년 사내가 어느 목수네 집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 들어 가난하고 슬프고 부끄러웠던 옛일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다가, 허연 문창에 싸락눈이 치는 어느 때에, 먼 산 바위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쌀랑쌀랑 눈을 맞을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다시 살아갈 무엇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중년의 우리 이야기 같아서 꼭 외워야겠다고 조바심내지 않아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 차츰 머릿속에 들어온다. 한달쯤 지나면 안 보고도 시를 읊게 된다. 마치 이 시를 내가 쓴 것 같은, 내가 시인인 양 기분 좋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그즈음 강호의 술자리에서 흥이 오르면 나도 모르게 이 시를 읊게 되는데 중간에 까먹고 낯부끄러운 일을 당하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 자랑은 시가 찰싹 달라붙어 입이 외우기 전에는 안 된다.
여러 날이 지나면 더 깊이 시 속으로 들어가 갈매나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가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는 무엇이로구나, 옛날 촌에서 어른들이 ‘쟁기질은 먼 데를 보고 하는 것이여. 코앞만 보고 하다가는 구불구불하게 되는 거라, 멀리 보고 나가야 똑바른 거여. 이랑이 굽은 것은 소 탓이 아니고 사람 탓이라’고 했던, 잊고 있었던 그 쟁기질과 비슷한 것이로구나.
또 아침이 되어 산을 오른다. 하나를 하면 하나를 더 하고 싶어져서 요새는 그의 시 ‘흰 바람벽이 있어’를 읽고 다닌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것, 정녕 나를 구원하는 것은 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