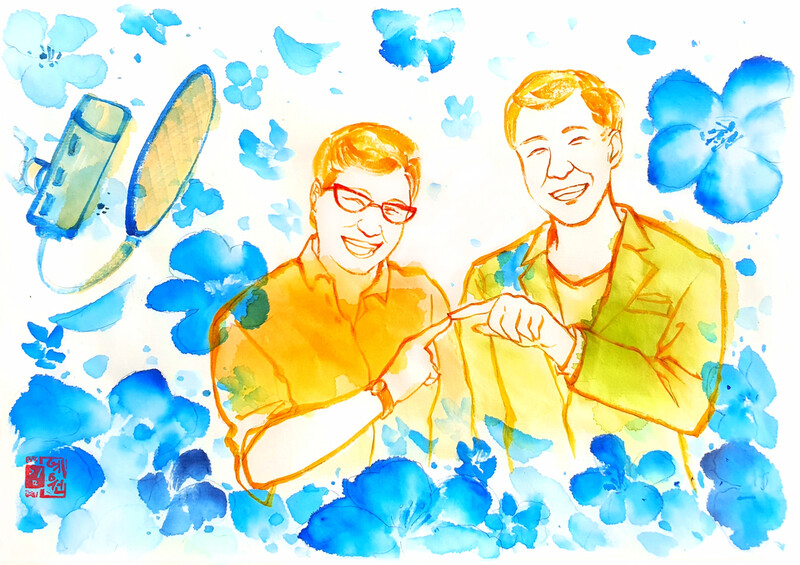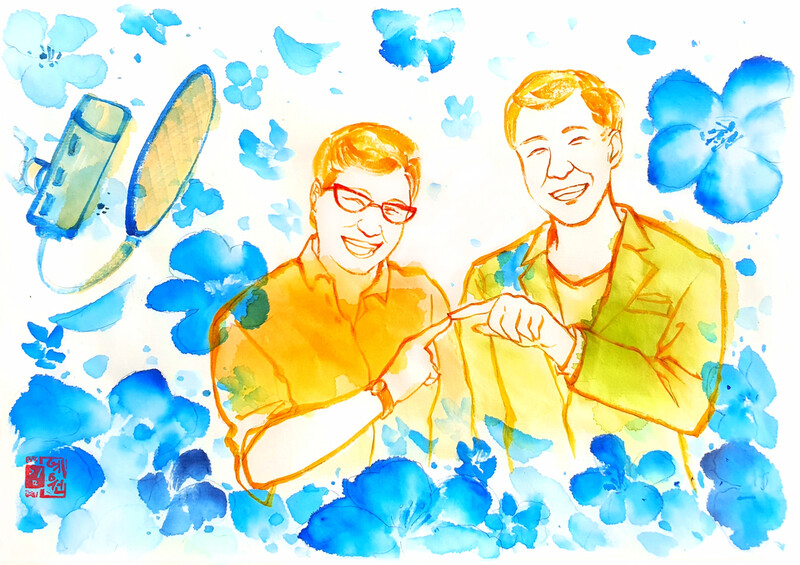양희은 | 가수
수영장 라커룸에서 초면인 어떤 분이 “ㅅ식물원 가보셨어요?”
“아니요, 거기가 어딘데요?”
“이 동네 가까이 있나 봐요. 마곡나루에 있다는데 그렇게 좋대요. 남편과 나들이 가보셔요.” 한다.
“그래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가봐야지.” 대답했다.
사람들은 꽃구경을 많이 가나 보다. 우리 모임도 9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옛날식 함박스테이크, 비후까스, 라자냐와 스파게티까지 ‘역시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최고’라며 정말 잘들 맛나게 먹고, 남산한옥마을을 거쳐 남산 오르기 산책에 나섰다.
초행인 내게 멋진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좋아 보였다. 장독대에 뒤뜨락에 심지어 조금은 뜬금없는 탈곡기도 신기했다. 뜰 안에는 비비추싹이 죄 들고 일어나는 중이다. 누군가 “여기 와봐. 복사꽃이다. 이 향기 좀 맡아봐. 히야~ 은은하면서 화사한 게 매화와 비교되네.” 갓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가 곱게 한복을 차려 입고 곁에는 안사돈인 듯한 두 부인네도 곱게 차려입었는데, 깔맞춤이 어찌나 은은한지.
“아이들 데려오면 좋겠어. 우리 옛날엔 이렇게 살았다고 알려줘야지.”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갖고 두루 구경을 한다. 날도 좋고 오랜만의 모임이라 삼삼오오 수다가 끊이질 않았지만, 점심이 푸짐했기에 남산 오르기는 버거워 하나둘씩 흩어졌다. 앞날에 대한 불안, 노년의 수면장애, 우울감, 세상 떠난 애견 이야기 등등 부담 없이 털어놓으면서 걱정의 무게도 가볍게 하는 행복한 수다가 고맙다. 오랜만에 만나도 심각한 이야기보다 이런 신변잡사를 터는 게 좋다.
4월 첫주 식목일에는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그 전날 엄마 모시고 벚꽃드라이브 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내보다 3~4℃가량 낮은 일산은 윤중로나 올림픽대로에 핀 벚꽃이 시들해질 때쯤 흐드러진다. 그래서 늦깎이 꽃구경이 가능하다. 우리집 정수기가 말썽이라 엄마는 희경이네로 가셔서 샤워하셨다. 머리 말리고 움직이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희경이가 차로 모시고 정발산 둘레 한바퀴 돌아오겠다기에 나는 정수기 수리하러 오시는 분을 기다리기로 했다.
흐드러진 꽃잔치 속에 4월은 산불소식도 전했다. 뉴스를 보며 ‘시커멓게 타들어간 숲이 회복되는 데는 30~100년이 걸린다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어린 날의 포스터 그리기가 떠올랐다. 식목일 주간과 불조심 강조 주간, 유엔 데이에 그린 포스터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불조심인 걸 안 때는 어른이 돼 뉴스로 보면서였다. 이번 산불은 너무 했다. 하필 봄철 건조기인 데다, 바람까지 세게 부는 통에 불길 잡는데 애쓴 분들도, 초조하게 밤새 불길을 보는 동네 분들도 속이 속이 아니었겠다. 어린 날부터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불을 일으키는지 뉴스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다.
이맘 때면 방송국 안은 소위 봄 개편으로 어수선하다. 사람 바뀌지 않고 진득하게 가면야 편하고 좋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제작진이 바뀌면 낯가림 심한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방송경력이 40년 넘었다면서 뭐? 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목 뒤 어깨 다 딱딱하게 굳고 힘이 든다. 제작진은 그렇다 치고 옆지기와는 마치 스케이트 복식조 같아서 위로 들어 올리고 또 내려오면 받고…. 받아준다는 믿음과 잘 맞아떨어지는 호흡이 없다면 같이 할 이유가 없다. 좀체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최악의 부부 사이라면 이혼이라도 하지. 일로 맺어진 옆지기가 바뀌면 서로에게 맞추기까지 등빨이 선다. 하지만 일궁합이 잘 맞으면 남녀상열지사와 비교도 안되는, 소위 케미가 잘 맞는 사이가 된다. 설명 없이 속생각을 읽어버리는 사이, ‘찌찌뽕’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이, 싫어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비슷한 사이가 된다. 그러면 방송은 절로 물 흐르듯 흘러 간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흐름을 탄다.
가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마음 둘 곳 없어 헛헛할 때, 세파에 시달려 지치고 고단할 때, “아! 저 사람 아직도 그대로 있네.” 왠지 안심되는 듯한 익숙함과 집 같은 안락함을 주는 변하지 않는 누군가가 그립다.
주말 아침 일찍 수영장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물 위에 아른거리며 예쁜 굴절을 만들어 다시 벽으로 비추는 무늬가 곱다. 때 맞춰 음악도 동요가 나오니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따라부른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내 아버지는 가신 지 59년이 되시네. 서른아홉에 떠난 건 참 너무 살지도 못하고 가셨네. 대신 울 엄마는 94살. 우리에겐 늙은 엄마가 계셔서 참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