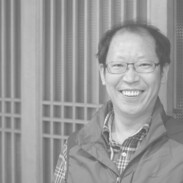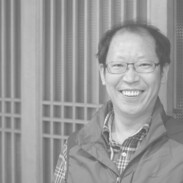[삶의 창] 이광이 | 잡글 쓰는 작가
갈수록 견디는 힘이 떨어진다. 인생 오십고개 지나면 한풀 꺾이는 것이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까딱 잘못하다가 하산 길에 넘어지는 일이 많다. 견디는 힘이 부치니 못 견디는 것들이 활개를 친다. 작은 일에 낙담하고, 분개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허망한 생각들은 쉽게 우울로 이어진다. 그중에 제일 현저한 것이 화다. 화는 이것을 견디면 저것이 나오고, 동전 넣고 망치로 때리는 두더지잡기 놀이처럼 불쑥불쑥 튀어오른다. 거기에 ‘용산발’, ‘양산발’ 같은 만인의 화까지 겹치면 천불이 나곤 한다.
근래 잘 참지를 못하고 피곤하고 살이 빠져 병원에 가봤더니 항진증 수치가 높다고 나온다. 항진은 신체기관의 작용이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증상이다. 한자는 다르지만 배가 저 태평양을 끝없이 항진하는 것과 같다. 쓸데없이 과로하니 금방 지친다. 이러다가 미국까지 가겠다 싶어 약도 먹고, 견디는 힘을 길러 항진의 속도를 늦출 궁리를 했다.
바람이 그렇듯이, 미움의 무게는 잴 수가 없다. 담배 한대 태우는 시간에 잠깐 일었다 사라지기도 하고, 평생을 짓누르는 거대한 돌덩이가 되기도 하고, 형체도 없는 것이 요술을 부린다. 나는 며칠간 화를 내야 할까? 네가 미우니, 한 열흘쯤 화를 내야 할까? 상처를 입었으므로 미움이 생겨나고, 화를 내며 되갚음하려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다. 그런데 열흘이 적당한가?
미움의 무게를 모르니 화의 길이가 안 나온다. 사흘 거리를 과대 포장하여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 그동안 내 화의 시간이 길었구나 하는 반성이 든다.
‘차불과야’(茶不過夜)라는 말이 있다. 차가 밤을 넘지 못한다는 중국 속담이다. 차가 아깝다고 어제 우리다 남은 것을 오늘 마실 수는 없다. 밤을 지나면서 차 맛이 변하기 때문에 그날 차는 그날 버리고, 다관은 설거지하여 엎어 둔다. 첫 글자 하나를 바꿔 ‘화불과야’(火不過夜)라고 만들어보았다. 차가 밤을 넘지 못하듯이, 화도 밤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화가 밤을 넘으면 더 커지고 제 집처럼 마음속에 척 눌러앉는다. 이 밤을 넘지 못하게 하려면 자정 전에 불을 꺼야 한다. 그러니까 불화와 갈등과 미움과 노여움 같은 것들을 그날 쫓아내자는 것이다. 내가 일단 정한 것은 화가 나면 화를 좀 내다가, 늦어도 자정 전에는 먼저 일방적으로 사과해보자는 것이다. 찾아가기 힘들면 전화도 있고, 얼굴 안 보고 하는 문자도 있고, 에스엔에스(SNS)도 있고, 다짜고짜 사과하는 것, 요샛말로 ‘닥치고 사과!’ 그쯤 되겠다.
해보니 어렵다. 목표를 생활체육 선수로 잡았어야 했는데 국가대표로 너무 높게 잡은 기분이다. 망설여지고, 또 망설여지고, 보리 겨를 뒤집어쓴 것처럼 온몸이 까슬까슬하다. 자정 지나고, 이튿날 넘기고, 며칠 가기도 했고, 메아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너를 용서 않으니, 내가 힘들어 안 되겠다’는 조용필의 노래 가사처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았다. 그 덕분인지 항진의 속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재면 못 한다. 할까 말까가 마음속에 일어나기 전에 탁 해버려야 한다. 이왕 마음먹은 것, 탁 해버리고 나면 방바닥을 한번 쓸어낸 것처럼 후련한 뒷맛이 좋다.
그래도 화가 난다. 견디는 힘이 또 떨어지는 것이다. 화불과야 몇번 했다고 해서 사라질 화가 아니다. 뽑으면 또 나고, 돌아서면 어느새 무성한 마당의 잡풀 같다. 화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오늘도 뽑고, 내일도 뽑는 수밖에 없다. 여름은 가고, 소슬한 가을이 사립문 안으로 들어와 날도 한풀 꺾이고, 풀도 한풀 꺾이고, 화도 한풀 꺾이니, 견디는 힘을 기르기 좋은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