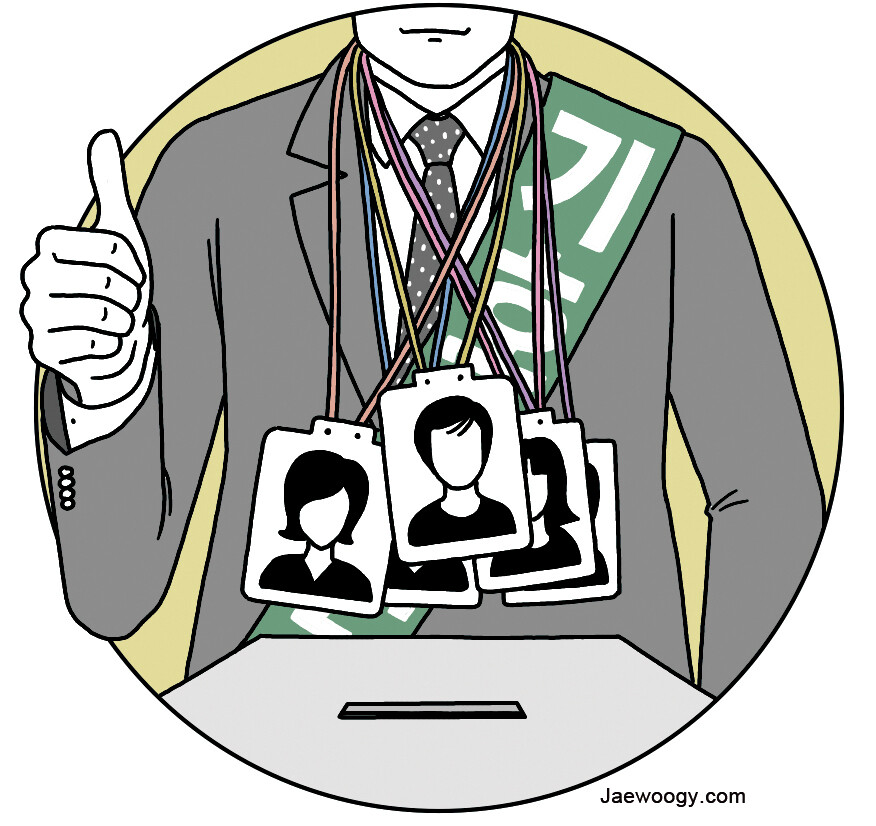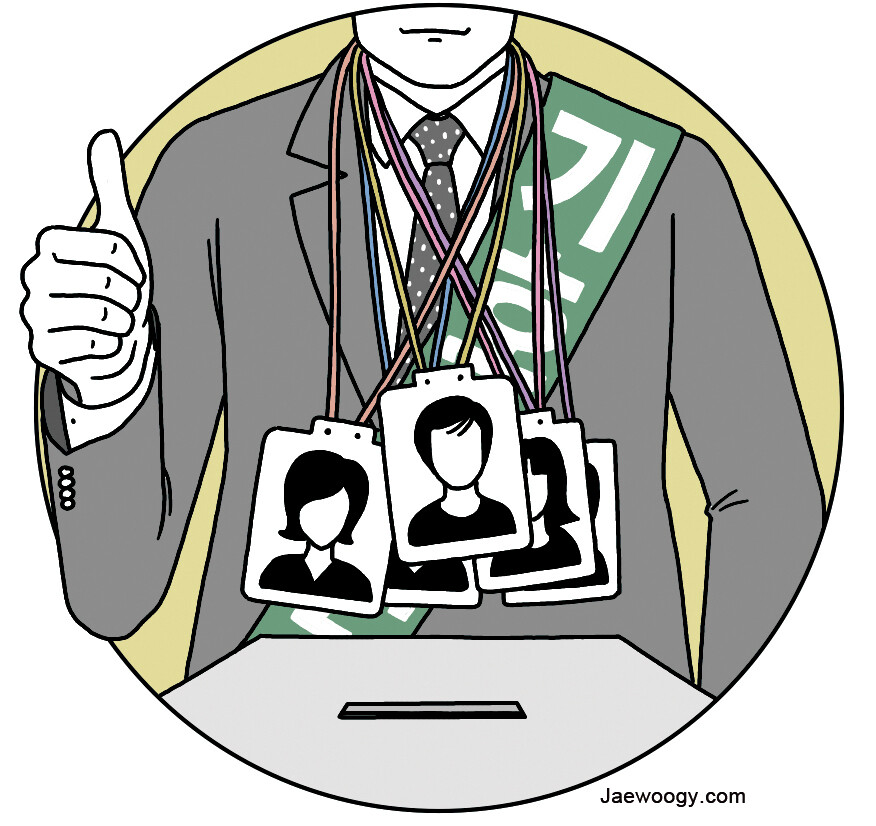정치 분야, 특히 선거에서 ‘스토리’(이야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순 없다. 정당들이 표방하는 이념이 중도로 수렴하면서 가치와 정책보다는 후보 경쟁력의 비중이 과거보다 커진 탓이다. 특히 정치 입문 단계에선 빼어난 ‘스펙’보다 ‘스토리’의 유무가 후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학벌이나 직업 이력이 엇비슷한 정치권 인력풀의 특성상, 극적인 인생 서사를 갖춘 인물일수록 대중 소구력이 크기 때문이다.
3김 시대엔 민주화운동을 하며 고초를 겪은 저항 엘리트들이 중용됐다.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희생·헌신의 서사’에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김근태·이부영 등 재야 명망가와 김민석·송영길 등 1980년대 학생운동권이 대표적이었다. 이런 헌신의 서사는 ‘흙수저 성공 신화’와 만날 경우 파괴력이 한층 배가됐다. 1988년 통일민주당 공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상고 출신 인권변호사’ 노무현, 1996년 신한국당이 영입한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가 여기에 속한다. 굳이 분류하자면 ‘소년공 출신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같은 계보다.
최근엔 스토리의 구성 요소로 ‘소수자성’이 추가되는 흐름이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삼성전자 전 상무 양향자, 2020년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강동대 교수 최혜영 등이 그렇다. 양향자는 호남 출신의 여상 졸업생, 최혜영은 여성 장애인이라는 소수자성이 ‘성공 스토리’를 한층 돋보이게 만든 경우다. 최근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발탁됐다 낙마한 서경대 교수 조동연도 마찬가지다. 그는 ‘육사 출신 여군 장교’라는 희소성과 ‘군사·우주항공 전문가’라는 전문성, ‘30대 싱글맘’의 소수자성이 결합해 서사적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
스토리가 있는 신인일수록 마케팅 차원에서 중용될 여지가 큰 게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스토리가 개인의 정치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좋은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부단한 학습과 자기성찰, 대중과의 성실한 교감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강조되는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아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정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이세영 논설위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