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언론은 무척 많이 좋아졌다. 그럼에도 과거보다 더 많은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 사회 발전 속도를 언론이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또 정파성이 결합된 기사에는 ‘호랑이 오보’ 기사가 여전하다는 게 한국 언론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짐이다.
“독자랑 시청자 탓을 하기 전에 ‘우리부터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출발해야 한다.
손석희 전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앵커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2021 저널리즘 주간 - 다시,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김영희 선임기자 dora@hani.co.kr
권태호|저널리즘책무실장·논설위원
<한겨레> 매주 금요일치 26면에는 젊은 기자들이 쓰는 칼럼(
슬기로운 기자생활)이 있다. 지난달 29일
‘모든 기자는 독자였다’(이정규 한겨레21부 기자)는 칼럼이 실렸다. 입사 만 3년이 조금 지난 이 기자는 고등학교 시절, <한겨레21>과 좋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런데 한겨레21 기자인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일을 할수록 독자와 멀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좋은 독자는 저널리즘을 떠나나 싶어 두렵다”, “기자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마다 기자의 좌표는 좋은 독자라는 말을 되뇐다”, “앞으로 저널리즘을 아끼고 한겨레를 애정하는 독자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 글에서 불안이 느껴져 선배 된 자로 미안했다.
전날인 28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2021 저널리즘 주간’ 행사장을 찾았다. 손석희 전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앵커가 기조연설에서 레거시(전통) 미디어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이 “구경의 대상이 된 고궁 문지기처럼 된 것 아니냐”는 자조적 분석(?)에 이어 “정말 중요한 기사라면 마땅히 정당하게 소비해줄 시민사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뒷말을 붙였다. “이상적으로 들릴 것”이라며 “그걸 극복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요”라고.
행사장인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 입구에는 행사 주제어인 ‘다시 저널리즘’이란 글이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문득 든 생각, ‘그럼 옛날에는 저널리즘이 괜찮았었나’.
오늘날 한국 언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정파성 △전문성 부족 △인권 의식 부족 △오보 등을 기준 삼아, 포털에서 1980~90년대 언론 기사를 들춰 보라.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다. 정파성은 제외하더라도, 전문성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무리하고 무신경한 취재, 허무맹랑한 오보가 무수하다. 교수 코멘트까지 곁들여
‘한국산 호랑이가 나타났다’며 경북 대덕산에서 58년 만에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다음날 어린이대공원 벵골산 호랑이임이 밝혀진 일도 있었다.(<동아일보> 1980년 1월24일, 25일치)
언론계 바깥에선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비해 언론은 무척 많이 좋아졌다. 그럼에도 과거보다 더 많은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 사회 발전 속도를 언론이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전문성과 인권 의식 부족, 양쪽 모두 그렇다. 또 하나는 레거시 미디어라면, 요즘에는 최소한 ‘호랑이 오보’ 정도는 걸러진다. 그런데 정파성이 결합된 기사에는 ‘호랑이 오보’ 기사가 여전하다는 게, 한국 언론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짐이다. 일부 언론이 정파성에 과도하게 기우는 이유는 내세울 게, 팔아먹을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뉴스 수용자들이 반대급부로 ‘해장국 언론’을 더 갈구하게 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럼 앞으론 언론이 정신 차리고 ‘저널리즘’만 제대로 구현하면, 떠났던 독자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수익도 좋아지고, 언론의 사회적 평판도 높아지고, 우리 사회는 언론의 제 역할(권력 감시와 약자 보호)로 더 나아질 것인가. 이정규 기자가 의구심을 표하고, 손석희 전 앵커가 자신 없어 하듯, 직책에 ‘저널리즘’이란 거창한 이름이 붙은 나도 확신을 못 하겠다.
언론업(?)이란 묘한 업종이다. 상품이란 기본적으로 소비자 취향을 따른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늘 좇는다. 그러나 진정한 언론이란,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한다. 때론 공공(Public)을 위해 언론 기업의 사익을 포기하는 힘든 선택도 해야 한다. 손 전 앵커는 이를 ‘정론’이라 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날 수 있고, 때로는 용감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날 수 있는 언론”이라 했다.
1년 반 전 신문을 봤다. <한국일보> 인턴기자들의 방담,
‘밀레니얼 청문회―진정한 저널리스트’(2월19일치)다. ‘기레기 현상’을 언급하며 한 인턴이 말했다. “‘기레기’는 두 부류가 있어. 어뷰징하는 기사를 쓰면서 깊이 있는 취재를 하지 않는 기자, 그리고 민감한 사안을 취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편의 공격을 받는 기자.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러자 또 다른 인턴기자가 “언론 수용자의 문제는 없을까”라며 ‘미디어 교육’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사는 이렇게 끝맺는다. “동감하지만, 난 여전히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가 근본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독자랑 시청자 탓을 하기 전에 ‘우리부터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게 출발점이 돼야 할 것 같아.”
이정규 기자가 내 위치가 됐을 때, “2020년대의 언론과 지금을 비교해보라. 그때는 정말 형편없었다”는 칼럼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지금’ 출발해야 한다.
ho@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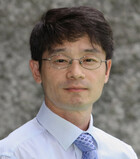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