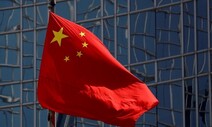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2일 영국 런던 외곽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일정으로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0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런던/EPA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립 70주년을 맞아 회원국 정상들이 3일부터 이틀 동안 영국 런던 교외에서 모였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대·최강 군사동맹 체제인 나토는 ‘정상회의’(서밋)로 불리기를 거부했다. 나토 대변인은 “단지 ‘회의’”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3일 런던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마련한 ‘리셉션’에만 참석하고, 공식 만찬(디너) 일정도 없다. 4일엔 3시간가량의 실무회의만 예정돼 있다. 최근 비전 부재와 회원국 사이의 불화에 처해 있는 나토 현주소가 이번 70주년 회의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나토 쪽은 이번 회의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등 공식적인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0년 전에 나토는 “소련을 막고, 미국을 개입시키고, 독일을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졌다.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초대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를 이렇게 가장 정확하고 명쾌하게 규정했다. 1949년 창설된 나토는 동유럽 국가들을 위성국가화한 소련의 팽창 위협 앞에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만든 집단 안보기구로, 독일을 나토 틀 안에 묶어둬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장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소련은 붕괴했고, 미국은 발을 빼려 하고, 억눌렸던 독일은 다시 통일됐다. 나토의 탄생 이유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존재 이유가 증발한 나토 내부에서 각종 이견과 불화가 빚어지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나토 창설 주도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불화의 맨 앞자리에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그는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에서 더 나아가 나토의 존재 이유까지 회의를 표명했다. 발트 삼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 러시아에 침공당하면 미국과 나토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나토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독일 등 서유럽 회원국들에는 “무임승차한다”며 비난했다. 급기야 트럼프는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을 놓고 유럽 회원국 정상들에게 거친 언사를 퍼붓다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공동성명 발표 현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유럽 쪽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미국의 나토 방위비 분담액(연간 25억달러)을 2021년부터 삭감하는 조처에 동의했다. 미국과 독일이 나토 방위비의 16%를 똑같이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29개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나토 방위비로 분담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 표시로 나토 방위비 분담액을 조금도 늘리지 않고 있다.
돈 문제만이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7일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나토의 ‘뇌사’ 상태”라고 말해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 사이에 어떠한 전략적 결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에서 또다른 나토 동맹국 터키가 우리와 조율하지 않은 채 침략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의 동맹인 시리아 쿠르드족과 관련해 터키의 군사행동을 용인한 것을 비판한 셈이다.
그러나 메르켈 독일 총리가 즉각 “나는 (마크롱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반박하면서 나토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급속 냉각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조각들은 주워 모으는 데 지쳤다. 당신이 반복해 깨뜨린 컵을 내가 붙여 같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격”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수습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를 ‘전략적 뇌사 상태’라고 비난한 근본 배경은 나토의 첫 존립 이유였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찾아온 나토의 정체성 혼란 때문이다. 뇌사 상태가 이미 꽤 오래된 일인 셈이다. ‘뇌사 발언’의 한 계기인 터키의 시리아 영토 진군 역시 소련 붕괴 뒤의 러시아-나토 관계에서 촉발됐다. 나토는 소련 붕괴 뒤에 오히려 확장돼, 애초 9개국이던 회원국이 29개국으로 늘었다. 옛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국가뿐 아니라 소련 내 공화국인 발트 삼국도 받아들였다.
이런 확장은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미국 등 서방이 소련에 약속했던 ‘동쪽으로의 나토 확장(동진) 불가’를 어긴 것이다. 나토 확장이 러시아의 공격적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러시아는 나토 동진에 반발하면서 나토의 중요 회원국인 터키와 밀월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공망을 도입한 것은 나토 군사동맹 체제에 큰 구멍이 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으로 간주하는 외부로부터의 무기 구매는, 동맹의 가장 기본 원칙인 신뢰의 위기를 나토에 던지고 있는 셈이다.
나토는 1990년대 초 보스니아 분쟁 등에 개입하면서 존재 필요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등에 개입하면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도국의 이익이 걸린 전쟁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토 위기는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은 이미 아시아 귀환 정책을 표방했고, 이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어도 미국으로선 유럽과 나토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