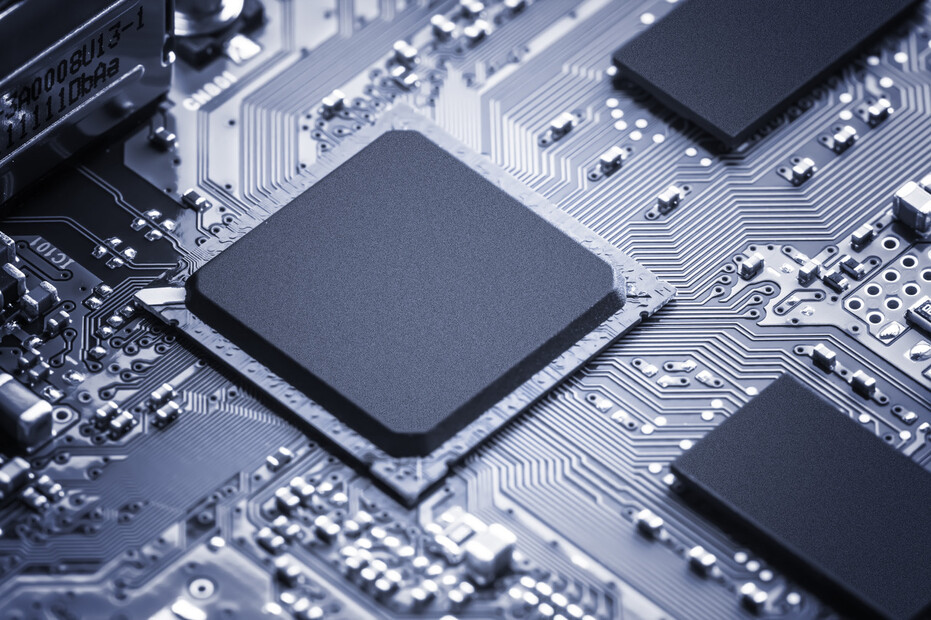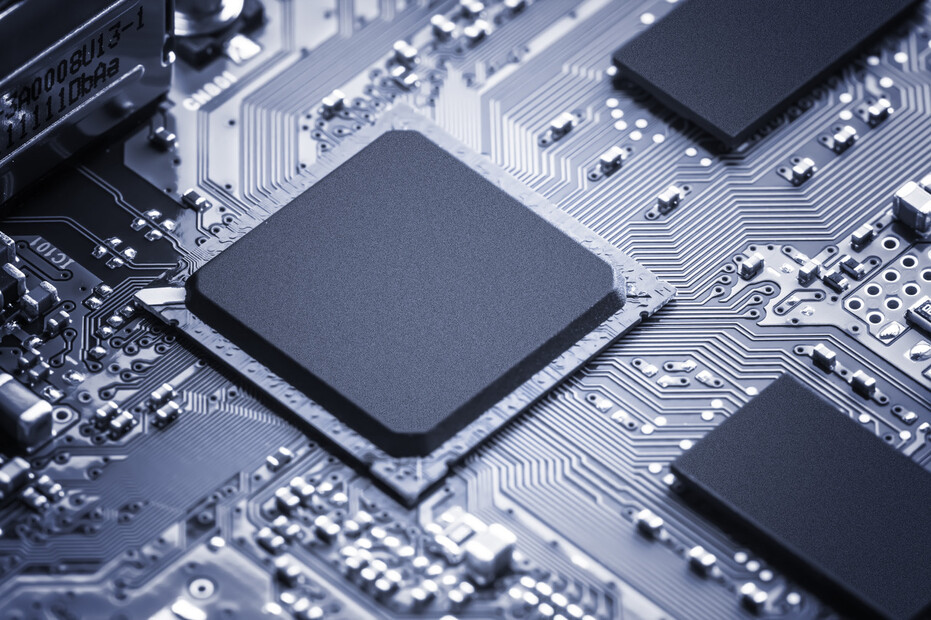최근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극자외선(EUV) 공정에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더 작고 효율적인 반도체 (생산에는) 더 많은 전기가 요구되고 있어 아시아는 화석연료를 끊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극자외선 공정은 웨이퍼(원형판)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 넣는 포토공정에서 극자외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기술보다 회로를 세밀하게 그려 넣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주로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디(D)램 분야에도 활발히 쓰인다. 극자외선 공정의 핵심 장비는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극자외선 공정에 많은 전기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각 장비가 이전 세대 장비보다 약 10배 많은 전기를 소비한다”며 “더 발전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다른 대안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흐름에 중요하고 잠재적인 걸림돌”이라고 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티에스엠시(TSMC)가 있는 대만에선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티에스엠시는 2020년에 대만의 전체 전력 소비량의 6%를 썼고, 2025년에 이 비중은 12.5%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타오위안시 국립중앙대학교의 량치위안 석좌교수는 “반도체 회사들이 새 발전소를 짓기 시작하지 않는 이상,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역시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하는 제품 양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극자외선 공정 장비 공급을 위해 6월 에이에스엠엘을 직접 찾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의 본거지인 한국도 (티에스엠시가 있는 대만과) 비슷한 과제를 마주했다”고 했다.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극자외선 공정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만과 한국 모두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석탄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만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6%, 7.5%에 그쳤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각자의 지역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연달아 내놨다. <블룸버그>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정부도 자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구축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서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친환경을 적용하기 위해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글로벌 반도체 연구소 아이멕(IMEC)의 라르스-에이크 라그나손은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시간과 비용도 필요하다”며 “산업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