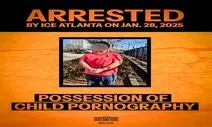중국이 메콩강(중국명 란창강) 자국 구간의 푸얼 지역에 건설한 눠자두 수력발전소. 바이두 갈무리
중국이 히말라야산맥과 티베트고원의 수자원을 무기로 삼아 물이 흘러가는 하류 지역의 인도 및 동남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중국의 댐 숫자는 40개였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8만7000개에 이르러 미국, 브라질,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가 26일 보도했다. 특히 인도차이나반도로 뻗어내려가는 메콩강(중국명 란창강) 상류에 중국은 7개의 댐을 지었으며, 추가로 21개를 건설중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의 전체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을 지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주변국들은 중국의 댐이 유사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밀랍 찬드라 샤르마 인도 네루대 교수는 “티베트의 댐이 인도에 환경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외에도, 지진이나 각종 사고에 의해, 또는 중-인 전쟁 발발 시 고의적인 붕괴로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인도 북부의 중국과 국경을 맞댄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서는 티베트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발생해 30명 사망, 100명 실종을 비롯해 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천만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중국 쪽은 두달여 전 산사태로 형성된 제방이 예상치 못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인도 쪽은 고의성을 의심했다. 역사를 봐도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장제스가 일본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황하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수십만명이 숨지고 4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농지를 황폐화시켜 1942년 300만명이 굶어죽은 허난성 대기근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댐 과열’은 주변국의 가뭄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베트남은 중국에 윈난성 지역 댐 방류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메콩강 삼각주의 인구 60만명이 식수 부족을 겪고 있었고, 논 14만㏊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앞서 2014년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인 석유 시추와 그에 따른 베트남 내 반중 시위 탓에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다시 얼굴을 맞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국은 댐 방류를 결정하면서 “하류 지역의 해갈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중국-인도 국경 갈등 탓에 인도에서는 중국의 ‘물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선 “근거가 없다. 상상 속 전쟁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 영향으로 하류 국가들의 물 수요가 높아져 수자원을 둘러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타이 메콩강 지역의 활동가 타나삭 포스리쿤은 “중국은 외교 분야에서 수자원을 바기닝 칩(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