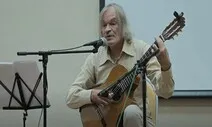중국 대외경제무역대 쉬융빈(56·사진) 외국어학원장은 학교 역사상 한국어학과 교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원장(학장)이 됐다. 하지만 올해 신입생 가운데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 현실은 그를 무거운 고민에 빠뜨렸다. 지난 14일 쉬 원장을 만나 수교 25년을 맞는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에 대해 물었다.
-1992년 수교 이전 한국은 중국에 어떤 이미지였나?
“별다른 인식이 없었다.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은 중국엔 미국과 싸운 전쟁이었다. 1983년 중국 민항기가 한국에 불시착한 사건이 있었지만, 내가 그때 중국국제라디오(CRI)에서 일하면서도 알지 못했을 정도로 가려져 있었다.”
-한-중 수교는 중국에 어떤 의미였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1992년 초 남순강화가 종합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수교했다. 이념 중심에서 실용·국익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외교 사건이었다.”
-25년 동안 한-중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 일은?
“우선 1997~1998년 외환위기 때 중국이 한국에 도움이 됐다. 한국은 중국의 추가적 위안 평가절하를 우려했지만, 중국은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역사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한류도 중요한 몫을 했다. 중국은 과거 일본·홍콩 드라마에 열광한 적이 있었기에, 지나가는 유행으로 본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한류는 20년에 걸쳐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식품 등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한국에 대한 중국 젊은 세대의 인식은?
“누리꾼들이 벌이는 거친 설전도 존재하지만, 그것만 볼 것은 아니다. 한국에 유학 간 중국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한국을 직접 보고 평가하겠다는 학생들이 많다. 공정하고 객관적 시각을 가진 그들이 앞으로 인터넷 여론도 이끌어갈 것이다. 한국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한국어 전공자 추이는?
“올해는 충격적이게도 학부 한국어 전공 신입생 정원 20명에 지원자가 0명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절반가량이 1지망이었는데, 올해는 모두 2지망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우리 학교는 한국어 전공자가 외교부·상무부에 진출한 경우가 많아서 장래는 유망한 편이다.”
-중국을 보는 한국의 시각에 대한 느낌은?
“극단적이다. 한쪽은 중국 없이 못 산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중국과 대화할 수 없다고 한다. 좀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국을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바람직한 것들은 인정하고, 잘못된 문제는 지적하는 관계가 돼야 한국도 중국에서 존경받을 수 있다.”
베이징/글·사진 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한-중 수교 25돌]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눈물 [한-중 수교 25돌]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눈물](https://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820/00501935_20170820.JPG)
![[단독] 린샤오쥔 ‘금’ 위해…중국 팀 동료 ‘밀어주기’ 반칙 정황 [단독] 린샤오쥔 ‘금’ 위해…중국 팀 동료 ‘밀어주기’ 반칙 정황](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8/5117390042623166.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