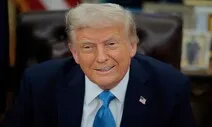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 타임스>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에 이어 백악관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균열을 부르는 보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평화협정까지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대한 옵션(선택지)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으로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주한미군 감축 여부가 북-미 회담의 협상 카드가 될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방안 마련 지시가 1차적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이 수십년간 북한의 핵 위협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자국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평택/사진공동취재단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시는 주한미군 비용 분담을 둘러싼 한국과의 최근 팽팽한 협상(시점)과 일치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 비용을 실질적으로 한국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의 절반가량을 분담하고 있으며,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새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쪽은 지난달 협상에서는 한반도에 전개한 전략무기 비용을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뉴욕 타임스>에 한반도 평화협정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뉴욕 타임스> 보도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뒤 이같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통령은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짜라는 요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북-미 담판을 앞두고 이번 보도가 한-미의 균열로 비칠까봐 논란을 차단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당장 감축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규모는 한국의 사정보다는 세계정세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맞물려 감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 미국은 1970년대 초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의 손에’를 주창한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 2만여명을 철수한 이후 70년대 말 카터 행정부의 3천여명 감축, 90년대 초 7천여명 감축 등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줄여왔다. 모두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식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다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쓴 <칼날 위의 평화>를 보면, 2003년 6월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청와대를 방문해 담당 보좌관에게 ‘2006년까지 주한미군 3만7500명 중 1만25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롤리스 부차관보의 통보는 한 달 넘게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뒤늦게 공식 입장으로 확인돼 혼선을 빚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김미나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yyi@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속보] 미 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에 경비행기 추락 [속보] 미 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에 경비행기 추락](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1/20250201500224.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