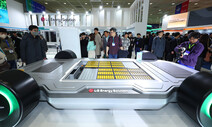[연속 정책토론] 진보와 미래 - 물가대란
물가와 환율은 상극관계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면 수입가격이 높아져 물가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0.8%포인트 오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뒤 최근까지 줄기차게 고환율 기조를 유지해왔다. 2008년 초까지 9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그해 3월 1000원을 뚫고 올라갔고,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500원을 넘어섰다. 2009년 초까지 급등세를 보이던 환율은 3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속도는 아주 느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를 넘고, 경상수지가 300억 달러에 육박했지만, 환율은 11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하락세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기조와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2007년 연 평균 929.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008년에는 1102.59원, 2009년에는 1276.40원, 2010년에는 1156.26원, 2011년(4월11일까지) 1117.22원으로 올라갔다. 각각 2007년에 비해 18.6%, 37.3%, 24.4%, 20.2%가 더 오른 셈인데, 환율 요인만으로 1.5%~3%포인트 정도 물가상승 압력이 생긴 셈이다. 2008년 첫번째 ‘물가대란’에 이어 올해 다시 물가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결국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용인했다. 1000원대 환율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2년6개월만이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