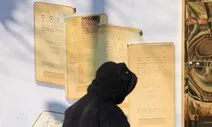국토부, 입지평가때 경제성에 무게 두기로
3개분야중 가중치 40%로 가장 높게
“기준이하땐 둘다 탈락”…해당지역 술렁
3개분야중 가중치 40%로 가장 높게
“기준이하땐 둘다 탈락”…해당지역 술렁
국토부,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기준 공개
국토해양부가 오는 30일 발표 예정인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제성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일부에서는 경제성을 빌미로 신공항을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입지평가위원회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입지를 평가할 때 경제성과 공항 운영, 사회·환경 등 3개 평가분야에 10개 평가항목, 19개 세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분야 중 경제성에 40%, 공항 운영과 사회·환경 부문에 각 30%의 가중치를 뒀다.
경제성 부문의 평가항목은 비용, 수요, 편익, 건설계획 등 4가지로 나뉜다. 공항 운영 부문은 장애물, 공역, 기상 등 3개 항목으로, 사회·환경 분야는 접근성, 토지 이용, 환경 3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국토부 이용규 공항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자신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제시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제기준과 인천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당시의 평가기준 등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검토해 평가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평가분야 내의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종평가 당일 평가단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와 동시에 입지평가위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이 예정지로 선정되지만, 두 곳 모두 5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을 경우엔 모두 탈락해 신공항이 무산될 수도 있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평가결과는 19개 세부 항목별 점수의 총합산으로 나오며, 점수가 우세한 지역이 공항 부지로 선정되는 것”이라며 “다만 공항건설 타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점수를 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지 모두 평가 절대치를 넘어서지 못하면 둘 다 탈락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과 대구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기 힘든 한나라당 일각에서 미봉책으로 김해공항 확장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자 해당 지역은 강력히 반발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성에 가중치를 높게 둔 것은 신공항 필요성을 낮게 평가해 신공항 무산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수요와 편익, 건설계획 등 경제성에서 앞선다”고 주장했다.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중간발표에서는 소음·환경 측면에서는 가덕도 입지가, 수요 측면에서는 밀양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경제성의 기준이 되는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은 밀양이 0.73, 가덕도가 0.70으로 두 곳 모두 기준이 되는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영률 기자, 부산·대구/이수윤 구대선 기자 ylpak@hani.co.kr
해당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과 대구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기 힘든 한나라당 일각에서 미봉책으로 김해공항 확장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자 해당 지역은 강력히 반발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성에 가중치를 높게 둔 것은 신공항 필요성을 낮게 평가해 신공항 무산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수요와 편익, 건설계획 등 경제성에서 앞선다”고 주장했다.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중간발표에서는 소음·환경 측면에서는 가덕도 입지가, 수요 측면에서는 밀양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경제성의 기준이 되는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은 밀양이 0.73, 가덕도가 0.70으로 두 곳 모두 기준이 되는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영률 기자, 부산·대구/이수윤 구대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