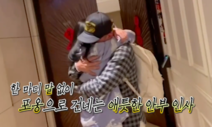먼하늘가까운바다 <39>
나는 준고를 택했다 그런데 이제 그 준고가 없다 있다해도 너무 멀리 있다 공지영 호숫가의 밤바람은 아주 찼다. 나는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고가 돌아오지 않았던 수많은 저녁을 나는 혼자 그의 방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그를 기다리기 위해 공원으로 나가 서성였다. 그런 밤이면 공원에는 모두가 둘씩이었다. 모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여기 서서 오지 않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날은 아자, 하고 혼자서 구호를 외치고는 호숫가를 뛰기도 했다. 한번은 호숫가를 뛰고 있는데 한 남자가 아는 척을 해 왔다. 가끔 이 공원에서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처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그냥 지나치려는데, 이봐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침을 꿀꺽 삼키고 그냥 뛰어가려고 하자, 다시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늘 혼자 뛰던데…. 외로우면 술 한잔 같이 할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만류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팔을 힘껏 휘저으며 뛰었다. 실은 그들이 쫓아와 내게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일본인들이 별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다. 준고가 옆에 있었으면 했던 것이다. 여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가난한 나에겐 핸드폰도 없는데…. 그가 없는 밤들이 나는 너무나 무서웠다. 그렇게 몇 바퀴를 뛰고 그가 세 들어 사는 집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보고 싶었고, 아빠가 보고 싶었고, 할아버지랑 록이가 보고 싶었고, 지희도 보고 싶었다. 그들은 한국에 있었다. 그 한국에서 지희와 록이의 편지가 왔었다. -홍, 그래도 우린 아직 어리고, 또…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문화적 폐해를 연구하는 할아버지를 둔 네가,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일본사람이랑… 네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나는 분명 한국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일본에 있는 준고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준고를 택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준고가 없다. 있다 해도 너무 멀리 있다. 그를 가까운 곳에 두고 매일 보고 싶어서 엄마랑 아빠를 떠나 이곳으로 왔는데, 이제 그마저 멀어지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필사의 힘을 다해 뛰어도 그는 날마다 내게서 조금씩 멀어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홍이니?” 고개를 돌리니, 아버지가 파카를 걸친 차림으로 서 있었다. 네, 하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추운데 뭐 하니?” “그냥 하늘 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우리 부녀는 잠시 호숫가에 서 있었다. “차 여기 두고 아빠랑 오늘 소주 한잔 할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뭐랄까, 오래 생각하고 말을 꺼내는 자 특유의 엄숙함 같은 것들이 배어 있었다. “그러지 뭐.” 나는 아버지와 나란히 호숫가를 걸었다. 나는 걷다가 아버지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남자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떠올랐다. 교토에 있는 시즈코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지고 있었다.
칸나가 억지로 끼어든다
엎치락뒤치락 우리 둘 사이에
크림색 장미가 피어있다 쓰지 히토나리 나는 로비를 뛰어다니며 홍이를 찾았다. 로비 어디에서도 홍이를 찾을 수가 없어 이번에는 주차장으로 나가 그녀의 파란 줄리엣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역시 홍이는 없었다. 로비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보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넋을 놓고 서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놀라 뒤를 돌아보니 호텔 여직원이 크림색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 “조금 전에 어떤 여자분께서 사사에 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크림색 장미 꽃다발을 받아든다. 꽃다발에 꽂힌 카드에는 일본어로 생일 축하해요. 홍이가, 라고 적혀 있었다. 홍이는 왜 날 찾아온 걸까. 그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면 그의 곁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홍이는 고바야시 칸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불과 몇 분 부딪쳤을 뿐인데. 그만큼 홍이에게 칸나는 마음에 걸리는 존재였단 말인가. 홍이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칸나를 보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다. 홍이는 내게 무슨 말을 하러 왔던 걸까. 칸나와 이야기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 나는 로비를 그대로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울적한 마음으로 긴 복도를 걷는다. 열쇠를 꺼내려다 옆에 그림자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간의 기대는 다음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 “준고.” 어둠 속에서 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슴푸레한 탓에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가 젖어 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피로를 어디다 호소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금니를 악물었다. “준고, 오늘 밤만이라도 좋아. 함께 있게 해줘.” “아니, 난 너무 지쳤어. 그리고 혼자 생각 좀 하고 싶다.” 열쇠를 꺼내 꽂았다. 칸나를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칸나가 억지로 끼어든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우리 둘 사이에 크림색 장미가 피어 있다. 장미 향기를 맡으며 아무 말도 않고 줄다리기를 한다. 칸나의 눈이 충혈되어 있다.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뭔가 각오를 한 눈이다. 그녀의 셔츠가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에, 나는 무심코 손을 떼고 말았다. 순간 칸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칸나, 부탁이다. 혼자 있게 해 줘.” 나는 장미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싫어. 내가 지금 방을 나간다면 나는 당신을 완전히 잃고 말 거야.” 나는 문을 활짝 열고 부드럽게 말한다. “자, 어서.” 칸나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싫단 말을 되풀이한다. “단 한번의 잘못을 그렇게 계속 나무라지 마. 난 이미 몇 년 동안이나 너만 바라보고 있잖아.” “그래, 고마워.” 나는 할 수 있는 한 상냥하게 말하고는,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할 수가 없어.” 하고 단호히 말했다. 칸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남보다 몇 배는 자존심이 강한 여자가 겹겹의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울고 있다. 오열을 참으며 흐느껴 우는 칸나를 지켜보기가 괴롭다. 그날, 칸나는 나를 위해 야참을 보내 주었다. <한국의 친구 일본의 친구>의 출판이 결정돼 마지막 수정에 쫓기던 때였다. 우리는 예전에 홍이와 내가 매일 함께 식사를 하던 2인용 식탁에 앉아 생선초밥을 먹었다. “이 소설, 분명히 팔릴 거야.” 칸나가 단언했다. 그럴까, 하고 나는 성의 없이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지?” “그건 편집자의 감이야.” 칸나는 아직 신출내기 편집자였다. 감이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10년, 20년이나 편집 일을 해 온 사람처럼 분명히 잘라 말했다. 칸나는 고개를 돌려 한참동안 내 책상을 바라보더니, 저기서 이걸 쓴 거야, 하고 물었다. -당신한테 이런 재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그렇지만 그걸 발견한 순간에 내가 관여할 수 있어서 기뻐. 우리가 예전에 연인이었다는 것뿐 아니라, 지금부터 함께 미래의 파트너로서 재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칸나는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난 널 유명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하고 선언했다. 그리고 칸나는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다. 야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참고가 될 책들을 보내 주었으며, 때로는 편집의논 차. 홍이와 헤어진 지 4년이 지났었다. 분명 그 무렵, 나는 칸나에게서 고독을 치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에는 칸나의 상냥함 속에서 우정 이상의 것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런 마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나는 칸나와 일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그림 이보름 번역 김훈아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