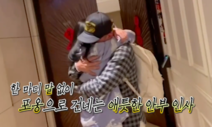먼하늘가까운바다 <38>
준고, 나랑 함께였을 때보다는 행복하지 마 공지영 나쁜 자식! 나는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걸어갔다. 겨우, 칸나야! 나는 핸드백 속에서 열쇠를 찾았다.
그래서 떠나는 날 나를 붙잡지 않았던 거니? 주차장의 불빛은 희미해서 열쇠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왜 하필이면 그 재수 없이 낭창낭창하고, 쬐끄만 그 여자냐구! 내 거친 손길에 핸드백이 뒤집히며 떨어졌다. 오해를 풀고 싶다니… 무슨 오해! 나는 무릎을 꿇은 채로 의미한 불빛 아래를 더듬거리며 수첩이랑 지갑이랑 손수건을 백 속에 담았다. 분당까지는 왜 찾아온 거야! 열쇠는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결국 칸나를 잊지 못해 나를 그렇게 보낸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니? 나는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켰다. 실은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차는 출발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 차들은 여전히 밀려 있었다.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다고! 앞차의 불빛들은 무채색의 겨울 거리에 꽃처럼 붉게 반짝였다. 그때는 못했는데 이젠 말할 수 있다구 말이야! 멀리 신호가 바뀌자 차들이 출발했다. 처음으로 사랑하게 해 줘서 고마웠다고! 나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너한테 그 말 한 번도 못하고 투정만 부려서 미안했다고! 나는 남산 쪽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웃으려고 했었어. 너한테 마지막으로 웃는 모습으로 남고 싶었다고! 준고가 한국에 온 그날처럼 나도 모르게 나는 남산 언저리로 차를 몰고 있었다. 지희랑 연습했던 대로 웃으며 안녕 하고 쿨하게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다고! 나는 어두운 남산 언덕길을 올라갔다. 그래도 칸나가 있어서 잘 됐잖아…. 내가 늘 차를 세우곤 하던 그 자리에 차를 세웠다. 안 그러면 말할 뻔했잖아. 시동을 끄자 갑자기 머릿속으로 검은 어둠이 꽉 차오르는 것 같았다. 칸나가 네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할 뻔했잖아…. 서울은 검은 벨벳 천 위에 놓인 보석의 바다처럼 남산 아래 둥글게 펼쳐져 있었다. …행복해야 해! 준고, 하고. 나는 두 손을 비비며 검은 강물 위에서 막대사탕처럼 수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먼 불빛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행복하지 마! 준고. 나랑 함께였을 때보다는 행복하지 마. 집 앞 호숫가에 차를 세우고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지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 지희야… 우리 아프리카로 갈까? ― 돈이 어딨니? … 우리 아버지 회사 그만두셨어. ― 사랑 때문에 울지 말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한 건 너였잖아? ―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사귀자고 해 본 거란 말이야. 흑흑. ― 남자한테 먼저 그러면 안 된다고 지희 네가 매일 말했잖아. 사랑 가지고 울고 짜고 하지 말라고도 했잖아. ― 홍, 우리 아프리카로 가자. 진짜 아프리카. ― 진짜 아프리카? 그게 어딘데? ― 우리 서른이 될 때까지 그걸 찾아보기로 하자. 그래도 지금은 울래. ㅠ.ㅠ 추신: 그렇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사랑에 집착해 울고 짜고 하는 건 확실히 좋은 일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나는 차에서 내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호수는 검은 빛이었다. 어둠 속으로 칸나의 희고 윤곽이 고운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 사랑했던 준고가 처음 사랑했던 여자가 칸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 후로는 출판사의 행사 때, 칸나 꽃이 들어간 화환은 절대 쓰지 않았다. 칸나와 비슷한 글라디올러스라는 꽃도 싫어하게 되었다. 이노가시라 공원 입구 꼬치구이 집에서 준고는 내게 처음으로 그녀 이야기를 했었다. ― 왜 헤어졌냐구? 내가 미덥지 못하대…. 준고는 쓸쓸하게 웃었다. 순간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실은 나도 모르게 한국말이 튀어나올 뻔했었다. ― 누가 우리 준고한테 그런 말을 해…. 그건 엄마가 늘 내게 하던 말이었다. 내가 놀림을 당하고 들어오거나 내가 슬프거나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던 고등학교 동창이 딴 여자랑 이미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엄마는 내게 말하곤 했었다. 누가 감히 우리 홍이한테 그런 말을 해…. 그때 나는 준고를 꼭 안고 말해주고 싶었었다. ― 누가 감히 우리 준고한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그가 알까. 우리, 라는 그 의미를?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는 말은… 이미 네 속에 내가 들어 있고 내 속에 네가 들어 있다는 뜻임을. 관계를 맺으면 나조차도 네가 되고자 했던 한국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것이 그를 향한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속수무책으로 그랬다는 것을.
미안하다, 칸나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뛰쳐나왔다 쓰지 히토나리 호텔로 돌아오니 로비에서 칸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후쿠오카에 가게 됐어. 좀 더 머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구도 선생님이 시내 관광하시는데 같이 따라가야 하나 봐.” 칸나가 아쉬운 듯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썩여 보인다. “힘들겠다. 마치 유치원 인솔교사 같은 걸.” 칸나가 쓴웃음을 짓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잔하고 싶어서. 피곤하겠지만 괜찮지?” 우리는 밴드연주가 이야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바의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벽을 등진 칸나 앞에 앉았다. “사인회는 정말 대단했어.” “바다를 건넌 이곳에 그렇게 많은 독자가 있었다니, 정말 기쁘다.” “정말 좋은 하루였지?” “그래,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뜻 깊은 하루였어. 그리고 이렇게 오늘 서울에서 삼십대를 맞이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신의 뜻일지도 모르지.”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칸나의 눈에 순간 푸른빛이 지나갔다. “삼십대? 맞다, 오늘 준고 생일이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나도 잊고 있었으니까, 하고 말했다. “미안해….” “그러지 마. 생일에 사과 받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보다 건배하자.” 웨이터가 가져온 칵테일로 우리는 건배를 한다. “도쿄에 돌아오면 제대로 축하자리 마련할게.” 칸나는 편집자답게 언제나 재빠르게 궤도를 수정한다. 원고지를 수정하듯 인생에 대해서도. 빨간 글자를 집어넣거나 지우개로 지워 바른말을 정확한 자리에 적용시켜 가는 것이다. 홍이가 내 생일을 기억해 준 것이 기뻤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7년을 보상받은 것 같았다. 홍이가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지는 그녀가 결정할 일이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7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 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매년 홍이가 이날 나를 생각해 준 것을 안 것만으로도. 내가 매년 9월의 13일, 홍이 생일에 먼 하늘을 바라보며 홍이를 그리워한 것처럼. 칸나가 이야기하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술안주로 우리는 금방 와인 한 병을 비웠다. 삼십 년을 되돌아보며 나는 조용히 취해가고 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쾌활하게 이야기를 하던 칸나가 갑자기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이야기를 멈췄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 “왜 그래?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입을 다물게. 또 무슨 이상한 생각이라도 난 거야?” 얼굴을 살피며 부드럽게 물어 보지만, 안색이 굳어 있다. 고개를 숙인 얼굴이 뭔가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것 같다. “칸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다. “왜 그래?” 겨우 얼굴을 든 칸나가 내 눈을 들여다본다. “준고, 나한테 거짓말 했었어?” 화가 난 눈으로 칸나가 묻는다. 조금 전까지의 밝은 미소는 사라지고 없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그런 눈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고바야시 칸나가 내 뒤를 꼼짝 않고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름이 뭐였지? 나 다음에 사귀었던 한국여자….” 나는 칸나의 시선을 더듬어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한쪽에서 연주하는 밴드가 보일 뿐이다. 나는 다시 칸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이 당신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네. 나는 잊고 있었는데….” 칸나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상상해 보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 맞아. 그 사람과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그래, 우연히. 그녀가 내일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어. 거기 사장님 딸이야.” 칸나는 눈을 감고 잠시 아무 말 없이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내 뒤를 바라보며 말했다. “좀 전에 그 사람이….” “뭐라고?” “당신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었어. 나를 노려보고는 가 버렸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칸나도 같이 일어났다. “가지 마.” 미안하다, 나는 칸나에게 한 마디를 남기고 뛰쳐나왔다. / 그림 이보름 번역 김훈아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