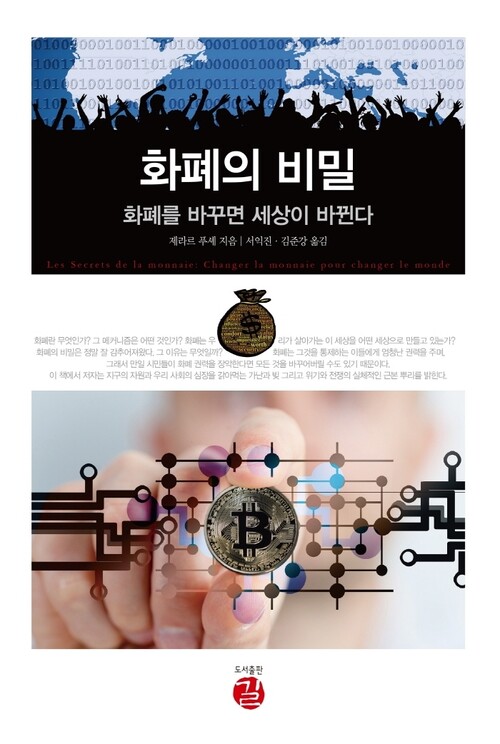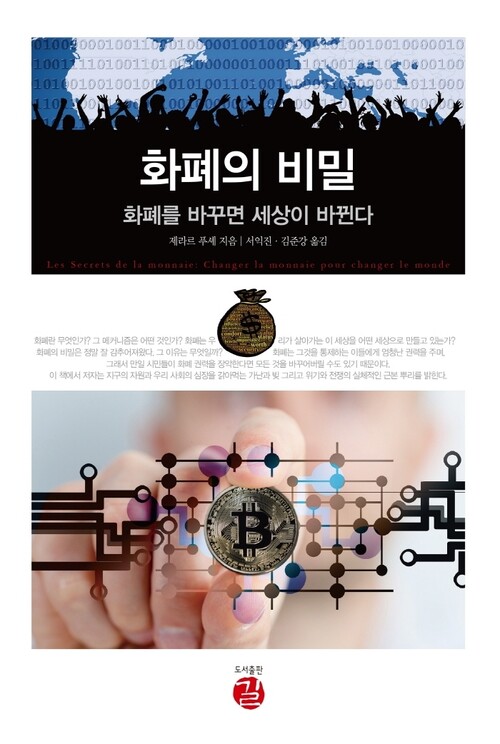화폐의 비밀: 화폐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제라르 푸셰 지음, 서익진·김준강 옮김/길·2만2000원
세계 주요 도시의 중심지엔 하나같이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즐비하다. 금융이 현대자본주의 시스템의 실질적인 지휘자라는 현실을 상징한다. 그런데 돈은 꼭 은행을 통해서만 움직여야 하는 걸까? 이 상식적인 질문에 선뜻 답을 찾기 힘들다. <화폐의 비밀>은 그 해답을 찾아 나선다. 화폐라는 교환 수단이 민간은행들에 의해 생산-배분되는 시스템을 구석구석 들여다본다.
저자는 실물경제의 눈으로 돈의 흐름을 본다. 전세계 금융 규모는 1970년대 국내총생산의 10% 수준에서 20여년 만에 100%를 훌쩍 넘어섰다. 금융이 경제 순환에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레버지리(부채)를 키운 때문이다. 금융 시스템이 가격 변동으로 차익을 얻는 행위(투기)에 몰입할 때 실물경제는 희생된다. 교환 수단이라는 화폐의 본래적 기능은 희석되고 그저 이익을 얻기 위한 판돈이 된다. 비정상적으로 커진 채무는 결국 가계와 기업에 돌아간다. 도대체 위기 때마다 풀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늘려 장부상 균형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이다. 금융은 정작 실물경제 주체들의 장부를 돌보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자는 경제학자도 교수도 아니다. 1990년대 <인터넷 경제>를 출간하며 선구적 문제의식을 드러낸 무림의 고수랄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화폐 생산과 배분 메커니즘 연구에 몰두했다. 책은 잘 짜여진 이론서가 아니다. 검을 휘두르는 자객의 문투다. 오늘날 돈을 찍어내고 유통하는 ‘화폐 권력’의 실체와 균열,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한다. 경제학 이론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정치-화폐 권력의 카르텔을 들춰내려 한다. 흥미진진한 사극을 보는 느낌이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