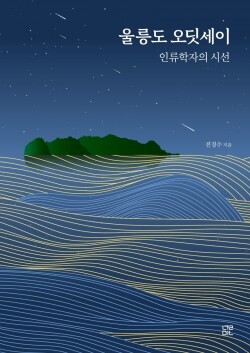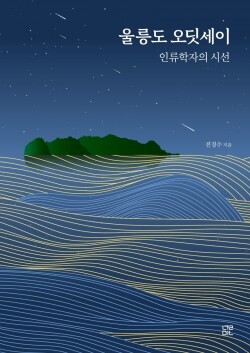울릉도 오딧세이: 인류학자의 시선
전경수 지음/눌민·2만6000원
<울릉도 오딧세이>는 울릉도의 ‘소외감’에 주목한 책이다. “텔레비전의 기상 보도가 ‘태풍은 동해로 빠져나가서 다행입니다’로 끝나면 울릉도 주민들은 아연실색하게 된다. 울릉도에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태풍 상황 끝’이라는 보도를 접하면 내팽개쳐진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지은이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2006년부터 15년 남짓 울릉도를 오가며 인류학·생태학·문헌학·해정학(Oceanpolitics) 등의 학문을 총동원해 울릉도의 숨은 역사·일상·가치를 발견한다.
지은이는 독도의 ‘들러리’가 되어버린 울릉도 위상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울릉도가 정치인들이 독도로 가기 위한 ‘길목’으로 전락해버린 현 상태로는 “영토 일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울릉도를 “영토 주권의 논리가 아니라, 문화 주권의 논리로 볼 것”을 주문한다. 문화는 ‘일상’과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에 지은이는 울릉도민의 일상, 즉 살림살이를 파고든다. 그러기 위해 유심히 살핀 것이 ‘해류’다. 울릉도 주변에는 구로시마해류가 흐르는데, 이 해류를 타면 남해에서 울릉도로 항해하기가 쉽다고 한다. 울릉도가 지리적으로는 경상도에 인접하지만 지명에는 전라남도 흥양(여수, 고흥반도, 거문도 등 도서) 지역 말꾸러미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이 영향 때문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지은이는 동시대 인류학자에게 “흥양어부의 기억을 소상히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 울릉도·독도에 대한 이들의 기억이 ‘문화 영토’의 국경을 공고하게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다. 이미 일본 오키노시마 주민들은 울릉도와 교류했던 일화, 기억, 생태 등을 차분히 기록하고 있다.
지은이는 문헌학, 언어학적 자료를 근거로 독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바다생물 ‘강치’의 명칭이 ‘가지’이고(강치와 가지는 언뜻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생물 종이다), 가지의 고향이 울릉도였으며, 근대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로 가지가 멸종됐다는 점을 밝혀낸다. 일본의 영토야욕 대상이 “독도 다음은 울릉도일 수 있다”는 저자의 경고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