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이권우의 인문산책
랭스로 되돌아가다
디디에 에리봉 지음, 이상길 옮김/문학과지성사(2021)
“당신 형 디디에는 가족을 버린 호모일 뿐이잖아.” 제수씨가 했다는 이 한마디만큼 에리봉의 정체성을 적확하게 표현한 말은 없다.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발명’해야만 했다. 전통적인 노동자 집안에서 벗어나 성공한 지식인이 되고 싶었다.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는 사르트르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의 후원은 한계가 있었다. 용을 써서 학계가 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박사논문 쓸 여력은 없었다. 그래서 학술저널리스트의 길을 걸었고, 명성을 떨쳤다. 가난과 노동과 폭력과 교양없음의 상징인 랭스에서 파리로 존재 이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인된 만큼 보존되어 있는” 자신의 계급성을 끝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런 면에서 에리봉은 부르디외 추종자였다.
청소년 시절부터 그가 모욕감을 느끼고 공포마저 느꼈던 욕설은 “호모 새끼들!”이었다. 그는 “항상적인 고발과 그것이 선고하는 저주에 영원히 굴복해야 하는 운명”에 맞섰다. 또다른 발명의 삶을 펼쳤으니, 도시로 떠난 전형적인 게이답게 새로운 관계망에서 발견한 게이의 특수문화나 하급문화를 통해 성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배워나갔다. 그가 왜 푸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지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푸코가 소수자의 낙인찍힌 삶을 “배제, 이방인 지위, 부정성, 강요된 침묵, 심지어 추락과 비극성이라는 어휘”로 표현하면서 “사회적 판결의 자의성, 그 부조리”를 예리하게 밝혀내지 않았는가.
에리봉의 두 갈래로 나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욕의 산물, 수치심의 아들”이 될 법하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소수자의 도덕>이나 <게이 문제에 관한 성찰> 같은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다룬 책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나, 정작 사회적, 계급적 모욕과 수치를 다룬 글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과제를 마치려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그는 랭스로 돌아가 가족사를 톺아보고 자신의 성장과정을 되돌아 보며 자서전 <랭스로 되돌아가다>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 책이 알튀세르의 자서전처럼 정신분석적이지 않고 푸코의 저술처럼 계보학적이지 않되, 부르디외의 업적처럼 지배 구조가 재생산되는 “구조의 평행이동”을 보여주는 빼어난 사회학적 자기(가족) 성찰의 자리에 오른 이유다.
이 자서전에는 우리가 뼈아프게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 그동안 좌파 정치세력은 “정치공간에서 피지배자들의 자리를 만들려는 의지를 역사의 지하감옥으로 보내버리려고 시도”했고, 새로운 정치철학은 “자율적인 주체를 예찬하고, 역사적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중시하는 사유”에 조종을 울렸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부르디외의 책제목을 빌려오면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세계의 비참’일 뿐이다. 그는 묻는다. 이 비참을 끝낼 새로운 이론을 어떻게 ‘발명’해야 하는가, 라고.
도서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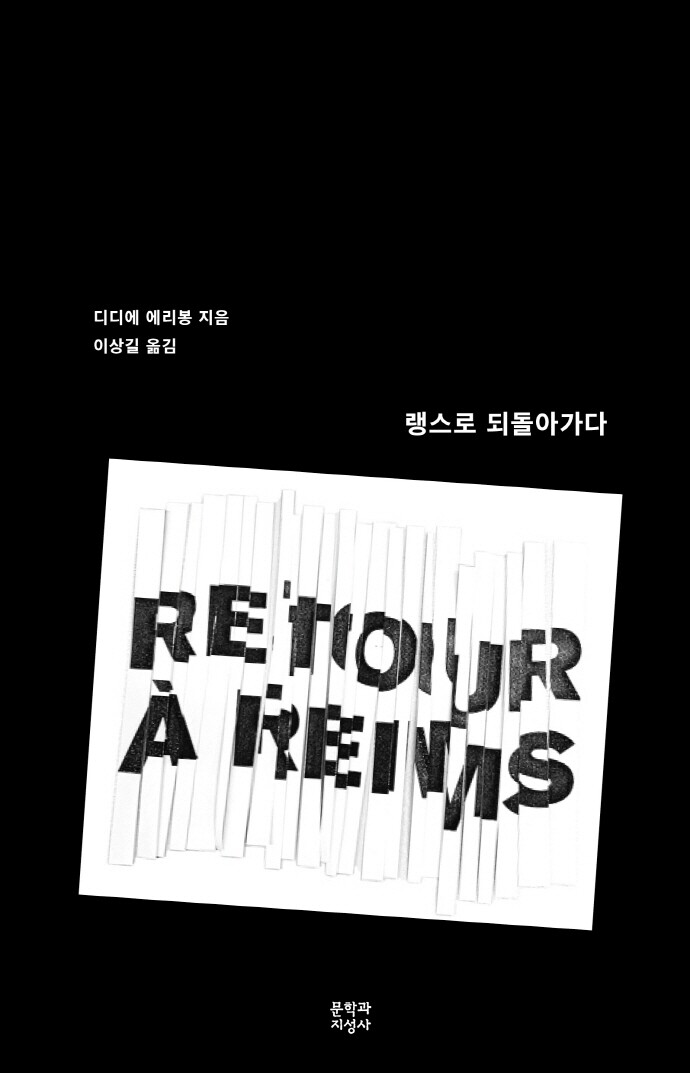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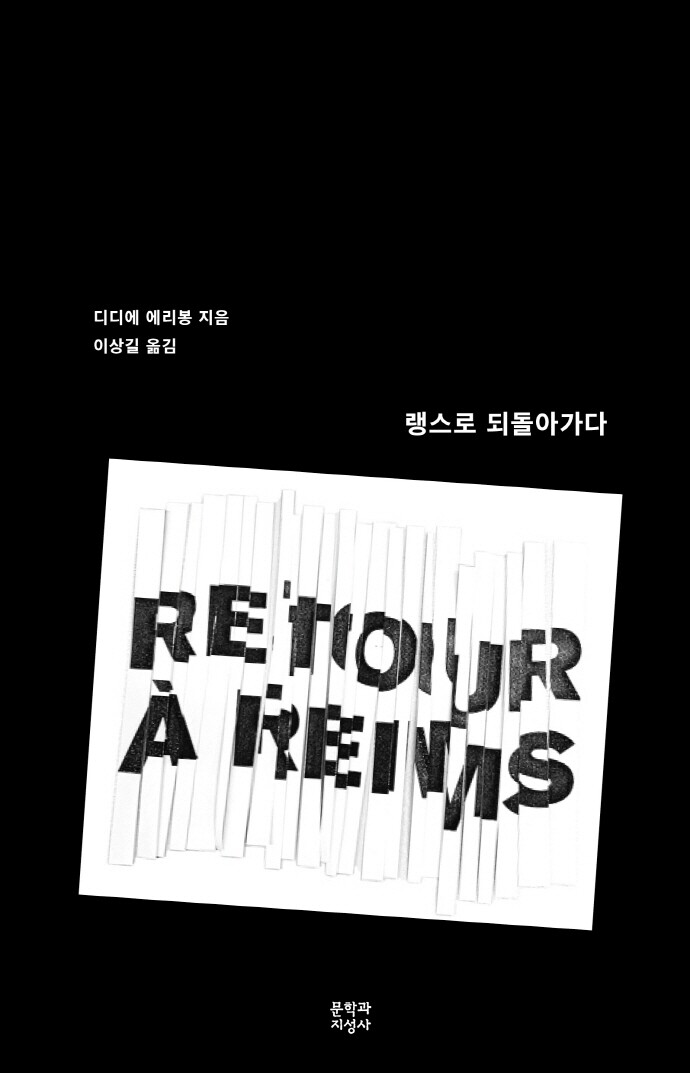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지도와 인포그래픽으로 톺아본 러시아의 현황 [책&생각] 지도와 인포그래픽으로 톺아본 러시아의 현황 [책&생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15/53_17025996588398_2023121050165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