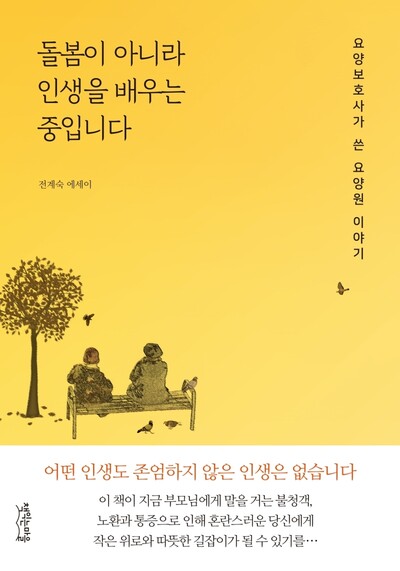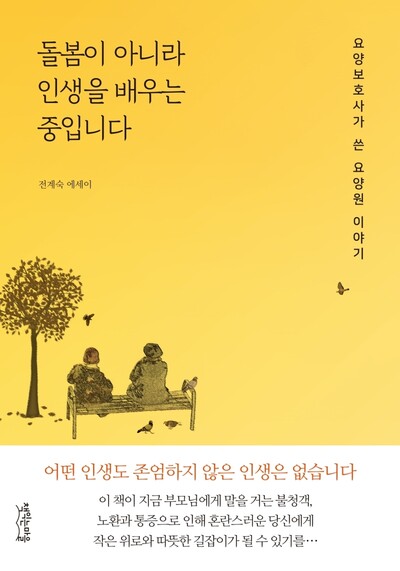돌봄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
전계숙 지음/책익는마을·1만5000원
고령화 사회,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요양보호사다. <돌봄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는 3년 차 요양보호사 전계숙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돌봄의 전장 속에서 겪고 성찰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인지증(치매)을 앓던 어머니를 3년간 돌보다 떠나보낸 지은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잘 모시지 못했다는 자책감” 탓인지 자꾸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끌린다. 과외 교사로 오래 일했기에 자격증 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자격증이 아니라 진짜 ‘자격’을 갖추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 그러나 실제 자격증 취득자의 3분의 1도 취업하지 않는다.”
돌봄의 전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딜레마적 질문이 날아든다. 어르신 개인의 존엄과 단체 생활의 규칙이 충돌하고, 돌봄 받는 이의 존엄이 돌보는 이의 인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치매 노인의 폭력을 참아내던 지은이도 “인지능력이 있는 어르신의 폭언”은 견디기 힘들어한다. “전 선생님은 내가 알기로는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도 다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천한 일을 하는 거요?” 공격 의지 없는 순진한 물음에,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가 건넨 “여기선 안락사 안 시켜주냐”고 적힌 쪽지에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렇게 3년을 일하면서 지은이는 돌봄에 관한 생각을 조금씩 정리해 나간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돌보고 있다.” 죽음과 질병은 누구에게나 언제고 찾아오기에, 지은이는 미래의 자신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요양원을 지킨다. 이 마음은 좋은 돌봄을 ‘받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를테면 “다 먹은 접시를 건넬 때 ‘잘 먹었어요’ 말 한마디, 기저귀를 갈 때 있는 힘껏 엉덩이를 들어주는 배려” 같은, ‘돌보는 이’를 힘나게 하는 사소한 행동들. 이를 위해 인지상정, 역지사지의 태도를 늘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인 출신 요양보호사의 담백하고도 깊은 문장이 귀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