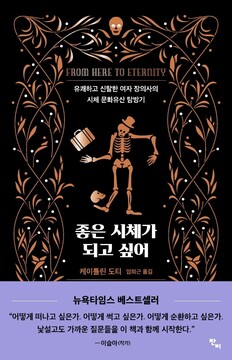
케이틀린 도티 지음, 임희근 옮김/반비·1만7500원 어울리지 않는 듯한 단어의 조합에 눈길이 머문다. 좋은 시체가 되고 싶다니.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보다 한층 이루기 어려운 바람이 아닐까. 20대에 화장터에 취직해 여성 장의사로 일한 경험을 담은 전작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에서 ‘좋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케이틀린 도티가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에선 ‘시체 문화유산 탐방기’를 써냈다. 지은이는 기업화·상업화한 장례문화에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며 다른 문화권에서 시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핀다. 가족·지인이 모인 자리에서 벌이는 콜로라도 크레스톤의 야외 화장, 미라화한 시신을 몇 년에 한 번씩 무덤에서 꺼내어 보살피는 인도네시아 토라자 사람들, 망자의 날 시끌벅적한 거리 축제를 벌여 “죽음을 넘나들고, 놀리고 어루만지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멕시코인들의 모습은 죽음의 ‘존엄성’을 달리 정의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질적이고 때론 경악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장례의식에 대해서도 지은이는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차근히 묘사해 독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탐방에 동참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시신을 퇴비화하는 프로젝트, 시신을 방부 처리하거나 관을 사용하지 않고 조슈아트리 사막에서 치르는 소박한 장례는 자연의 순환 속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 각지의 장례의식을 보며, 동경하는 방식이어도 자기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선 실현할 수 없음을 절감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겪어내는 사람들의 태도와 방식이 그 자체로 위안을 주기도 한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비감을 극복하고 유한한 삶을 받아들이는 데에 책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강경은 기자 free192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