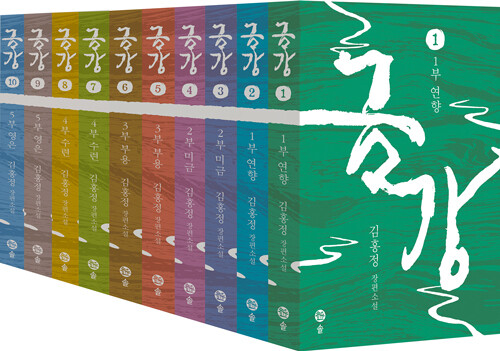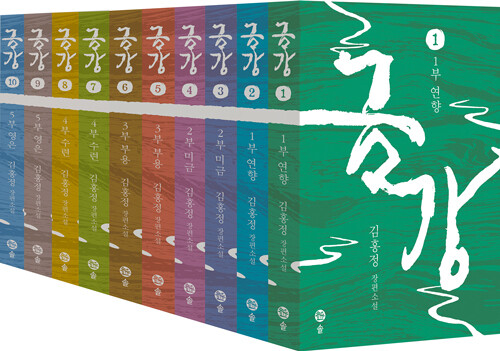“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던 2005~6년 무렵, 제가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주민들 대부분이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시위하러 많이들 다니셨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같이 서울 광화문 등으로도 시위하러 다녔는데, 그때 농민회 분한테서 이몽학의 난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596년에 일어난 민중 반역사건인 이몽학의 난 발상지가 공교롭게도 제가 근무하던 홍산농공업고등학교 앞 홍산이더군요.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의병이 중심이 된 백성들이 창과 칼을 거꾸로 임금을 향해 겨눈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에서 이 소설이 출발했습니다.”
대하소설 <금강>(전10권, 솔출판사)을 낸 소설가 김홍정(사진)은 이 소설의 바탕에 2014년의 세월호 사태가 촉발한 ‘이게 나라냐’ 하는 질문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금강> 완간 기자간담회에서 “이 소설은 지나간 16, 17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소설 등장인물들이 바라보는 사회와 나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각은 지금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공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삶은 머릿속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고 지금도 유효한 것이거든요.”
<금강>은 충청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모티브로 삼아 16~17세기 혼탁했던 조선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중종반정(1506) 이후 임진왜란(1592), 후금 건국(1616), 허균의 죽음(1618)까지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배경으로 깔리며 정암 조광조, 충암 김정, 임꺽정, 이몽학, 관송 이이첨, 교산 허균 등 역사 속 실존 인물들도 등장한다. 그러나 소설의 중심 인물들은 여성들이라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민중의 자생적 비밀결사체인 동계(同契)의 일원이자 소리채 한정의 대행수인 연향, 미금, 부용, 수련, 그리고 수련을 도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모성으로 돌보는 한편 천주교 기도서인 <게십이장>을 바탕으로 피폐한 일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는 영은이 각각 1~5부의 중심 인물이 되어 이야기를 끌어 간다.
“16세기까지 조선 여성은 상속권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을 심하게 겪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왜곡된 가부장적 질서를 강요하면서 여성들이 안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1506년 중종반정에서 1618년 허균의 죽음까지 100년여를 배경으로 삼은 이 소설을 읽으면 그 시기 동안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씩씩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은 충청 포구에서 생산된 소금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상업과 무역, 만주 후금의 팔기군에 소속된 조선 사람 부대 조선영의 존재 등을 고증을 통해 생생하게 그렸으며, 충청도는 물론 전라도와 함경도 등 지역 사투리 역시 실감나게 되살렸다. 특히 온갖 노래와 소리들이 소설의 주요 소재이자 그 자체로 소설의 주제가 된다는 점 역시 이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소리채 아현각과 한산의 한정 그리고 전주의 취선당에서 울려 나오는 온갖 시가들의 음송 소리·악장 소리·타령 소리, 제주 잠녀들의 소리, 왜장 앞에서 부르는 ‘부벽루’ 노랫소리, 소리꾼 채선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이승에서의 마지막 소리, 그리고 수륙재에서 희생된 의군들과 여러 사람들의 넋을 달래고자 영은이 부르는 소리 등은 “더없이 애잔하면서도 웅장한 ‘민중사적 진혼곡’ 형식으로 모두 모인다”고 문학평론가 임우기는 설명했다.
김홍정은 “앞으로는 제 고향 공주의 제민천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금강>의 문제의식을 현재에 되살리는 현대물을 써 보려 한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글·사진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