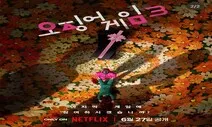서아귀 지음, 유라주 옮김/오월의봄·1만9000원 1992년 6월 일본 <산케이신문>에 ‘야간 중학교에 넘쳐나는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동오사카의 조에 중학교 야간 학생이 400명을 넘어 주간 학생 수를 역전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전쟁과 경제적 이유로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한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주간 학생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쳤다. 야간 학생들 때문에 주간 학생들이 서클 활동 등에 제약을 받는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이 명분을 한꺼풀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엔 ‘조선인 멸시’가 담겨 있었다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 당시 재일조선인은 지역사회에 조용히 흡수되어야지 절대로 눈에 띄면 안 되는 존재였다. 이 기사가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 일본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행정 당국은 기민하게 움직였고 곧이어 조에 중학교에서 1㎞ 떨어진 다이헤지 중학교에 분교가 설립됐다. 그러나 179명이 교실 세 곳에서 공부해야 하는 환경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서로 어깨가 닿았고 복도에도 책상이 놓였다. 재일조선인들은 외치기 시작했다. 더 공부하고 싶다고. 분교가 아닌 독립 야간 중학교를 세워달라고. 이들의 요구는 8년의 싸움 끝에서야 관철됐다. 흥미로운 건 이 투쟁의 주축이 ‘중·노년 여성’이라는 점이다. 고향에선 ‘계집은 배울 필요 없’대서 못 배우고, 일본에선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못 배워 한평생 서러웠던 할머니들. 식민지 출신, 여성, 노인이라는 정체성 탓에 중첩된 차별과 배제 속에서 침묵하고 살았던 할머니들이 학교를 통해 제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뭉클하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 ‘믿음’이 당신을 구원, 아니 파멸케 하리라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3/20250123504340.webp)
![[꽁트] 마지막 변신 [꽁트] 마지막 변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6/20250126502223.webp)
![“엄마가 꼭 지켜줘” 간청에 “다시 공립 될 때까지 버텨야죠” [.txt] “엄마가 꼭 지켜줘” 간청에 “다시 공립 될 때까지 버텨야죠”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3067.webp)
![‘인공초지능’ 목전, 지능의 진화 다시 보다 [.txt] ‘인공초지능’ 목전, 지능의 진화 다시 보다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131/53_17382760487275_2025012450304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