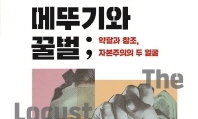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황태연·김종록 지음/김영사 펴냄(2015) 도발적인 책이다. 상식을 뒤집으려 한다. 서양의 근대를 주조한 계몽사상은 선교사를 통해 역수입된 중국의 공맹사상이 원조라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이론도 공자, 맹자, 사마천의 생각을 베끼다시피 한 것이다. 심지어 산업혁명의 리더도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고 한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자 황태연 교수의 다섯 권짜리 <공자와 세계>가 바탕이 된 이 책은 이런 도발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료들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하는 의문은 마지막장을 덮을 때까지 이어진다. 서양 근대에 동양사상이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 있다면 우리가 서양을 통해 배운 주요 경제사상이 2천년도 전에 중국의 현자들이 설파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자의 부민경제 사상에는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세계로 퍼져나간 자유시장 및 복지국가의 원리가 들어 있다. 공자는 국가의 제일책무로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양민’과 그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교민’을 들었다. 양민의 구체적 방도가 ‘무위이치’(無爲而治)와 ‘유위이치’(有爲而治)이다. 무위이치는 자유로운 생업을 보장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덕치를 말하는데, 경제에서는 정부의 간섭 없는 자유로운 농업, 상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공자는 하늘(자연질서)을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늘이 불완전하기에 유위이치가 필요하다. 시장에 관해 적용하면 자동조절되는 시장은 없기에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량형의 정비나 신의성실의 교역원칙 같은 물적, 사회적, 도덕적 인프라를 확립하는 일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비례적 평등(균제·均齊) 정책 △노인, 고아 등을 돌보는 복지정책이 포함된다. 맹자는 공자의 부민경제론을 발전시켜 양민론을 펼쳤는데 “항업(恒業)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없다”는 말로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풍족하게 하는 것을 군주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개인들이 이기심 충족을 위해 일을 하면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공공선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철학은 사마천의 자연지험(自然之驗) 사상과 흡사하다. 사마천은 공자의 무위이치를 계승해 “물건이 싸면 비싸질 징후고, 비싸면 싸질 징후라서 각기 제 업을 좋아하고 제 일을 즐거워한다. 이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아서 밤낮 쉴 새가 없고, 부르지 않아도 절로 오고, 구하지 않아도 백성이 만들어낸다”고 <사기열전>에서 밝힌다. 또 월나라 계연이 10년 만에 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든 사례를 들어 개인의 영리추구가 부국강병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밝힌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도 중국 고대 사상은 영감을 준다. 사회계약이나 이성을 강조하는 서양사상과 달리 공맹사상은 연민, 동정심, 측은지심 같은 천성적 공감을 도덕의 기초로 본다. 이는 사회적 공감능력의 중요성으로 확장되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인간의 사회성을 잘 살린 기업경영이나 자연파괴를 억제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책임을 이행하는 최근의 책임경영의 추세와 잘 조화가 된다.
일상화된 경제·환경위기는 서양 근대의 한계를 보여준다. 오래된 동향의 지혜가 어둠 속 샛별처럼 반짝인다.
이봉현 편집국 미디어전략 부국장 bhlee@hani.co.kr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도 중국 고대 사상은 영감을 준다. 사회계약이나 이성을 강조하는 서양사상과 달리 공맹사상은 연민, 동정심, 측은지심 같은 천성적 공감을 도덕의 기초로 본다. 이는 사회적 공감능력의 중요성으로 확장되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인간의 사회성을 잘 살린 기업경영이나 자연파괴를 억제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책임을 이행하는 최근의 책임경영의 추세와 잘 조화가 된다.
일상화된 경제·환경위기는 서양 근대의 한계를 보여준다. 오래된 동향의 지혜가 어둠 속 샛별처럼 반짝인다.
이봉현 편집국 미디어전략 부국장 bhlee@hani.co.kr
황태연·김종록 지음/김영사 펴냄(2015) 도발적인 책이다. 상식을 뒤집으려 한다. 서양의 근대를 주조한 계몽사상은 선교사를 통해 역수입된 중국의 공맹사상이 원조라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이론도 공자, 맹자, 사마천의 생각을 베끼다시피 한 것이다. 심지어 산업혁명의 리더도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고 한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자 황태연 교수의 다섯 권짜리 <공자와 세계>가 바탕이 된 이 책은 이런 도발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료들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하는 의문은 마지막장을 덮을 때까지 이어진다. 서양 근대에 동양사상이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 있다면 우리가 서양을 통해 배운 주요 경제사상이 2천년도 전에 중국의 현자들이 설파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자의 부민경제 사상에는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세계로 퍼져나간 자유시장 및 복지국가의 원리가 들어 있다. 공자는 국가의 제일책무로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양민’과 그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교민’을 들었다. 양민의 구체적 방도가 ‘무위이치’(無爲而治)와 ‘유위이치’(有爲而治)이다. 무위이치는 자유로운 생업을 보장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덕치를 말하는데, 경제에서는 정부의 간섭 없는 자유로운 농업, 상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공자는 하늘(자연질서)을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늘이 불완전하기에 유위이치가 필요하다. 시장에 관해 적용하면 자동조절되는 시장은 없기에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량형의 정비나 신의성실의 교역원칙 같은 물적, 사회적, 도덕적 인프라를 확립하는 일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비례적 평등(균제·均齊) 정책 △노인, 고아 등을 돌보는 복지정책이 포함된다. 맹자는 공자의 부민경제론을 발전시켜 양민론을 펼쳤는데 “항업(恒業)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없다”는 말로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풍족하게 하는 것을 군주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개인들이 이기심 충족을 위해 일을 하면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공공선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철학은 사마천의 자연지험(自然之驗) 사상과 흡사하다. 사마천은 공자의 무위이치를 계승해 “물건이 싸면 비싸질 징후고, 비싸면 싸질 징후라서 각기 제 업을 좋아하고 제 일을 즐거워한다. 이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아서 밤낮 쉴 새가 없고, 부르지 않아도 절로 오고, 구하지 않아도 백성이 만들어낸다”고 <사기열전>에서 밝힌다. 또 월나라 계연이 10년 만에 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든 사례를 들어 개인의 영리추구가 부국강병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밝힌다.
이봉현 편집국 미디어전략 부국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