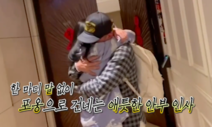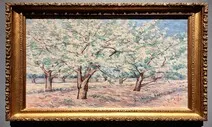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동춘 교수 ‘한국형 신자유주의’ 진단
2년. 길다면 긴 세월이었다. 한국 현대사에 드리운 국가폭력의 야만과 시장주의의 맹목를 누구보다 맹렬하게 비판해온 그였지만, 20~3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역진과 퇴행의 정치 현실 앞에서 한번 닫힌 그의 입은 좀체 열리지 않았다. 그 세월을 김동춘(성공회대 교수·사진)은 실천하는 사회학자가 아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김동춘으로 살았다. 섣부른 발언이 어렵게 마련된 과거사 규명작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정권과 보수세력에 괜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극히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 김동춘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계간 <황해문화>에 쓴 ‘한국형 신자유주의와 기업국가로의 변화’라는 특별기고문을 통해서다. 김 교수는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치형태를 ‘한국형 신자유주의’로 규정했다. ‘한국형’이란 한정어가 붙은 까닭은 신자유주의가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시스템을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그 형태와 유형은 각 나라가 걸어온 역사적 경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 김 교수는 이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문화적으로는 ‘봉건주의적’이면서 정치적으로는 ‘의사 파시즘’의 냄새마저 풍기는, “개발독재가 변형된 자유 없는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이것은 신자유주의를 ‘독재의 방식’, 다시 말해 ‘반(反)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탈규제’의 이름으로 대기업의 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 물가를 잡겠다며 생필품 가격을 규제하거나, 환율안정을 명목으로 대기업에 달러 판매를 압박하고, 백화점에 ‘건국 60주년 기념세일’ 따위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변종 신자유주의가 자리잡게 된 데는 애초부터 친자본·반노동적 성격이 두드러졌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가 취약했던 한국 경제의 체제 관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모든 영역이 자본의 효율성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신자유주의적 ‘기업사회’로 전환했지만, 그 형태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영미식 ‘소유자 사회’보다는 “중국식 일당독재 자본주의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진단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