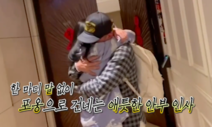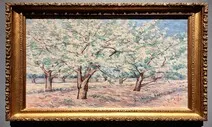〈한국의 초상화, 형(形)과 영(影)의 예술〉
‘한국의 초상화, 형과 영의 예술’ 쓴 조선미 교수
〈한국의 초상화,
형(形)과 영(影)의 예술〉
조선미 지음/돌베개·4만5000원 걸작 74점 형식·기법 등 심층 분석
40년 공력 담아 인물·시대 함께 소개 치솟은 눈썹과 맹수 같은 눈초리, 무성한 수염 사이로 굳게 다문 입술이 도드라진 화면 속 사내는 조선 후기의 무신 신응주(1747~1804)다.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은 대부분의 조선 초상화가 그렇듯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 便是他人)라는 극사실주의 재현 원칙에 충실하다. 하지만 이 초상의 탁월함이 묘사의 세밀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높은 벼슬을 지낸 유명 인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표정을 보세요. 무인의 충직함과 용맹스런 기운이 화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가적인 덕성과 근엄함만 강조되다 보니, 그려진 사람이 문관인지 무관인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범작(凡作)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조선미 성균관대 교수(예술학부)는 이 작품의 빼어남이 “인물의 마음과 정신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초상화의 생명인 ‘전신사조’(傳神寫照·형상을 통해 정신을 전달함)의 원리가 잘 구현돼 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가 펴낸 <한국의 초상화, 형(形)과 영(影)의 예술>에는 이처럼 ‘전신’의 경지에 이른 초상화 걸작 74점이 형식·기법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초상 속 인물의 삶과 시대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담겨 있다. 40년 가까이 키워온 연구자의 공력과 감식안으로 한국 초상화 세계의 ‘진액’을 농축해 놓은 셈이다.
조선미 성균관대 교수가 12일 성균관대 박물관이 소장한 신응주 초상 앞에서 작품의 형식과 표현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조선은 ‘초상화의 나라’였어요. 유교이념이 지배한 사회였으니 왕과 조상, 선현들을 기리기 위한 사당과 영당, 서원이 도처에 세워졌고, 그 안에 모실 초상화의 수요도 엄청났던 거지요. 왕을 그린 ‘어진’부터 왕이 공신에게 하사한 ‘공신상’, 양반 관료들을 그린 ‘사대부상’, 승려를 그린 ‘승상’까지, 전해오는 조선 초상화를 통틀면 1000점이 넘을 겁니다.” 풍경화나 풍속화 등 다른 회화 장르에 비해 많은 작품들이 전해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인들에게 초상화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조상이나 선현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란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들은 초상화를 신주와 함께 가장 먼저 챙겼다. “단순한 감상용 그림이었다면 그렇게 목숨 걸고 챙기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연구자 처지에선 바로 그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증보문헌비고>를 뒤져 소재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서 그림을 보자고 하면, 남의 조상님 얼굴은 왜 보려 하느냐며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조 교수가 처음부터 한국 초상화에 매료됐던 건 아니다. 외교학과의 홍일점이던 대학 시절, 삼선개헌 반대시위가 한창이었고, 학교는 툭하면 문을 닫아걸었다. 헛헛함을 달래준 것은 범한서적의 외국도서 진열대에서 찾아낸 서양 명화집이었다. 르네상스 회화에 끌려 대학원에서 서양미술사를 전공했다. 하지만 장구한 서양의 문화전통에 대한 지식 없이 깊이 있는 연구가 불가능함을 절감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조선 초상화였다. “채용신이 그린 황현의 초상화에 꽂혔죠. 사진을 모본 삼아 그린 것인데, 사진이 표현하지 못한 인물의 혼과 성정까지 화폭에 담아냈어요. 특히 동그란 안경 너머로 생각에 잠긴 듯한 두 눈과 비통함을 견뎌내는 입술은 보는 사람이 절로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황현의 초상화와 함께 김시습의 초상도 조 교수의 마음을 흔들어놓은 작품이다. 찌푸린 미간과 우수 띤 눈매가 번민에 찬 고고한 방외인의 내면세계를 오롯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교수는 한국의 초상화가 동시대 서양이나 중국·일본의 초상화에 비해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형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시선을 잡아끄는 시각적 호소력도 약하다는 얘긴데, 이는 제례를 위한 용도로 제작됐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선 초상화가들에게 요구됐던 ‘전신사조’에서의 ‘신’(정신)은 인물의 내면에 도사린 정념이나 심적 경향성이라기보다는 초상을 모시는 사람이 그 인물한테 기대하는 이상화된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담담하고 절제된 군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서양이나 일본 초상화와 같은 동적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초상화가 지닌 고유의 미학으로 존중받아야지요.”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