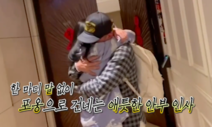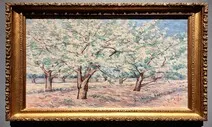이란 화가 아흐마드의 1815년 작 <여자곡예사>(왼쪽). 19세기 초 이란 미술가들은 100여년 뒤 유럽의 상징주의 미술가들이 채택하게 될 방식으로 유화에 접근했다. 조각 천처럼 색채블록을 이어붙여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채색 기법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1909년 작 <유디트2>에서도 나타난다. 예담 출판사 제공
‘서양’ 미술사 넘어 ‘세계’ 미술사 표방
이란·인도 등 아시아도 비중있게 다뤄
이란·인도 등 아시아도 비중있게 다뤄
〈세상을 비추는 거울, 미술〉
줄리언 벨 지음·신혜연 옮김/예담·5만5000원 1950년에 초판이 나온 에른스트 곰브리치(1909~2001)의 <서양미술사>는 32개 국어로 번역돼 600만부가 넘게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다. 원시인의 동굴벽화에서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 건축에 이르기까지, 회화·조각·건축의 역사를 개관한 이 책은 원제가 “Story of Art”, 그냥 ‘미술 이야기’다. 그러나 이슬람과 중국의 중세 미술을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다룰 뿐, 책의 절대 분량을 유럽 중심의 서구 미술에 할애한 까닭에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판에는 ‘서양미술사’라는 새 이름을 받아야 했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 미술>은 기존 서양미술사의 지역적·시대적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원대한 기획 아래 쓰인 책이다. 동서와 고금을 아우른 명실상부한 ‘세계미술사’를 표방한다. 책을 쓴 줄리언 벨은 런던미술학교 ‘시티 앤 길드’에서 미술사와 미술이론을 가르치는 화가 겸 비평가.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그의 이모할머니다. 글쓴이가 밝힌 이 책의 집필 원칙은 이렇다. “나는 미술사가 독립적인 미적 영역을 향해 열린 창이라기보다 세계의 역사를 우리에게 되비춰주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미술적 변화의 기록들은 아무리 방향이 뒤바뀌고 내용이 변해도 어떻게든 사회적·기술적·정치적·종교적 변화의 기록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돼 있다.” 미술만의 역사가 아닌, 미술과 역사의 교호와 소통을 구체적인 미술작품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책은 여느 미술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작가·작품이 등장했던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만, 그 연대기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6대륙을 넘나든다. “세계 미술의 다양성에 눈이 번적 뜨이는 느낌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미진진한 공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지만, 그 의도가 제대로 관철됐는지는 미지수다. 기술 대상의 전환이 작가들 사이의 영향 관계나 작품의 모티프를 매개로 이루어지기보다 별다른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 장면들이 영화의 ‘점프 컷’처럼 부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탓이다. 16~17세기 중국과 인도, 아메리카, 이탈리아의 미술이 하나의 절에서 다뤄지는 ‘7장 극적인 현실’ 부분이 대표적이다. 문징명의 1532년 작 <우산칠성회도>를 보여준 뒤 당시 중국 남종화의 화풍과 정조에 대해 이야기하던 글쓴이는 돌연 화제를 전환해 당시 향료·직물교역으로 부를 누리던 인도 남부의 종교 미술로 넘어간다. 마두라이 힌두교 사원의 조각과 인물상에 대해 기술하던 글쓴이는 다시 동시대 중국으로 시점을 이동해 명·청대 인물화와 초상화를 이야기하는 듯하더니, 별안간 동시대 일본에서 진행된 가톨릭 탄압과 그것을 제단화의 형식으로 형상화한 페루 미술로 화제를 전환한다. 이처럼 과격한 장면 전환은 책 전체에 걸쳐 꾸준히 반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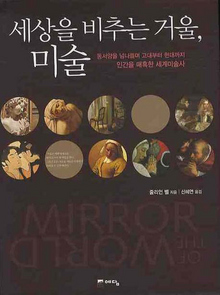 책의 미덕이라면 기존의 미술사 책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란·인도 등 아시아 미술을 비중 있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미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소개되는 도판의 수나 기술된 지면의 양은 중국 미술과 비슷할 정도다. 물론 한국의 미술작품도 등장한다.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자화상이다. 하지만 외국의 2차문헌을 인용한 듯, 설명이 표피적인데다 분량 또한 일곱 줄에 불과해 조선 후기 실학운동과 윤두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라면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20세기 후반의 현대미술을 기술한 부분에서 백남준과 이우환이 소개되지만, 각각 국제 예술가 그룹 ‘플럭서스’와 일본 ‘모노하’ 그룹의 일원으로 등장할 뿐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책의 미덕이라면 기존의 미술사 책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란·인도 등 아시아 미술을 비중 있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미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소개되는 도판의 수나 기술된 지면의 양은 중국 미술과 비슷할 정도다. 물론 한국의 미술작품도 등장한다.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자화상이다. 하지만 외국의 2차문헌을 인용한 듯, 설명이 표피적인데다 분량 또한 일곱 줄에 불과해 조선 후기 실학운동과 윤두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라면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20세기 후반의 현대미술을 기술한 부분에서 백남준과 이우환이 소개되지만, 각각 국제 예술가 그룹 ‘플럭서스’와 일본 ‘모노하’ 그룹의 일원으로 등장할 뿐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단순한 미술의 역사가 아니라 미술과 역사, 문화와 문화의 교호적 관계를 드러내려는 글쓴이의 고투는 책장 여기저기서 빛을 발한다. 19세기 초 이란의 유화와 20세기 초 유럽 상징주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색채 처리의 유사성(패치워크 기법)을 논하는 대목은 미술의 세계사를 빚어낸 침투와 저항, 융합의 메커니즘을 어렴풋이 가늠케 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줄리언 벨 지음·신혜연 옮김/예담·5만5000원 1950년에 초판이 나온 에른스트 곰브리치(1909~2001)의 <서양미술사>는 32개 국어로 번역돼 600만부가 넘게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다. 원시인의 동굴벽화에서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 건축에 이르기까지, 회화·조각·건축의 역사를 개관한 이 책은 원제가 “Story of Art”, 그냥 ‘미술 이야기’다. 그러나 이슬람과 중국의 중세 미술을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다룰 뿐, 책의 절대 분량을 유럽 중심의 서구 미술에 할애한 까닭에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판에는 ‘서양미술사’라는 새 이름을 받아야 했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 미술>은 기존 서양미술사의 지역적·시대적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원대한 기획 아래 쓰인 책이다. 동서와 고금을 아우른 명실상부한 ‘세계미술사’를 표방한다. 책을 쓴 줄리언 벨은 런던미술학교 ‘시티 앤 길드’에서 미술사와 미술이론을 가르치는 화가 겸 비평가.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그의 이모할머니다. 글쓴이가 밝힌 이 책의 집필 원칙은 이렇다. “나는 미술사가 독립적인 미적 영역을 향해 열린 창이라기보다 세계의 역사를 우리에게 되비춰주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미술적 변화의 기록들은 아무리 방향이 뒤바뀌고 내용이 변해도 어떻게든 사회적·기술적·정치적·종교적 변화의 기록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돼 있다.” 미술만의 역사가 아닌, 미술과 역사의 교호와 소통을 구체적인 미술작품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책은 여느 미술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작가·작품이 등장했던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만, 그 연대기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6대륙을 넘나든다. “세계 미술의 다양성에 눈이 번적 뜨이는 느낌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미진진한 공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지만, 그 의도가 제대로 관철됐는지는 미지수다. 기술 대상의 전환이 작가들 사이의 영향 관계나 작품의 모티프를 매개로 이루어지기보다 별다른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 장면들이 영화의 ‘점프 컷’처럼 부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탓이다. 16~17세기 중국과 인도, 아메리카, 이탈리아의 미술이 하나의 절에서 다뤄지는 ‘7장 극적인 현실’ 부분이 대표적이다. 문징명의 1532년 작 <우산칠성회도>를 보여준 뒤 당시 중국 남종화의 화풍과 정조에 대해 이야기하던 글쓴이는 돌연 화제를 전환해 당시 향료·직물교역으로 부를 누리던 인도 남부의 종교 미술로 넘어간다. 마두라이 힌두교 사원의 조각과 인물상에 대해 기술하던 글쓴이는 다시 동시대 중국으로 시점을 이동해 명·청대 인물화와 초상화를 이야기하는 듯하더니, 별안간 동시대 일본에서 진행된 가톨릭 탄압과 그것을 제단화의 형식으로 형상화한 페루 미술로 화제를 전환한다. 이처럼 과격한 장면 전환은 책 전체에 걸쳐 꾸준히 반복된다.
〈세상을 비추는 거울, 미술〉
그러나 단순한 미술의 역사가 아니라 미술과 역사, 문화와 문화의 교호적 관계를 드러내려는 글쓴이의 고투는 책장 여기저기서 빛을 발한다. 19세기 초 이란의 유화와 20세기 초 유럽 상징주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색채 처리의 유사성(패치워크 기법)을 논하는 대목은 미술의 세계사를 빚어낸 침투와 저항, 융합의 메커니즘을 어렴풋이 가늠케 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