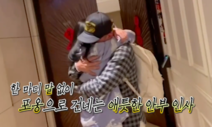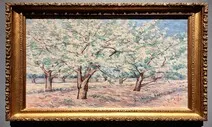〈화〉
‘한겨레21’ 인터뷰 특강…시사평론가·뇌공학 전문가 등 ‘화 관리법’
〈화〉
진중권·정재승 외 지음/한겨레출판·1만2000원 29년 전 광주의 5월을 무색케 하는 벌거벗은 폭력이 평택에서 재연되고 있다. 백주에 펼쳐지는 야만의 살풍경은 경악을 넘어 격한 분노를 유발한다. 촛불은 꺼지고 광장마저 닫혀버린 지금,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어찌할 것인가. 무작정 삭이고 억누르다간 내상을 입기 십상이다. 울화증이다. 심하면 정신착란까지 간다. 무림의 기공용어로는 ‘주화입마(走火入魔)’라고 한다. <화>는 ‘주화입마’에 빠지지 않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한다. <한겨레21>이 지난 3월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인터뷰 특강을 녹취·정리한 책으로, 진중권·정재승·금태섭·홍기빈·안병수·김어준 여섯 명의 논객들이 처방하는 ‘화 관리법’이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의 주제는 ‘대중의 화’다. 진 교수에 따르면 분노가 많은 사회 성원들에 의해 공유될 때, 그것은 ‘공적 분노’가 된다. 공적 분노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분노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은 이런 대중의 분노를 관리하려고 한다. 그 방식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분노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이다. 용산의 살인적 진압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시위대의 경찰 폭행을 부각시켜 ‘공권력 위기’ 담론을 유포했던 것이 일례다. 두 번째는 큰 문제에 분노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분노가 사소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 ‘왕따 현상’ 같은 ‘수평 폭력’이 대표적인 경우다. 마지막은 분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스스로를 ‘쿨’하다고 느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분노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올바르게 선택됐는지, 표출 방식은 적절한지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진 교수의 주문이다. 뇌공학 전문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인간의 뇌에서 ‘화’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이야기한다. 정 교수가 정의하는 화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자신이나 상대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적개심을 갖는 상태”다. 화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경우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파국적 폭력으로 이어지지만, 적절하게 표출될 경우 성취동기를 자극하거나 자신의 감정상태를 상대방에 인지시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고 가다듬는 것이 중요한데, 정 교수가 제시한 처방은 이렇다.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내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화를 억누르는 건 더 안 좋다. 그럴 땐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상대에게 차분히 말하라. 그러면 상대는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제안하는 것은 ‘웃으며 화내기’다. “안정적인 바이털 사인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화사하게 화를 내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엿먹인다”는 ‘전문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엿먹이기’야말로 권력을 충분히 야유하면서도 자신이 다치치 않게 웃으면서 화내는 서민들의 화법이다. “엿 먹이는 화법은 상대를 내 눈높이로 끌어내려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 패러디가 이런 거다.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를 웃겨버리는 것. 그러면 자기 빼고 전부 다 웃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다. 쪼잔한 놈이 되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화내기’의 기본 요건으로 ‘자기 객관화’를 꼽는다. 객관화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썼던 에너지를 떼어내면 남들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이를 통해 그들의 과오와 부족한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돼 웃으면서 화낼 여유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를 객관화해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애와 여행인데, 연애가 자신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경계를 알게 해준다면, 여행은 자신의 보편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스스로를 인정할 용기를 제공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강의 사회를 맡은 영화배우 오지혜씨와 강연자들이 나누는 재기 넘치는 대화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