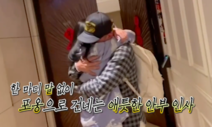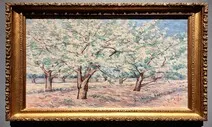애국주의 논쟁의 지형
정치권 유시민·노회찬 등 ‘관심’
진보진영 일각선 위험성 경계도
정치권 유시민·노회찬 등 ‘관심’
진보진영 일각선 위험성 경계도
‘애국’의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뉴라이트 진영이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학자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추어올리는 한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각각 ‘건국의 아버지’ ‘근대화 혁명가’로 미화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불기 시작한 젊은 세대의 ‘대한민국 열기’를 보수주의 프레임 안으로 흡수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진보진영에서는 2008년 촛불시위를 계기로 ‘애국주의’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했다.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 2004년 탄핵반대 집회 직후에도 이른바 ‘대한민국주의’의 실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깊이 있는 학문적 담론의 차원으로 승화되진 못했다. 논의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것은 2000년대 중반 ‘공화주의’와 ‘애국주의’에 대한 서구 학계의 심화된 논의들이 소개되면서부터다.
박명림(연세대)·김상봉(전남대)·장은주(영산대)·안병진(경희사이버대)·신진욱(중앙대) 교수 등은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차원에서 ‘국민적 정체성’과 인권과 소수자 보호 같은 ‘보편주의적 가치’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그리는 애국주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경사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보편적 인권과 개인의 자율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 진보진영 일각에는 여전히 ‘애국주의’가 갖는 종족적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흐름 역시 존재한다.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와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모든 구성원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공화주의의 이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국민 정체성 형성의 매개로 삼으려는 시도에는 비판적이다. 민주공화국을 긍정한다는 것은 그 권력의 최종 근거인 ‘대한민국 시민의 힘’을 긍정하는 것이지, 헌법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거나 현실의 국가를 자기준거적이고 규범적인 현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이 ‘공화주의적 애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단체 중에서는 참여사회연구소가 공화주의와 애국주의 논의에 적극적이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민주공화국’을 주제로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