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히 프롬, 마르크스를 말하다〉
■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오해를 버려!
〈에리히 프롬, 마르크스를 말하다〉
마르크스주의는 비인간적인 혹은 반인간적인 이념인가? 소련과 중국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좇고 있는가?
냉전이 한창이던 1950∼1960년대 미국이었다면 대답은 아마도 이구동성 “그렇다”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에리히 프롬은 1961년 처음 출간한 <에리히 프롬, 마르크스를 말하다>에서 이런 왜곡과 오해에 정면으로 맞선다. 그는 마르크스 철학에 대한 오해의 근본 원인을 무지와 소련공산당의 마르크스 이론 전유 등에서 찾는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인 <경제학·철학 수고>를 근거로 삼아 마르크주의의 근본 목표는 인간의 정신적 해방과 개별성의 발달, 자연과의 조화에 있었다고 말한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미국 안의 오해가 바로잡히는 데 이 책의 출간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연애지침서 쯤으로, <소유냐 존재냐>를 마음치유서 정도로 짐작하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에리히 프롬이 웬 마르크스?’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제에 비해 무겁지 않은 이 책을 읽다보면, 프롬과 그의 저작들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매카시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엄혹한 시기에도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휴머니스트’로 규정한 프롬에 대한 무지를 깬다. 에리히 프롬 지음·최재봉 옮김/에코의 서재·1만2000원.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 환경위기 해결 위한 진보적 접근
 〈자연과 타협하기〉
자본은 이미 ‘환경위기’를 먹고 산다. 1980~90년대부터 ‘용인될 수 있는 자연파괴’라는 특수한 희소성을 업고 만들어진 다양한 ‘생태상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쉬운 예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보자. 주로 가난한 열대 국가가 벌목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고, 산업화된 지역의 주요 오염행위자들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합법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자연의 시장화’는 시장친화적으로 환경파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일단 환영받고는 있지만,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오히려 자본 축적전략으로 자연이 집약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문제는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자연의 피해’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봐서는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다. <자연과 타협하기>는 “자연과 인류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싸워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장적 해법’을 수용해온 현대의 환경주의자들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태도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새로운 환경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1964년부터 현안과 쟁점을 점검해온 좌파 지식인 연간지인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2007년호를 옮긴 책으로, 진보적인 학자와 연구자의 글 17편을 환경문제를 전공한 국내 학자 16명이 옮겼다. 그레고리 앨보 외 지음·리오 패니치 외 엮음·허남혁 외 옮김/필맥·2만2000원.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
■ 환상 걷어낸 ‘중국의 얼굴’
〈자연과 타협하기〉
자본은 이미 ‘환경위기’를 먹고 산다. 1980~90년대부터 ‘용인될 수 있는 자연파괴’라는 특수한 희소성을 업고 만들어진 다양한 ‘생태상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쉬운 예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보자. 주로 가난한 열대 국가가 벌목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고, 산업화된 지역의 주요 오염행위자들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합법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자연의 시장화’는 시장친화적으로 환경파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일단 환영받고는 있지만,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오히려 자본 축적전략으로 자연이 집약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문제는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자연의 피해’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봐서는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다. <자연과 타협하기>는 “자연과 인류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 싸워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장적 해법’을 수용해온 현대의 환경주의자들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태도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새로운 환경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1964년부터 현안과 쟁점을 점검해온 좌파 지식인 연간지인 <소셜리스트 레지스터> 2007년호를 옮긴 책으로, 진보적인 학자와 연구자의 글 17편을 환경문제를 전공한 국내 학자 16명이 옮겼다. 그레고리 앨보 외 지음·리오 패니치 외 엮음·허남혁 외 옮김/필맥·2만2000원. 김일주 기자 pearl@hani.co.kr
■ 환상 걷어낸 ‘중국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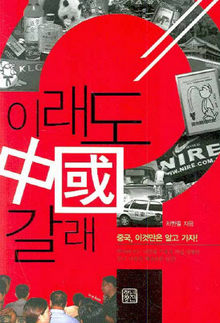 〈이래도 중국 갈래〉
“500위안에 팝니다.” “100위안에 파시죠.” “115위안에 가져가세요!” 중국 상하이에서 장식용 칼을 살 때 흥정을 하면서 지은이가 겪은 일이다. 가파른 경제성장을 하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고들 한다. 중국은 그렇게 수백·수천의 얼굴을 지녔다. 지은이는 2년 동안 중국 연수 등을 하면서 본 또 하나의 얼굴을 이 책에 담았다. “물건을 살 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깎아도 한국과 달리 화를 내는 상인은 없다.” “중국 사람을 상대하려면 그들보다 더 버틸 줄 알아야 한다.” “남의 사정을 봐주는 일 때문에 자신이 수고하거나 손해 보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어느 민족이나 그들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다. 한반도의 약 50배 가까운 영토, 13억 인구의 중국은 지역별 특성이나 기질의 차이도 크다. 중국에 가서 주로 놀라는 벽이나 문이 없는 ‘민망한’ 구식 공중화장실은 “프라이버시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위해를 염려해 방어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생긴 것 같다.” 대박을 좇다 노동법과 세법 등을 잘 몰라 철수를 고민하는 한국기업, 실패한 어린 학생들의 ‘나 홀로’ 조기유학, 때로 아옹다옹하는 동포사회 등 이웃 중국 속 한국의 모습도 전한다. 혹 중국에 대한 ‘환상’을 품었을 이들에게 지은이는 “이래도 중국 갈래?”라고 묻는다. 차한필 지음/청년정신·1만2000원.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이래도 중국 갈래〉
“500위안에 팝니다.” “100위안에 파시죠.” “115위안에 가져가세요!” 중국 상하이에서 장식용 칼을 살 때 흥정을 하면서 지은이가 겪은 일이다. 가파른 경제성장을 하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고들 한다. 중국은 그렇게 수백·수천의 얼굴을 지녔다. 지은이는 2년 동안 중국 연수 등을 하면서 본 또 하나의 얼굴을 이 책에 담았다. “물건을 살 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깎아도 한국과 달리 화를 내는 상인은 없다.” “중국 사람을 상대하려면 그들보다 더 버틸 줄 알아야 한다.” “남의 사정을 봐주는 일 때문에 자신이 수고하거나 손해 보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어느 민족이나 그들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다. 한반도의 약 50배 가까운 영토, 13억 인구의 중국은 지역별 특성이나 기질의 차이도 크다. 중국에 가서 주로 놀라는 벽이나 문이 없는 ‘민망한’ 구식 공중화장실은 “프라이버시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위해를 염려해 방어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생긴 것 같다.” 대박을 좇다 노동법과 세법 등을 잘 몰라 철수를 고민하는 한국기업, 실패한 어린 학생들의 ‘나 홀로’ 조기유학, 때로 아옹다옹하는 동포사회 등 이웃 중국 속 한국의 모습도 전한다. 혹 중국에 대한 ‘환상’을 품었을 이들에게 지은이는 “이래도 중국 갈래?”라고 묻는다. 차한필 지음/청년정신·1만2000원.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자연과 타협하기〉
〈이래도 중국 갈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