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학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이상인 옮김 l 길 l 3만 3000원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는 근대 학문 분과의 원형을 창출한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영역은 형이상학에서부터 논리학·자연학·윤리학·정치학·수사학에 이르기까지 광대하게 뻗어 있다. ‘시학’은 이 드넓은 탐구영역 가운데 ‘시 예술’에 관한 이 철학자의 통찰이 담긴 저작이다. ‘인류 최초의 문학이론서’로 불리는 이 저작의 새로운 번역본이 고대 그리스 철학 전문가 이상인 연세대 교수의 노고를 거쳐 나왔다. 원문과 번역문을 나란히 배치한 그리스어-한국어 대역본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텍스트에 대한 역사적·분석적 연구를 담은 장문의 해제다. 여기서 옮긴이는 그동안 문학창작론으로 통용돼온 ‘시학’을 일종의 논리학 저작으로 재해석한다 .
그리스 북부에서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는 17살 때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에 들어가 20년 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익혔다. 이 도제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역량은 벌써 독자성을 띠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에 기반을 둔 플라톤 사상을 의심 어린 눈으로 보았고, 천상이 아닌 지상 세계로 관심 영역을 넓혔다. 특히 논리학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 ‘토피카’(변증론)를 이 시기에 집필했다. 플라톤 사후 아테네를 떠난 아리스토텔레스는 10여년 뒤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자신의 학교 리케이온을 세우고 남은 인생을 교육과 저술에 바쳤다.
고대 작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남긴 기록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은 모두 147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대한 저술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은 크게 ‘내부용 저술’과 ‘외부용 저술’로 나뉜다. 외부용 저술은 리케이온 바깥의 대중 교육용으로 쓴 것들인데, 탁월한 문체의 대화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반면에 내부용 저술은 리케이온 학생들에게 강의할 목적으로 쓴 것들이어서 문체가 건조하고 압축적이다. 외부용 저술은 후대에 모두 소실되고 내부용 저술만 오늘날까지 내려온다.
이 살아남은 저술을 취합해 체계화한 사람이 19세기 독일 문헌학자 이마누엘 베커다. 베커는 기원전 1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을 최초로 정리해 분류한 안드로니코스의 전통을 따라 다섯 영역으로 저술을 나누었다. 논리학, 자연학, 형이상학, 윤리학·정치학, 수사학·시학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후대의 분류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학문 분류와 차이가 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 연구 대상을 ‘테오리아’(theoria, 관조), ‘프락시스’(praxis, 행위). ‘포이에시스’(poiesis, 제작)로 나누었다. 테오리아는 인식 자체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는 이론적 학문에 대응하고, 프락시스는 인간의 정치적·윤리적 행위를 탐구하는 실천적 학문에 대응한다. 또 포이에시스는 삶의 편의에 복무하는 기술을 다루는 제작적 학문의 영역이다.
이 분류법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저술에 적용하면, 논리학·자연학·형이상학 저술은 테오리아(이론적 학문)에 속하고, 윤리학·정치학은 프락시스(실천적 학문)에 속한다. 그렇다면 시학은 어디에 속할까? 후대의 학자들은 ‘시학’(페리 포이에티케스, peri poietikes)이라는 말이 ‘포이에시스’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제작적 학문’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작적 학문에 속하는 것으로 건축술·직조술·제화술·제과술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시학은 서사시나 비극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어서 사물 제작 기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 ‘시학을 제작에 관한 학문으로 분류해도 되는가’ 하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오래된 물음에 새로운 답을 주는 것으로 근년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중세 이슬람 철학자들, 곧 알파라비·아비켄나·아베로에스의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이다. 세 철학자는 모두 ‘시학’에 대한 주석서를 썼는데,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똑같이 ‘시학’을 논리학 저술로 분류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시학’이 논리학 저술이 될 수 있는가? 논리학은 인간 이성의 사유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사유법칙을 그 내적 필연성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논리학이다. 모든 학문 활동은 이 논리학을 도구로 삼는다. 또 논리학은 불변의 법칙 혹은 불변의 원리를 그 필연성에 따라 밝힌다는 점에서 이론적 학문의 하나다. 이론적 학문 곧 자연학이나 수학이나 형이상학은 모두 불변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학이 탐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 곧 비극 속에 등장하는 개별 인간의 행위다. 개별 인간은 자연학이나 수학처럼 필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삶을 통해 형성한 성격(에토스, ethos)에 따라 필연성에 가까운 개연성 있는 행위를 한다. 영웅적인 인간은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비열한 인간은 비열한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시학은 엄밀한 필연성은 아니더라도 그 나름의 법칙성을 지닌 대상을 탐구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극 작품은 그런 인간 행위를 완결된 드라마로 구성해야 한다. 이 구성이 탁월한 것이 되려면 그 행위들이 논리에 맞게 구축돼 통일성을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행위 법칙을 통해 논리적 통일성을 구축하는 시 예술이 바로 시학의 탐구 대상이다. 그러므로 시학은 필연성에 가까운 개연성을 따라 펼쳐지는 행위의 논리학, 삶의 논리학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본문에서 시인과 역사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역사가는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시인은 일어날 것 같은 일을 말한다. 따라서 시는 역사서술보다 더 철학적이며 더 위대하다.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고 역사서술은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인간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극과 역사서술은 유사하지만, 그 행위 속에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고 보편적 논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비극이 역사서술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다. 삶의 논리학이라는 새로운 이해의 빛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다시 읽으면, ‘시학’은 창작의 비밀을 알려주는 지침서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적 텍스트로 나타난다.
고명섭 선임기자
michael@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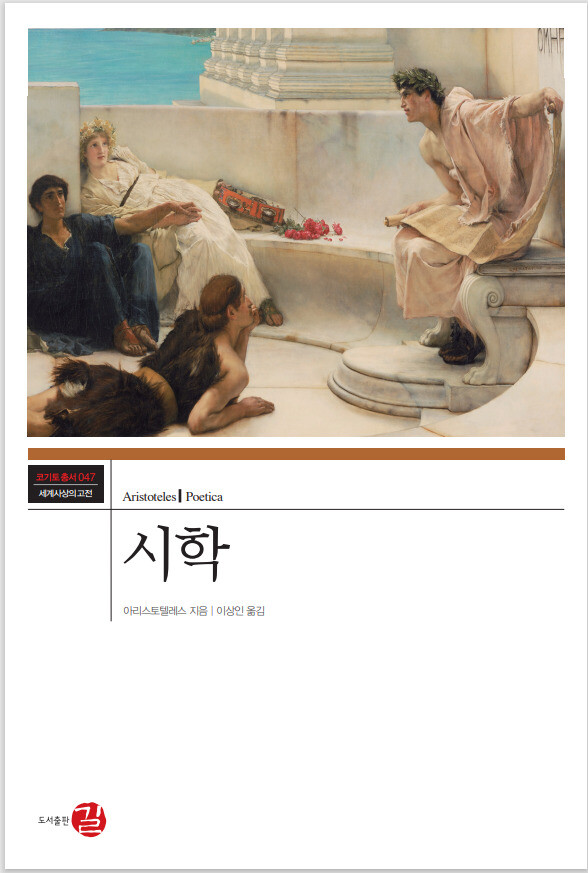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