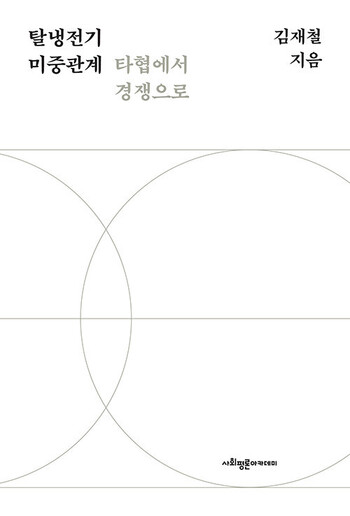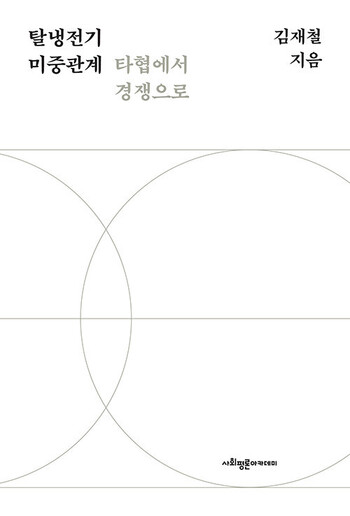“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해 서로 다른 두 진영이 형성되고 이 진영 대결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대미, 대중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대중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이라는 상위 변수에 종속되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1990년대 초 출범한 미 클린턴 행정부부터 현 바이든 행정부까지 지난 30년 동안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치밀하게 짚은 책 ‘탈냉전기 미중관계-타협에서 경쟁으로’(사회평론아카데미)를 최근 펴낸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의 말이다.
지난 20년 동안 미중관계를 연구해온 그는 저술 ‘중국과 세계:국제주의, 민족주의, 외교정책’(2017)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최근작에서 지난 30년 미중 관계를 타협(클린턴, 아들 부시 미 대통령 시기)에서 타협과 경쟁이 공존한 복합성(오바마 대통령)을 거쳐 경쟁(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들 부시 때만 해도 두 나라는 미국 주도로 타협을 도출했고 이런 흐름은 경제 쪽에서의 상호의존 증대로 강화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타협에 더해 경쟁 구도도 형성되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중국이 경제 위기에 처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는 한편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대중 전략 변화를 불렀다는 설명이다. 이 ‘복합성’의 단계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 들면서 경쟁 단계로 진입했고 바이든 시기에는 과학기술 제재와 대만 문제에 대한 압박 등으로 경쟁 전략의 체계화를 시도하면서 탈냉전기의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전자우편으로 만난 김 교수는 미중 관계가 협력에서 경쟁으로 이동한 가장 큰 요인으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자신감을 강조하고 트럼프가 이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꼽았다. 그는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경쟁 정책을 체계화했지만 그렇다고 두 나라 관계가 트럼프 시기보다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경쟁이 더 분명해졌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경쟁의 관리’를 강조해 두 나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트럼프 때와 견줘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책에서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 모두 대중 경쟁의 의미나 목표, 그 실현 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바이든의 대중 경쟁 전략 목표는? “현실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유리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월한 힘을 확보함으로써 ‘강력한 지위’(position of strength)에서 중국을 상대하려는 거죠. 미국의 국력 한계를 자각한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경쟁을 중국의 성장과 부상을 제어하려는 시도이자 ‘패권적 행위’로 간주하고, 미국의 ‘패권’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며 유엔과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제기해 미국의 국제적 주도권의 정당성을 약화하려(또는 탈정당화하려) 시도합니다. 중국의 이런 대응은 미국의 경쟁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죠.”
그는 이어 “미중이 서로 다른 진영을 형성하고 극단적 경쟁을 불사하려는 결심을 굳힌 것인지, 또 이 경우 그 목표를 실현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설령 양국이 신냉전으로 나아간다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사건과 요인들이 미중 관계의 양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가 책의 결론에서 미중 관계의 미래 시나리오로 협력의 복원이나 전면적 충돌보다는 제한적 공존이나 신냉전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교수에게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을 묻자 이런 답이 나왔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두 나라가 아직은 진영을 나눠 조화될 수 없는 경쟁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봐요. 따라서 두 나라 관계의 향방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나아가 미중 관계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외교란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예술 아니겠습니까.”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