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터뷰 당시의 최진영 작가.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스물여섯 살에 ‘팽이’라는 단편소설로 신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데뷔를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소설 청탁도 없었고, 이런저런 계간지에 투고했으나 거절의 소식조차 없었다. 막막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애매했다. 스스로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가가 아니니까 작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소설 쓰기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소설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나’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소설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있었다. 그때 나는 나를 견디며 살았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내 마음을 남의 마음처럼 헤아릴 수도 있었다.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소설에서는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내밀한 이야기를 소설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 당시 소설은 나를 버티는 힘이었다.
2020년 인터뷰 당시의 최진영 작가.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단편소설 투고에 실패했으므로 장편소설을 써보자고 생각했다. 스물여덟 살에 처음 쓴 장편소설을 한겨레문학상에 투고했다. 본심에 올랐다. 깜짝 놀라서, 다른 장편소설을 썼다. 그것을 다음 해 한겨레문학상에 투고했다. 예심에도 오르지 못했다.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다음 장편소설을 구상했다. 서른 살을 앞두고 있었다. 내게는 소설만큼 직업도 필요했다. 딱 한 편만 더 써보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하자고 다짐했다.
내게 남은 소설이 ‘딱 한 편’뿐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웠다. 한편으로 용기가 샘솟았다.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그동안 소설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인물을, 소설에조차 쓰지 못했던 거친 생각을 이번 소설에 다 써버리자는 용기. 일단 그것을 쓴 다음에, 소설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자는 용기. 소설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생각했다. ‘할 말을 하자, 그리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이제 와 생각해보면 ‘헤어질 결심’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만큼 간절했던 것 같다. 소설을 짝사랑하는 것만 같아서 괴로웠던 것이다. 나는 소설 쓰기를 따로 배운 적이 없었고, 나의 소설을 읽고 의견을 나눠주는 동료도 없었다. 글쓰기 수업을 찾아다닐 생각도 못 하고 그저 혼자서 고집스럽게 썼다. 소설을 잘 쓰고 싶은 마음 반대편에는 그런 마음을 비웃는 내가 있었다. 소설을 비웃는 것보다는 나를 비웃는 게 쉬웠으니까. 이십대의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지금도 여전히 모르지만, 적어도, 나를 그렇게 홀대하고 비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알고는 있다.
딱 한 편만 더 써보자는 다짐으로 쓴 소설이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이다. 그 소설로 15회 한겨레문학상을 받았다. 나의 첫 책을 가졌다. 그다음부터 신기하게도 소설 청탁이 들어왔다. 써야 할 소설과 마감이 조금씩 생겼고, 나의 이름 뒤에는 ‘소설가’라는 단어가 붙었다. 직업을 구한 기분이었다.
출간 후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을 다시 읽지 않았다. 할 말을 하고 깔끔하게 헤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읽는 행위는 어쩐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돌아보고 매달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작년에 개정판을 내기 위해서 거의 10년 만에 그 소설을 다시 읽었다. 서른을 앞두고 쓴 소설을 마흔 넘어 다시 읽은 셈이다. 10년 넘는 간격을 두고야 깨달았다. 그때 나는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소설에서만큼은, 열렬히 옹호하고 있었다는 걸. 나를 독점하기 위해 세상 전부를 나의 적으로 돌릴 만큼 사랑했다는 걸. 시간이 흘렀으므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말. 나는 나의 첫 책이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이어서 위풍당당하다. 나는 여전히 소녀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녀처럼 전진하고 싶다. 소녀처럼 사랑하길 원한다.
최진영 소설가
■그리고 다음 책들
이제야 언니에게
언젠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의 소녀에게는 불과 같은 강함이 있고 <이제야 언니에게>의 제야에게는 돌과 같은 강함이 있다고. 이 소설을 쓸 때만큼 인물에게 의지한 적이 없다. 다른 소설을 완성한 뒤에는 늘 소설의 인물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나는 아직 제야와 헤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헤어질 마음이 없다. 나는 지금도 제야를 생각한다. 내 곁에는 늘 제야가 있다.
창비(2019)
구의 증명
출간 당시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다가 2020년 무렵부터 판매량이 늘어난 책이다. 이 소설을 쓰던 겨울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 겨울 나는 ‘사랑’을 집요하게 응시했다. 사랑이란 감정의 혼란스럽고 어둡고 지독하게 쓰라린 부분까지 사랑하려고 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뿐 아니라 불행하고 절망적인 순간도 사랑임을 받아들였다. 이 소설을 완성한 뒤 다짐했다. 이런 소설을 썼으므로 이제부터 나는 나의 사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은행나무(2015)
해가 지는 곳으로
소설을 쓰고 출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독자의 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소설에 쓰지 않은 부분을 채워주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었고, 내가 쓴 것 이상을 헤아려줬다. 그런 믿음에 기대어 쓴 소설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는 두 여자’의 이야기다. 출간 후 몇 년 지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했다. 코로나19를 겪기 전이었기에 쓸 수 있었던 소설이다.
민음사(2017)
내가 되는 꿈
부담을 내려놓고 쓴 소설이다. ‘잘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내게 필요한 소설을 쓰자’는 것에 집중하며 썼다. 이 소설을 쓰면서 깨달았다. 여태 쓴 소설이 모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음 소설 또한 그것의 연장선이 될 것임을. 소설을 한 편씩 완성할 때마다 그 선의 매듭을 짓는 것만 같다. 매듭은 매듭일 뿐 끝이 아니다. 선을 계속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글쓰기도 막막하지만은 않다.
현대문학(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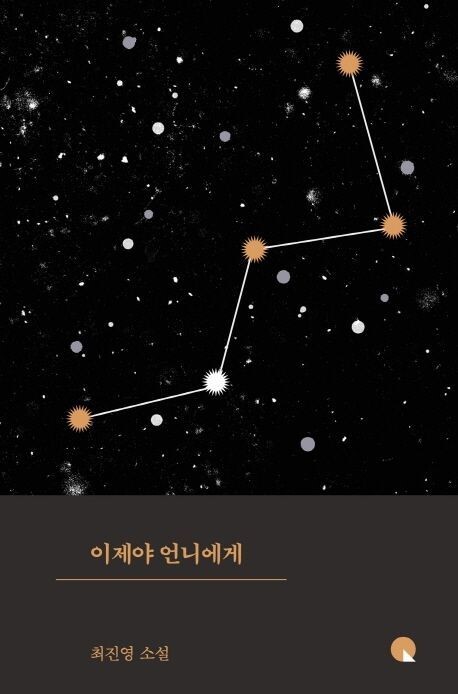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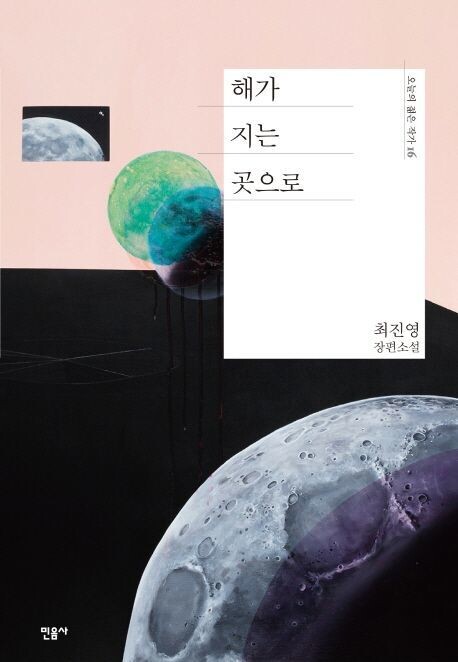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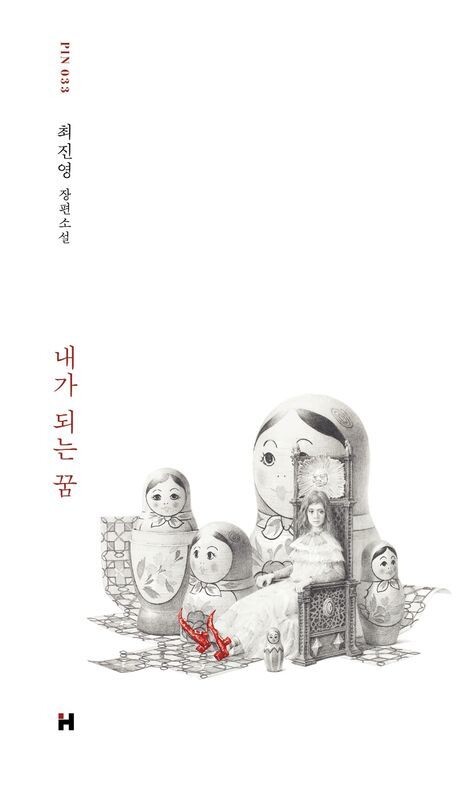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소설로 끄집어낸 4·3…뒤따른 고문과 수형 [책&생각] 소설로 끄집어낸 4·3…뒤따른 고문과 수형](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2/53_17032085959664_20231221503957.jpg)





